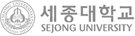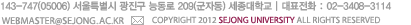교내사이트
(부서/기관)
( 147건 )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단신
주요단신
세종투자연구회 ‘세투연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모의투자대회 사상 첫 팀 부문 연속 수상 쾌거
2025-06-04
hit
72
▲수상팀 ‘세투연자산운용’ 사진
중앙동아리 세종투자연구회(이하 세투연) 산하 ‘세투연자산운용’이 한국투자증권 주최 제11회 대학생 모의투자대회에서 팀 부문 2위와 개인 부문 4, 8위를 차지하며, 작년에 이어 국내 주식 팀 부문 사상 첫 연속 수상과 개인 부문 동시 입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는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4주간 진행됐으며, 전국 452개 대학에서 5,181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투연 자산운용팀은 최종 수익률 483.1%로 팀 부문 2위를 차지했고, 개인 부문에서는 김태원(데이터사이언스학과·19) 학생이 150.1%의 수익률로 4위, 고서연(경제학과·23) 학생이 113.4%의 수익률로 8위를 차지했다.
개인 부문 수상자는 한국투자증권 입사 지원 시 인적성 평가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세투연자산운용’은 세투연 자산운용팀 소속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팀장 이재범(항공우주공학과·19) 학생을 중심으로 고서연, 김태원, 박종원(데이터사이언스학과·21), 방지현(경영학과·21), 송원근(데이터사이언스학과·20), 정우진(법학부·19), 조동우(경제학과·21), 최훈제(외식경영학과·16) 학생이 참여했다.
세투연 상임고문 김태원(데이터사이언스학과·19) 학생은 “세투연이 동일 부문 내 첫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워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매년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팀 부문만큼은 우리 세종대 세투연이 매년 가져올 수 있도록 운용 체계를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재/ 이현석 홍보기자(hslee901@naver.com)
다음글
학술정보원, 소장 도서 100만 권 등록 기념 이벤트 진행
이전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세종열린특강 옥토제너리언으로 살기 위한 생애 설계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단신
주요단신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세종열린특강 옥토제너리언으로 살기 위한 생애 설계 진행
2025-06-04
hit
57
▲강연 중인 김석란 교수의 모습
▲강연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와 세종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는 지난 5월 24일 광개토관 108A호에서 ‘옥토제너리언(Octogenarian)’으로 살기 위한 생애 설계’라는 주제로 세종열린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초고령사회에서 주도적인 옥토제너리언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략 모색을 돕고자 기획됐으며, 강연은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소속 김석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삼성전자 경력컨설팅센터에서 전직 지원, 생애 설계, 경력 관리 컨설팅 및 강의를 담당했으며, 현재는 퇴직 준비 직원을 위한 전직 지원과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음길HR에서 교육사업본부를 총괄·운영하고 있다.
특강은 △초고령사회, 옥토제너리언의 의미 △변화하는 노후의 삶 △생애 5대 요소 점검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다뤘다.
김 교수는 ‘꼰대’, ‘권위적’ 등 고령자에 대해 존재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고령자들의 은퇴 후 재취업과 사회 참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노후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애 5대 영역인 △재무 △일 △건강 △관계 △여가를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의 영역에서는 전문성과 시대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격증 취득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실제 수요 있는 분야를 사전에 파악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의 영역에서는 50대 이후 재취업자의 75% 이상이 지인 추천 등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하며, 공개 채용보다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속적인 경력 관리와 관계 형성이 고용 가능성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나이 들어가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남이 아닌 스스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자기목적적(오토텔릭, autotelic)인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만족도 높은 노년기를 여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김 교수는 “이 강의가 학생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활동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진행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기획한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오는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학년도 후기 3차 신·편입생을 모집하며, 세종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사회복지전공과 더불어 △상담복지 △노인보건의료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등 세부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복지 실천 현장 전문가 교육과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정책대학원(02-3408-3044~5), 세종사이버대(02-2204-8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취재/ 이가은 홍보기자(lee9adong@naver.com)
다음글
세종투자연구회 ‘세투연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모의투자대회 사상 첫 팀 부문 연속 수상 쾌거
이전글
산업대학원, (주)포티움과 MOU 체결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단신
주요단신
산업대학원, (주)포티움과 MOU 체결
2025-06-05
hit
21
▲협약식 참석자 단체 사진
산업대학원은 지난 5월 26일 광개토관 926호에서 ㈜포티움과 MOU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연구 및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양 기관의 기술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포티움은 지난 2014년 설립된 스포츠과학연구기업으로, 헬스케어 제품 개발, 사업장 건강관리, 국가대표선수 재활 트레이닝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산업대학원 최진호 원장, 강덕모 스포츠산업학과 주임교수, 강대진 교학과 부서장과 ㈜포티움 엄성흠 대표이사, 성봉주 선임연구원, 이아라 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추진 △연구시설 공동 활용 △교육지원(장학금 혜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대학원 최진호 원장은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포티움과의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교육과 함께 미래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재/ 최수연 홍보기자(soo6717@naver.com)
다음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세종열린특강 옥토제너리언으로 살기 위한 생애 설계 진행
이전글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25 여름방학 ‘토픽 집중반’ 수강생 모집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단신
주요단신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25 여름방학 ‘토픽 집중반’ 수강생 모집
2025-06-05
hit
31
▲여름방학 토픽 집중반 포스터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오는 6월 30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2025 여름방학 ‘토픽 집중반’을 개강한다.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단기간에 진행되는 토픽 집중학습 프로그램으로 토픽 실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세종대 재학생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6월 28일까지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 또는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kai.quv.kr/)를 통해 가능하다. 수업은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5주간 주 2회 진행되며 신청한 분반에 따라 요일과 시간대는 달라진다. 수강료는 10만 원이다.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이번 여름방학 집중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꾸준한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단기간 내 한국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집현관 913호/02-3408-2994/seckc@sejong.ac.kr)로 문의하면 된다.
취재/ 권상혁 홍보기자(seankweon@naver.com)
다음글
산업대학원, (주)포티움과 MOU 체결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세종특강
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베러모먼트코퍼레이션 김준영 대표, 강연 진행
2025-03-27
hit
123
‘베러모먼트코퍼레이션’의 대표이자 21.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포리얼’ 김준영 대표가 지난 19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비상식적 창업학’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준영 대표는 강연에서 사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라고 강조하며, 우리 인생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을 바라보는 김 대표의 강연을 직접 현장에 가 들어봤다.
▲김준영 대표
사업은 어려운 게 아니다
김준영 대표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언젠가 직장을 나왔을 때, 스스로 돈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에서 훌륭한 커리어를 보낸 사람들도 은퇴 이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인생에서 사업이라는 옵션을 지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며, 퇴직을 앞두고 사업을 결심하면 늦으니 대학생 때부터 작게나마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투자를 받아 요양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회사 내 정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인생에서 취업이라는 옵션을 생각해 본 적 없던 그는 유튜브를 시작으로 현재의 자리에 올랐다.
사업 구조가 변화하다
김준영 대표는 온라인의 발달로 사업의 기회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기존의 사업 구조가 오프라인에만 머무는 형태라면, 최근의 사업 구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말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는 무료로 정보를 올린 뒤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가치 있는 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다고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자신만의 아이템을 구독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이라는 것이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가 혼자서 돈을 벌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래에는 기본 소득에만 의존하는 사람과 기본 소득과 추가 소득을 모두 얻는 사람으로 나뉘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 예상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도 계속 벌어질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영역을 계속해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대표가 질의응답하고 있다.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김준영 대표는 AI가 발달하는 시대에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귀하다고 강조하며,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어른들이 정해놓은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만 많아지다 보면 세상은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인생에 정해진 정답이 없으니 다양한 길을 열어두라고 조언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새로운 걸 만들 필요는 없고, 롤모델을 정해놓고 그의 생각을 참고한다면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말했다.
그는 우리가 삶을 맹목적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데,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우리가 살면서 우등 비교가 아닌 열등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취재/ 문준호 홍보기자(mjh30279@naver.com)
다음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매직메이커 권혁민 대표, 강연 진행
이전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밭 이미소 대표, 강연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세종특강
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밭 이미소 대표, 강연 진행
2025-04-02
hit
189
농업회사법인 밭의 이미소 대표가 지난 3월 26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감자빵 창업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감자빵을 개발하여 연매출 200억 원을 달성한 그는, 자신의 창업 경험을 청중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미소 대표
어린 시절의 도전과 감자빵 창업의 시작
이미소 대표는 강원도 춘천에서 감자빵을 개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세종대 패션디자인학과 10학번인 그는 다니던 스타트업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인 춘천으로 내려가 감자 농사를 도우며 감자빵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감자 농사를 지으며 겪었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감자 농가의 소득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창업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IT 회사에서 근무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감자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감자빵은 물론 감자 프레첼, 감자만두, 감자전병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마침내 감자빵을 성공시켰다.
도전을 통해 얻은 배움과 실행의 중요성
이미소 대표는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배움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창기 시도했던 제품들이 잘 팔리지 않아 실망스러운 경험도 많았지만, 지속적인 실험과 분석을 통해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장에 내놓고 피드백을 얻는 린 스타트업 방식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소 대표는 정부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 조사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점차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유통망을 넓혀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조언했다.
▲이미소 대표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미소 대표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꿈꾸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들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 초기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공의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말고,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며 자신감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창업이라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는 과정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미소 대표는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모든 도전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취재/ 유재혁 홍보기자(db1345@naver.com)
다음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베러모먼트코퍼레이션 김준영 대표, 강연 진행
이전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옴니콤미디어 양희윤 전 대표, 강연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세종특강
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1] 옴니콤미디어 양희윤 전 대표, 강연 진행
2025-04-08
hit
319
‘옴니콤미디어’ 양희윤 전 대표가 지난 2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양희윤 대표는 강연에서 광고 대행사의 세계가 매우 넓다고 말했다. 광고 시장을 선도하는 양 대표의 강연을 직접 현장에 가 들어봤다.
▲양희윤 대표
점점 커지는 광고 시장
양희윤 대표는 브랜드와 제품이 서로 다른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B2C 기업뿐만 아니라 B2B 기업도 브랜드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가 크게 광고 대행사, 홍보 대행사, 리테일 마케팅 대행사, 디지털 대행사, SNS 대행사로 나뉜다며 각각의 예시를 들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대행사 업무 영역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으며, 주식·숫자·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도 은행에서 일하다가 광고 기획자로 노선을 변경해 광고업계로 들어왔다고 말하며, 광고 시장의 경계가 넓어진 만큼 미디어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걸 다 도전해 보라고 조언했다.
타깃 오디언스의 중요성
양희윤 대표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깃 오디언스라고 말했다. 그는 타깃 인사이트가 우리 삶의 전반을 관통하는 개념이라고 말하며, 커뮤니케이션할 타깃을 정의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대표는 나이, 성별, 지역, 직업 등의 데모그래픽도 중요하지만 사회 계층, 라이프 스타일, 개성 등의 사이코그래픽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 화장품 등을 예시로 들어 타깃 오디언스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독립 변수인 광고비와 종속 변수의 세일즈 매출이 양의 상관관계를 띠는 심플한 마케팅의 세계였지만, 현재는 디지털의 출시로 인해 복잡한 마케팅의 세계가 되었다고 말했다.
▲양희윤 대표가 질의응답하고 있다.
AI 시대에서의 광고 시장
양희윤 대표는 AI가 출시되면서 미디어뿐만 아니라 대행사의 업무도 많이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SNS 광고 시장의 변동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양 대표는 자신의 부모님 세대에는 없던 새로운 분야의 기업을 스스로가 일궈냈듯이, 다가오는 AI 시대에 학생들 중 누군가가 새로운 세계를 열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각자 멋진 직업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항상 ‘BEST’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Finding One Better Way’라는 말을 끝으로 강연을 마쳤다.
취재/ 문준호 홍보기자(mjh30279@naver.com)
다음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밭 이미소 대표, 강연 진행
이전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필라멘트리 문두열 대표, 강연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세종특강
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1] 필라멘트리 문두열 대표, 강연 진행
2025-04-15
hit
164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업 필라멘트리의 문두열 대표가 지난 4월 9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창업 특강을 진행했다. 방송사 PD 출신으로 콘텐츠 스타트업을 창업해 연쇄 창업과 투자까지 영역을 확장해 온 문두열 대표의 강연을 직접 들어봤다.
▲문두열 대표
프레임을 설정하는 콘텐츠 전략
문두열 대표는 유리병에 담긴 박카스와, 같은 음료를 플라스틱 병에 옮겨 담았을 때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예시로 들며 강연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용물보다 외형, 즉 프레임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며 콘텐츠 역시 그 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을 창업에 연결시켜 창업 아이템도 어떻게 프레이밍하고 포지셔닝하느냐에 따라 같은 아이템이라도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계산기’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해석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사물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창조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패를 통해 성공에 다가가는 구조적 반복
문두열 대표는 창업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 대표는 첫 사업 당시 콘텐츠 제작 경험은 있었지만 창업 지식은 전무한 상태로 후원을 받기 위해 직접 만든 PPT 하나를 들고 여러 기관들을 찾아다녔고, 결국 2억여 원의 후원을 이끌어내며 첫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그는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은 통계적으로 낮지만, 열두 번 정도 도전하면 반드시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다며 이를 확률적 구조로 이해하고 성공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도전할 것을 조언했다. 다만 창업 도전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과감히 포기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이때 정부나 학교의 창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 자본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한 다양한 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두열 대표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협업과 창업에 필요한 요소
강연 말미에는 조직문화와 동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문 대표는 처음에는 친구들로부터 ‘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함께할 동료를 만나면서 사업이 가능해졌다고 회고했다. 그는 동료를 ‘나를 세뇌시키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울’이라고 표현하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인 만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라멘트리의 사내 구조를 예시로 들며 수직적인 명령 구조보다는 자율성과 책임이 공존하는 수평적 조직문화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라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창업에 필요한 요소로 동기, 재능, 운을 꼽으며, 이 중 어느 하나가 월등한 것보다 어느 하나가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매일 일정한 루틴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본인을 세뇌하고 실천을 반복하다 보면 진짜 원하는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목표가 생기는 순간 인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갖게 된다고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취재/ 유재혁 홍보기자(db1345@naver.com)
다음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옴니콤미디어 양희윤 전 대표, 강연 진행
이전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더존비즈온 지용구 부사장, 강연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세종특강
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더존비즈온 지용구 부사장, 강연 진행
2025-04-25
hit
201
더존비즈온’ 부사장이자 ‘더존넥스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지용구 대표가 지난 16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업무 도구의 진화, 업무 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지용구 대표는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또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삶에서 창업이라는 키워드와 기업가 정신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현장에 가 강연을 들어봤다.
▲지용구 대표
목적성을 가져라
지용구 대표는 기업의 자산과 업무를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인 ‘Amaranth 10’을 만들었다. 그는 쉽고 안전하게 기술과 정보에 접근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는 스마트한 ICT 기술 도구를 만들고자 했고, 이에 성공하여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86%가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지 대표는 AI를 데이터를 쌓는 도구라고 정의하며, 작년부터 이를 자사 플랫폼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지식이 된다고 말하며, 기업이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AI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창업이라는 것이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하며,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에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명 의식을 갖게 하라
지용구 대표는 기술과 아이디어 없이 회사를 창업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설령 기술을 잘 모를지라도 기술을 다루는 사람과 최소한의 소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직원들에게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건 어려우나, 사명 의식과 소명 의식을 갖게 하는 건 리더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사명 그룹∙직업 그룹∙노동 그룹으로 나누며, 리더로서 직원들을 사명 그룹에 속하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인 칼릴 지브란이 말한 ‘만일 그대가 무관심 속에서 빵을 굽는다면 그대는 인간의 배고픔을 반밖에는 채우지 못하는 맛없는 빵을 굽는 것과 같다’는 명언을 인용하여, 사명 의식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지용구 대표가 질의응답하고 있다.
세상을 즐겨라
지용구 대표는 힘들지 않은 의미 있는 일, 힘들지 않으면서 재미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며, 자기가 맡은 일을 즐기면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열정적으로 살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인드 셋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 대표는 창업자가 사업 성장 단계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을 유연하게 변화하여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틀린 결정보다 느린 결정이 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들에게 열심히만 노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열심히 똑똑하게 일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 세대에 영리하게 일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말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응원한다는 말을 전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취재/ 문준호 홍보기자(mjh30279@naver.com)
다음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필라멘트리 문두열 대표, 강연 진행
이전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케어닥 장지호 전무이사, 강연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세종특강
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1] 케어닥 장지호 전무이사, 강연 진행
2025-05-08
hit
194
헬스케어 스타트업 ‘닥터나우’의 공동창업자이자 현재 케어닥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장지호 전무이사가 지난 4월 30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실패가 두려운 우리에게’ 를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서 장 전무이사는 본인의 창업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현실적인 창업 조언을 풀어냈다.
▲장지호 전무이사
실패는 가장 값비싼 자산
장지호 전무는 7번의 창업 실패 경험을 되짚으며 강연을 시작했다. 다양한 아이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했고, 시장의 흐름을 잘못 읽거나 시기상조였던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그는 실패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후회가 더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패를 겁내지 말고 도전하라고 권했다. 20대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며, 실패하지 않고 얻는 작은 성공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므로 진정으로 생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위해선 실패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을 만드는 사람, 흐름을 읽는 사람이 되라
실패의 반복 속에서도 장 전무는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시장조사나 경쟁 분석보다는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장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닥터나우’에 합류했고, 원격진료 플랫폼을 개발해 팬데믹 상황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장 전무는 ‘혁신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지금 당장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문제 해결의 의지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지호 전무이사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본인을 규정짓지 않는 태도와 ‘레이저 포커스’
창업자의 태도와 조직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사람은 자신을 규정하는 순간, 그 규정 안에 갇히게 된다며, 창업자라면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기보다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 과정에서의 핵심 역량으로는 ‘레이저 포커스’를 언급하며, 딱 하나의 문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해결하는 능력이야말로 창업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지호 전무는 “시장 1등이 되고 싶다면,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획력과 시장을 재정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확한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부딪히며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취재/ 유재혁 홍보기자(db1345@naver.com)
다음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더존비즈온 지용구 부사장, 강연 진행
이전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레드타이 정승환 대표, 강연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세종특강
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레드타이 정승환 대표, 강연 진행
2025-05-14
hit
121
국내 최대 컨시어지 그룹 ‘레드타이’ 정승환 대표가 지난 7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지금은 움직여야만 할 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가 사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기 위해 직접 강연 현장을 찾았다.
정승환 대표는 원래 목표가 세종대에 입학하는 것이었는데, 비록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세종대 학생들에게 강연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전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정승환 대표
인간관계와 나의 역할의 중요성
정승환 대표는 군대를 전역한 뒤 워커힐 호텔에서 프런트 직원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호텔 내에서 선후배 간의 가교 역할을 굉장히 잘했으며, 자신이 맡은 업무를 넘어 주변 동료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어떤 역할에 임할 때는 무슨 일을 처리하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지와 상관없이 분명히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 그럴 때 거만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업을 대하는 진정성과 책임감의 중요성
정승환 대표는 호텔에서 퇴사한 뒤 자기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초기 자본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이었고, 혼자 힘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트타임으로 현장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파트타임부터 슈퍼바이저 더 나아가 팀장까지 여러 일을 경험했다. 특히 그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도 마치 자신의 매장인 것처럼 열심히 일했다고 밝혔다. 매사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손님들이 자신을 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호칭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연습해야 언젠가 정말 사업을 했을 때 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을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사람들의 인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며 기회와 역할 또한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정승환 대표가 질의응답하고 있다.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는 힘의 중요성
정승환 대표는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사업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 보니, 기회가 하나둘씩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 대표는 회사 대표들이 자신과 같이 사람의 평소 행실을 보고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현재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미래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시대 흐름을 언급하며, 학생들 스스로가 빠른 수익을 만들고 싶은 요구가 있고 창업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하며 강연을 마쳤다.
취재/ 문준호 홍보기자(mjh30279@naver.com)
다음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케어닥 장지호 전무이사, 강연 진행
이전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오롤리데이 박신후 대표, 강연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세종특강
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1] 오롤리데이 박신후 대표, 강연 진행
2025-05-22
hit
69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롤리데이(Oh, Lolly Day!)’의 박신후 대표가 지난 5월 14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작은 브랜드가 10년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생존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서 박 대표는 10년 넘게 브랜드를 지속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브랜드의 생존 전략과 팬덤 마케팅, 그리고 건강한 조직문화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박신후 대표
진심으로 설득하는 작은 브랜드의 생존 전략
박신후 대표는 작은 브랜드가 대형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브랜드 초창기, 대형 광고비 경쟁 대신 제품의 완성도와 고객 경험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저렴한 가격대의 문구 제품이라도 포장에 정성을 더해 선물처럼 전달하고,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사용법과 의도를 담아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방식 등의 진심 어린 운영 방식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브랜드에 대한 공감과 이야기를 형성하게 했으며, 오롤리데이가 1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고 전했다.
숫자보다 밀도에 집중한 ‘찐팬’ 마케팅
박 대표는 2020년 인스타그램 계정 해킹 사건이 브랜드 운영 방식에 대한 반성과 전환점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기존의 공지형 게시물 위주 운영에서 벗어나, 이후 오롤리데이의 새 계정은 브랜드 철학과 제작 과정, 대표 개인의 고민까지 공유하는 소통의 창으로 바뀌었다. 그는 브랜드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찐팬’이라 불리는 진성 고객층이 생겨났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브랜드를 응원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존재가 되었다고 전했다. SNS 외에도 유튜브, 뉴스레터, 오프라인 매장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점을 강조하며, 숫자보다 밀도가 중요한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신후 대표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조직이 지속가능성을 만든다
박 대표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 운영을 위해서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롤리데이는 ‘행복을 파는 브랜드’라는 미션 아래, 실수와 고민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문화를 조성해왔으며, 구성원 각자가 성찰할 수 있는 리포트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는 이력서보다 ‘당신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가치관과 태도를 중시하며, 결국 브랜드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기에, 구성원 간의 신뢰와 유대가 브랜드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진심이 담긴 목표 설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 브랜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출발하며, 결국 그 진심이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취재/ 유재혁 홍보기자(db1345@naver.com)
다음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레드타이 정승환 대표, 강연 진행
이전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메이코더스 최새미 대표, 강연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연구
주요연구
원전 해체 발생 방사성 폐액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 소재 공정 개발
2023-07-24
hit
1162
원전 해체 발생 방사성 폐액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 소재 공정 개발
(Development of Eco-friendly Bio-material to Improve the Treatment Performance of Radioactive Liquid Waste from Decommissioning)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윤미용 교수
1. 서론 (Introduction)
전 세계적으로 영구 정지된 원전의 해체는 원전보유국으로서는 큰 국가적 목표이며, 국내에서는 현재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해체를 준비 중이다. 현재 전 세계 204기 영구정지 원전 중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4개국만이 해체를 완료한 경험이 있다. 해체 경험이 없는 한국은 소규모 원자력 시설(연구로 1·2호기, 우라늄변환시설) 및 운영 원전 대형 기기 교체(증기발생기, 원자로 압력관 및 원자로 헤드 교체) 경험을 통해 해체 기술을 확보 중이며, 계속해서 원전 해체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원전 해체 과정에서 대량의 방사성폐기물 발생, 막대한 해체 비용, 장기적 관리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준 및 발생량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해외 기술을 직접 도입하기보다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토의 면적 대비 인구가 많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증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현재 방사성 폐액 처리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온교환수지는 방사성 이온 물질로 포화가 되면 방사성 폐수지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2차 핵 폐기물이 양산 된다. 국내에서 겪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족 문제 때문에, 2차 핵폐기물 감용에 대한 관련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팀은 정부에서 주도 하는 원자력 에너지개발사업 일환으로 압타머를 적용한 폐액 처리 공정(그림 1)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보고된 연구에서 압타머가 특정 이온성 원소에 높은 선택성을 갖고 결합할 수 있다는 결과들과 본 연구팀이 코발트 및 니켈을 제거하는 압타머 기술을 바탕으로 압타머를 원자력분야에 적용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특정 표적 물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압타머 고유의 특징을 활용하여, 원전 해체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액 내 특정 원소를 제거 및 처리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림 1) 그리고 이를 방사성 폐액 처리에 활용함에 따라 액체 방사성폐기물 감용 및 처리비용 절감과 같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1) 압타머 기반 폐액 처리 공정 개요
2. 방사성물질 제어를 위한 방사성 금속 이온 특이적 압타머 발굴
압타머(Aptamer)는 “fitting”이라는 뜻을 가지는 라틴어 “aptus”와 그리스 접미사 “-mer”의 합성어로, 표적 분자에 친화적/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핵산(ssDNA, RNA)으로 구성된다. 즉, 압타머는 안정된 3차원 구조를 유지하면서 특정 분자에 특이적으로 강하게 결합한다는 특징을 지닌 친환경 바이오 소재이다. (그림 2)
(그림 2) 친환경 바이오 소재 압타머
친환경 바이오 소재인 압타머는 그 고유 구조에 의해 표적 물질 별로 선택성을 가지고 결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방사성 폐액 내 특정 원소를 제거하기 위한 ‘친환경 바이오 소재 공정’을 개발하였다.
압타며 발굴을 위해 보편적으로 SELEX(Systematic evolution of ligands by exponential enrichment) 기술이 사용된다. SELEX 기술은 1990년 Larry Gold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해당 기술을 통해 무작위로 합성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라이브러리(oligonucleotide library: 서로 다른 종류의 수십 조개의 압터머가 포함 되어있음)로부터 표적 물질과 친화력을 가지는 소수의 압타머를 선별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저분자 화합물부터 고분자 단백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적 물질에 친화력을 가지고 결합할 수 있는 압타머를 발굴할 수 있다. SELEX 방법에서 이용되는 단일 가닥 압타머는 1015개 이상의 다양한 염기서열을 포함하며, 양 말단에는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위한 프라이머(primer) 서열이 존재하는 특징을 지닌다. 무작위로 만들어진 압타머 라이브러리(library)에는 방사성 금속 이온과 강한 결합력을 가진 소수의 압타머 후보군들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성 금속 이온과 결합한 후보군들은 결합하지 않은 개체들과 구별되어 PCR로 증폭되고, 이러한 과정이 6~15회 반복되어 선별된다 (그림 3). 이때 SELEX의 전반적인 속도는 표적 물질에 결합하고 있는 압타머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선별해낼 수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반복된 실험과정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면서 결합 친화도가 높은 압타머를 선별하는 것이 SELEX 기술의 핵심이다.
(그림 3) SELEX(Systematic evolution of ligands by exponential enrichment)를 이용한 방사성 금속 이온 결합 압타머 발굴
위의 SELEX 방식을 통해 방사성 폐액에 존재하는 대표 핵종인 코발트(Co), 니켈(Ni), 망간(Mn) 이온에 대한 압타머를 발굴하였다. 각각의 표적 이온과의 결합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SPR(Surface Plasmon Resonance)로 결합 친화도(Kd value)를 측정한 결과, 10-9(nM)의 높은 결합력을 확인하였다. (표 1)
(표1) 발굴된 방사성 이온 압타머의 결합 친화도
3. 방사성물질 제어를 위한 압타머 구조분석 및 최적화
발굴한 방사성 이온 특이적 압타머의 효율성과 생산 단가 절감을 위해 압타머 서열 분석 및 압타머를 고정할 비드와의 결합 비율 최적화 단계를 수행하였다. 우선, SELEX를 통해 획득한 압타머의 금속 이온과 결합하는 부위 및 압타머 안정화에 관여하는 부위 등을 예측하기 위해 핵산 구조 분석 프로그램(m-fold/NUPACK)을 이용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압타머의 주요 부위 혹은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돌연변이(mutation) 혹은 제거(deletion) 등의 방식으로 변이를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압타머 2차 구조 변화 여부를 예측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표적 이온과 결합하는데 기여하는 결합 부위 서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깁스 자유 에너지(Gibbs free energy; ∆G) 값이 낮을수록 압타머 구조가 안정적이므로, 압타머의 2차구조 및 결합 부위 서열을 유지하면서 더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최적의 서열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산 단가 절감을 위해 결합 부위 서열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압타머 서열 만을 남기는 크롤링(crawling-염기 서열을 끝에서부터 일정하게 제거하면서 구조 변화를 검증) 방식을 통해 서열을 최적화 하였다. (그림 4)
(그림 4) 구조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압타머 구조 분석 및 서열 최적화
최적화된 압타머 서열 획득한 후, 압타머를 고정할 비드와의 최적 결합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하나의 비드에 압타머 10개가 최대치로 결합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산술적으로 최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압타머 개수를 1개부터 조금씩 양을 늘려서 언제 압타머 개수가 최대치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압타머에 형광을 붙인 상태에서 위의 실험을 수행한다면, 압타머 개수가 10개에 도달했을 때 형광 값이 가장 밝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10개 이상이면 더 이상 밝기가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값을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압타머를 최대치로 붙이는 것이 최선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압타머의 밀도가 높은 경우, 오히려 서로 금속 이온 결합에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팀은 압타머를 비드에 최대치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금속과 결합하는 비드/압타머 비율을 결정하는 실험을 별도로 수행하였다. 기존 방법(형광 현미경 혹은 형광측정기)으로는 압타머/비드 효율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는 데 반해, 본 연구팀은 새로운 방식을 접목시켜 쉽고 빠르게 압타머/비드 비율 최적화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5A에서 보듯이, Flow cytometry(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하여 형광이 부착된 압타머와 비드 복합체를 분석하면 실험에 사용된 모든 압타머/비드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샘플의 질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림 5A, B). 나아가, 이와 같이 새로 접목된 실험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 방식(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유세포분석기 결과를 검증하였다. 그림 5를 통해 서로 다른 실험 방식에서 유사한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A, C, D).
(그림 5) 유세포 분석기(A-C)와 형광 현미경(D)을 이용한 압타머-비드 복합체 비율 결정 실험 결과
4. 최적화된 방사성 이온 압타머의 성능 평가
방사성물질 제어를 위한 금속 이온 압타머의 이온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타머의 이온 제거 성능과 제거한 이온을 다시 회수한 뒤 압타머를 재사용 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압타머의 성능 평가에는 금속 이온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를 사용하였다. (그림 6)
(그림 6) ICP-OES를 통한 압타머 성능 평가 (제거율 및 수거율)
본 연구팀은 코발트, 니켈, 망간, 유로피움 등의 원소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압타머를 다수 발굴하였다. 이렇게 발굴한 코발트, 니켈, 망간에 특이 결합하는 압타머를 비드에 각각 고정시킨 후 각각의 표적 이온을 대상으로 이온 제거율 및 제거한 이온 수거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에서 코발트, 니켈, 망간 압타머 모두 99% 이상의 표적 이온 제거율이 보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7A).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운용 중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방사성 금속이온 제거용 이온교환수지의 경우 방사성 금속이온으로 포화가 되면, 이를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2차 핵폐기물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국내 핵폐기물장의 부지 선정의 지연으로, 이러한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원자력분야의 최대 골칫거리로 자리잡고 있다. 이온교환수지에서 방사능 금속 이온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 또한 황산 등의 강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2차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강산과 섞여 있는 방사성 물질의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에는 방사능 물질로 포화된 이온교환수지를 핵폐기물장에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2차 핵 폐기물 감용 기술 개발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팀이 개발한 압타머/비드 컬럼을 사용했을 경우 컬럼에 결합되어 있는 방사성 금속 이온을 쉽게 분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컬럼을 이용한 결과, 그림 7B에서 보듯이 분리된 금속 이온이 99.96% 이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이는 기술력이 수거율 100%에 이를 정도로 발전 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7) 압타머의 표적 이온 (A) Removal rate(제거율) 및 (B) Recovery rate(수거율)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압타머로 포집한 방사성 금속 이온을 거의 100%에 가까운 수거율로 회수 할 수 있다는 것은, 압타머/비드 컬럼 내에 방사성 금속 이온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는 제품을 다시 재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을 재사용 한다는 것은 유지 비용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과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압타머/비드 컬럼의 재사용 검증 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림 8). 그림에서 보이듯이 20회 정도의 반복적인 재사용에도 95% 이상의 코발트 이온의 제거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재사용 회수를 늘려 제거율 측정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8) 압타머의 재사용 횟수에 따른 제거율
압타머는 기본 구조에 음성을 띠고 있어 양이온과의 결합이 쉽게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팀이 개발한 압타머가 표적 이온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실험을 진행 하기 위해 9가지 이온 혼합 샘플을 압타머 기반 컬럼으로 처리하고, 처리 전과 후의 농도를 측정하여 제거율을 평가하였다. 코발트/니켈/망간 특이적 압타머 혼합 컬럼의 경우 대상 이온에 대해 70~85% 정도의 높은 제거율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압타머가 대상 금속 이온에 대해 높은 선택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9)
(그림 9) 다표적(코발트, 니켈, 망간 압타머) 컬럼의 표적 이온 선택성 검증
5. 현장 시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본 연구팀이 개발한 압타머들이 높은 선택성으로 표적 방사성 이온을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실험실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샘플들은 대상 방사성 이온만 존재하게끔 만든 인위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 샘플을 이용한 검증이 필요하였다. 실제 방사성 조건에서도 압타머를 이용한 제거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 된 현장 시험은 크게 두 곳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였다. 한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물질 포함 시료를 대상으로 현장 시험을 수행하였고, 다른 한 곳은 영광 한빛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1차 계통수를 대상으로 현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독립된 실험 두 곳에서 방사성 이온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0).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험한 경우 실험실 조건과 동일하게 99%의 방사성 코발트와 니켈 금속 이온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빛원자력발전소 역시 다양한 방사성 금속 이온이 샘플 내에 존재하였지만, 90%의 방사성 코발트와 망간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 방사성 조건에서 압타머 성능평가를 위한 현장 시험
6. 결론 및 전망 (Conclusion and outlook)
본 연구는 의료 및 산업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압타머를 원자력 분야에 도입하여 방사성 폐액에 존재하는 이온성 원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신규 공정을 개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특히 본 연구팀이 개발한 압타머/비드 컬럼은 방사성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을 90% 넘는 높은 효율로 제거 하였기 때문에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표적 물질 특이적 압타머 기술을 활용한 방사성 폐액 처리용 압타머 컬럼은 표적 방사성 이온에 결합력이 특히 강하므로, 이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폐액의 특성 및 환경에 맞춰 처리 공정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팀은 압타머 개발 시 표적 이온과의 결합 예측 부위 분석으로 결합에 관여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열은 제거함으로써 압타머의 생산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개발된 압타머는 표적 이온을 높은 선택성으로 포집하는 것이 가능하고, 포집된 이온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특히 개발한 압타머/비드 컬럼에 포집된 이온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 하여 추후 현장에 적용할 때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반복적인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현장에서 유지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사용자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존 방사성 이온 제거 방식인 이온교환수지의 경우 방사성 물질로 포화가 되면 2차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되어 왔지만, 본 연구팀이 개발한 압타머/비드 컬럼의 경우 2차 방사성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 중 원자력발전소 및 발전소 해체 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 양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험실 규모의 저용량 규모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실제 원전 해체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원전 해체 환경 혹은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하여 방사성 폐액 양의 증가, 컬럼에 유입되는 폐액 유압 및 유속 등이 압타머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이 추가로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압타머를 이용하여 방사성 이온을 제거 하는 기술은 국내외 유일하기 때문에 추가 연구를 통해 방사성 폐액 처리 기술 및 공정 개발이 완벽하게 이뤄지면 관련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기술은 해체 발생 폐액 외에도 특정 금속 이온을 제거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높은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 본 기술은 특정 원소를 제거 및 회수 한다는 점에서 타 기술들과 차별화되므로 원천기술의 고도화를 통하여 미래 환경분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래드코어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김송현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되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참고문헌
1. 압타머 활용 해체 원전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량 예측 및 저감 방안 도출. 방사선산업학회지 2022, vol. 16, no.4, pp.497-503.
2. RNA 앱타머 (Aptamer): 간단한 원리부터 복잡한 응용까지. 분자세포생물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7년 3월 p. 23-29.
3. Sun Young Lee, Dae Hyuk Jang, Hyuncheol Kim and Miyong Yun. 2023. Removal and isolation of radioactive cobalt using DNA aptamers. Radiochimica Acta. 2022-0112.
4. Sekhon, S. S., Lee, S. H., Lee, K. A., Min, J., Lee, B. T., Kim, K. W., Ahn, J. Y., Kim, Y. H. Defining the copper binding aptamotif and aptamer integrated recovery platform (AIRP). Nanoscale 2017, 9, 2883–2894.
5. Eilers A, Witt S and Walter J. 2020. Aptamer-Modified Nanoparticles in Medical Applications. Adv. Biochem. Eng. Biotechnol. 174:161-193.
6. Tuerk C and Gold L. 1990. Systematic evolution of ligands by exponential enrichment: RNA ligands to bacteriophage T4 DNA polymerase. Science 249(4968):505-510.
7. Hofmann HP, Limmer S, Hornung V and Sprinzl M. 1997. Ni2+-binding RNA motifs with an asymmetric purine-rich internal loop and a G-A base pair. RNA 3(11):1289-1300.
8. Rajendran M and Ellington AD. 2008. Selection of fluorescent aptamer beacons that light up in the presence of zinc. Anal. Bioanal. Chem. 390(4):1067-1075.
다음글
Low-acceleration catastrophe of gravity from Gaia observations of wide binary stars: dawn of a new scientific revolution
이전글
초실감 메타버스를 위한 궁극의 3D 오디오 기술: 사운드 트레이싱 (Sound tracing)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연구
주요연구
Low-acceleration catastrophe of gravity from Gaia observations of wide binary stars: dawn of a new scientific revolution
2023-07-24
hit
2083
Low-acceleration catastrophe of gravity from Gaia observations of wide binary stars: dawn of a new scientific revolution
Department of Phsics & Astronomy,
Sejong University
Prof. Kyu-Hyun Chae
A new study reports conclusive evidence for the breakdown of standard gravity in the low acceleration limit from a verifiable analysis of the orbital motions of long-period, widely separated, binary stars, usually referred to as wide binaries in astronomy and astrophysics. The study carried out by Kyu-Hyun Chae, professor of physics and astronomy at Sejong University in Seoul, used up to 26,500 wide binaries within 650 light years (LY) observed by European Space Agency’s Gaia space telescope.
▲Left: A binary star system with a nested inner binary (credit: Wikipedia). Right: Gravitational anomaly at low acceleration observed in 20,000 wide binaries (credit: Kyu-Hyun Chae)
For a key improvement over other studies Chae’s study focused on calculating gravitational accelerations experienced by binary stars as a function of their separation or, equivalently the orbital period, by a Monte Carlo deprojection of observed sky-projected motions to the three-dimensional space. Chae explains on this point, “From the start it seemed clear to me that gravity could be most directly and efficiently tested by calculating accelerations because gravitational field itself is an acceleration. My recent research experiences with galactic rotation curves led me to this idea. Galactic disks and wide binaries share some similarity in their orbits, though wide binaries follow highly elongated orbits while hydrogen gas particles in a galactic disk follow nearly circular orbits.” Also, unlike other studies Chae calibrated the occurrence rate of hidden nested inner binaries at a benchmark acceleration as shown in the Figure.
The study finds that when two stars orbit around with each other with accelerations lower than about one nanometer per second squared start to deviate from the prediction by Newton’s universal law of gravitation and Einstein’s general relativity. For accelerations lower than about 0.1 nanometer per second squared, the observed acceleration is about 30 to 40 percent higher than the Newton-Einstein prediction. The significance is very high meeting the conventional criteria of 5 sigma for a scientific discovery. In a sample of 20,000 wide binaries within a distance limit of 650 LY two independent acceleration bins respectively show deviations of over 5 sigma significance in the same direction.
Because the observed accelerations stronger than about 10 nanometer per second squared agree well with the Newton-Einstein prediction from the same analysis, the observed boost of accelerations at lower accelerations is a mystery. What is intriguing is that this breakdown of the Newton-Einstein theory at accelerations weaker than about one nanometer per second squared was suggested 40 years ago by theoretical physicist Mordehai Milgrom at the Weizmann Institute in Israel in a new theoretical framework called modified Newtonian dynamics (MOND) or Milgromian dynamics in current usage.
Moreover, the boost factor of about 1.4 is correctly predicted by a MOND-type Lagrangian theory of gravity called AQUAL, proposed by Milgrom and the late physicist Jacob Bekenstein. What is remarkable is that the correct boost factor requires the external field effect from the Milky Way galaxy that is a unique prediction of MOND-type modified gravity. Thus, what the wide binary data show are not only the breakdown of Newtonian dynamics but also the manifestation of the external field effect of modified gravity.
On the results, Chae says, “It seems impossible that a conspiracy or unknown systematic can cause these acceleration-dependent breakdown of the standard gravity in agreement with AQUAL. I have examined all possible systematics as described in the rather long paper. The results are genuine. I foresee that the results will be confirmed and refined with better and larger data in the future. I have also released all my codes for the sake of transparency and to serve any interested researchers.”
Unlike galactic rotation curves in which the observed boosted accelerations can, in principle, be attributed to dark matter in the Newton-Einstein standard gravity, wide binary dynamics cannot be affected by it even if it existed. The standard gravity simply breaks down in the weak acceleration limit in accordance with the MOND framework.
Implications of wide binary dynamics are profound in astrophysics, theoretical physics, and cosmology. Anomalies in Mercury’s orbits observed in the nineteenth century eventually led to Einstein’s general relativity. Now anomalies in wide binaries require a new theory extending general relativity to the low acceleration MOND limit. Despite all the successes of Newton’s gravity, general relativity is needed for relativistic gravitational phenomena such as black holes and gravitational waves. Likewise, despite all the successes of general relativity, a new theory is needed for MOND phenomena in the weak acceleration limit. The weak-acceleration catastrophe of gravity may have some similarity to the ultraviolet catastrophe of classical electrodynamics that led to quantum physics.
Wide binary anomalies are a disaster to the standard gravity and cosmology that rely on dark matter and dark energy concepts. Because gravity follows MOND, a large amount of dark matter in galaxies (and even in the universe) are no longer needed. This is also a big surprise to Chae who, like typical scientists, “believed in” dark matter until a few years ago.
A new revolution in physics seems now under way. On the present results and the future prospects, Milgrom says, “Chae’s finding is a result of a very involved analysis of cutting-edge data, which, as far as I can judge, he has performed very meticulously and carefully. But for such a far-reaching finding -- and it is indeed very far reaching -- we require confirmation by independent analyses, preferably with better future data. If this anomaly is confirmed as a breakdown of Newtonian dynamics, and especially if it indeed agrees with the most straightforward predictions of MOND, it will have enormous implications for astrophysics, cosmology, and for fundamental physics at large.“
Xavier Hernandez, professor at UNAM in Mexico who first suggested wide binary tests of gravity a decade ago, says, “It is exciting that the departure from Newtonian gravity that my group has claimed for some time has now been independently confirmed, and impressive that this departure has for the first time been correctly identified as accurately corresponding to a detailed MOND model. The unprecedented accuracy of the Gaia satellite, the large and meticulously selected sample Chae uses and his detailed analysis, make his results sufficiently robust to qualify as a discovery.”
Pavel Kroupa, professor at Bonn University and at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has come to the same conclusions concerning the law of gravitation. He says, "With this test on wide binaries as well as our tests on open star clusters nearby the Sun, the data now compellingly imply that gravitation is Milgromian rather than Newtonian. The implications for all of astrophysics are immense."
The finding was published in the 1 August 2023 issue of the Astrophysical Journal.
Reference: https://iopscience.iop.org/article/10.3847/1538-4357/ace101 “Breakdown of the Newton–Einstein Standard Gravity at Low Acceleration in Internal Dynamics of Wide Binary Stars” (The Astrophysical Journal, 2023, Vol. 952, article ID 128)
다음글
기뢰 매몰률 예측에 대한 기술동향 및 발전방향
이전글
원전 해체 발생 방사성 폐액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 소재 공정 개발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연구
주요연구
초실감 메타버스를 위한 궁극의 3D 오디오 기술: 사운드 트레이싱 (Sound tracing)
2023-10-24
hit
1368
초실감 메타버스를 위한 궁극의 3D 오디오 기술: 사운드 트레이싱 (Sound tracing)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우찬
1. 서론
최근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용어가 산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주요하게 거론되는 키워드이다. 메타버스는 가상 혹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즉,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 가상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실제로 메타버스의 개념은 단순한 이론적인 존재를 넘어, 현재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그 활용 사례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IT 기업들이다. 많은 기업이 메타버스의 무한한 잠재력을 인지하며, 이를 중심으로 연구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몰입도와 현실감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요 연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시각적 연구를 넘어서 청각적 연구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현존하는 오디오 기술의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애플의 Vision Pro (왼쪽)과 메타의 Meta Quest3 (오른쪽)
기존의 오디오 기술은 메타버스에서 원하는 수준의 몰입도와 현실감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사용자 주위에 다양한 환경과 물리적인 특성들을 반영하기 어려워, 사용자들에게 초실감 오디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IT 기업이 초실감 오디오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애플은 메타버스와 유사한 개념인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을 위한 HMD(Head Mounted Display) 기기인 Vision Pro를 공개하였고 자사 제품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오디오 솔루션인 오디오 레이트레이싱(audio raytracing)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메타도 최근 혼합현실(Mixed Reality)을 위한 HMD로서 Meta Quest3를 발표하였고 해당 제품 또한 초실감 오디오를 강조하였다[1, 2].
이처럼 메타버스의 성공은 단순히 시각적인 경험을 넘어서, 청각적인 경험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현실 세계의 모든 물리적인 특성과 상호작용을 디지털 환경에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사운드 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 최신의 IT 기기들이 초실감 오디오 기술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러한 트렌드의 반영이다. 본 기사에서는 오디오 기술의 동향과 최신 오디오 기술인 Geometric Acoustic (GA) 기반 사운드 트레이싱을 살펴보고,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저전력/고성능을 위한 사운드 트레이싱 하드웨어를 소개한다.
2. 오디오 기술 동향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오디오 기술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멀티채널 오디오 (Multi-channel audio), HRTF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 사운드 렌더링 (Sound Rendering).
[그림 2] 7.2 멀티채널 오디오 예시 (front left (FL), front right (FR), center (C), surround left (SL), surround right (SR), front presence L (FPL), front presence right (FPR), subwoofer (SW) * 2) [3]
멀티채널 오디오는 다양한 스피커들을 활용하여 청취자 주변에 입체적인 소리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5.1, 7.1 혹은 그 이상의 채널을 활용하여, 청취자는 실제 환경과 같은 소리의 방향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림 2] 참조). 영화관, 홈시어터 등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여 청취자에게 깊은 몰입감을 제공한다. Dolby나 Auro3D와 같은 오디오 전문 회사들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여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이 방식이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멀티채널 사운드를 경험하려면 특정 형식을 지원하는 스피커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그 설치를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둘째, 스피커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 사용자의 위치나 방향이 바뀜에 따라 소리를 다시 조절해야 한다.
HRTF는 음원(sound source)의 방향에 따른 소리의 진폭(amplitude)을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인간의 귀와 머리의 형태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HRTF는 이런 특징을 이용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음원의 방향에 따른 소리의 감쇄 값(attenuation) 테이블이 필요하다. 이는 실제 무향실에서 스피커와 사람의 머리와 귀의 형태를 모방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방향에서의 주파수 대역별 감쇄 값을 측정하여 생성한다.
[그림 3] HRTF 처리 방식의 예시
[그림 3]은 HRTF 처리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음원으로부터 귀까지의 방향이 정해지면, 방향에 따라서 주파수 대역별 감쇄 테이블로부터 감쇄 값을 가져온다. 그 후 음원 데이터와 감쇄 값의 콘볼루션 연산을 통해 최종 오디오를 생성한다. 해당 방식은 방향에 따른 감쇄를 주파수 대역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은 오디오 퀄리티를 제공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머리와 귀의 크기와 형태가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된 경험이 어렵고, 음원의 개수가 많아졌을 때 계산 복잡도가 올라가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방향에 특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소리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사운드 렌더링은 음원을 생성하는 음원 합성 단계, 소리의 파형을 모델링하는 사운드 전파 단계, 최종 오디오 시그널을 생성하는 사운드 생성 단계를 거쳐서 청취자 주위에 물리적인 소리 효과들을 계산하여 현실적인 소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즉, 청취자, 음원, 주변 환경(재질, 차폐, 방 크기 등)들과의 상호작용을 전부 고려하여서 현실과 같은 물리적인 소리가 만들어진다.
이 중 핵심 단계는 소리의 파형을 모델링하여서 청취자 주위에 물리적인 환경을 반영하게 해주는 사운드 전파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wave 기반 방식과 geometric acoustic (GA) 기반 방식으로 나뉜다. Wave 기반 방식은 2차 편미분 방정식(second-orde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이루어진 파동방정식을 풀면서 실제 소리 파형을 그대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는 매우 정확하게 현실과 같은 소리가 가능하지만 엄청난 컴퓨팅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실시간(real-time rates) 처리를 필요로 하는 메타버스와 같은 콘텐츠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반면에 GA 방식은 소리의 파동을 직접적으로 모델링하는 대신 ray, beam, frustum 등을 이용하여서 음원, 청취자, 그리고 씬의 기하학적 정보 (geometry information of scene) 사이에 유효한 경로(path)들을 찾는 것이다. 해당 경로들은 소리를 생성하기 위한 여러 매개변수(parameters)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소리의 방향, 소리의 속도, 소리의 딜레이, 차폐 여부, 주파수 밴드에 따른 감쇄 등이 있고 이들은 Impulse Response (IR)이라는 형태로 압축되어 저장된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최종적으로 스피커나 이어폰과 같은 end-point device에서 출력될 소리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GA 방식은 wave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대략적인(approximately) 방식이지만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하여서 메타버스와 같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 본 연구팀은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을 이용한 GA 기반 사운드 전파 방식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으며, 이를 사운드 트레이싱(sound + ray tracing = sound tracing)이라고 명명했다. 이하 본문에서는 사운드 전파를 사운드 트레이싱(혹은 sound tracing)이라고 표기한다.
3. Ray를 이용한 사운드 트레이싱
[그림 4] 시간에 따른 다양한 소리 효과들의 amplitude (direct sound, ER, LR)
사운드 트레이싱은 ray를 이용해 다양한 소리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그림4]는 시간에 따라서 소리 효과들(direct sound, early reflection (ER), late reverberation (LR))의 amplitude 특성을 보여준다. Direct sound는 음원으로부터 청취자까지 직접 오는 소리이며 음원과 청취자 사이에 방향과 거리에 따른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다른 효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amplitude도 매우 크다.
ER은 직접음이 도착한 이후에 들어오는 반사음(echo)이며, 일반적으로 직접음 ~ 60ms의 사이의 딜레이를 충족하는 반사음들로 ER이 정의된다. 이는 오브젝트들과의 반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amplitude를 가지지만 direct sound의 amplitude를 보강할 수 있고 소리를 좀 더 명료해지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LR은 잔향음 (2차 반사음)으로 초기반사음 이후에 들어오는 반사음들을 의미한다. 현실에서 콘서트홀이나 연주회장 같은 곳에서 울림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소리가 바로 잔향음이다. 이는 소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청취자에게 주변 공간의 크기, 재질, 반사율 등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소리 효과들이 생성되어야만 현실과 유사한 소리를 생성해 낼 수 있는데, 이들은 ray를 이용한 사운드 트레이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레이 트레이싱과 매우 유사하다. 레이 트레이싱은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발사되어 다양한 객체와 상호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반사되어 오는 빛의 색상을 계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운드 트레이싱은 음원으로부터 발사되는 ray(소리)가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우리 귀로 들어오게 되는 소리를 찾는 것이다.
[그림 5] 사운드 트레이싱 path의 종류
[그림 6] 사운드 트레이싱 SW 모바일 데모
사운드 트레이싱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수 개의 음원의 위치에서 ray를 슈팅하고 청취자 위치에서 ray를 슈팅한다. 슈팅 된 각각의 ray는 자신과 hit 된 primitive(예, triangle)를 찾고, hit 된 primitive에 대하여 반사, 투과, 회절에 해당하는 ray를 생성한다. 이와 같은 처리는 ray의 생성, 탐색, 충돌검사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과정이 재귀적(recursive)으로 수행되면서 사운드 트레이싱 path의 IR과 잔향의 IR를 만든다.
음원(혹은 청취자)에서 슈팅 된 ray가 청취자(혹은 음원)와 만나게 될 수 있으며, 만나게 되는 path를 사운드 트레이싱 path라고 한다. 이는 결국 음원(혹은 청취자) 위치에서 출발한 sound가 그림 5와 6과 같이 반사, 투과, 흡수, 회절 등을 거쳐서 청취자(혹은 음원)에 도착하는 유효한 path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운드 트레이싱 paths를 기반하여 IRs들이 계산된다.
사운드 트레이싱은 잔향을 생성하기 위한 모델로서 Eyring model[4]을 이용하는데, 이는 음원의 intensity가 얼마나 떨어져야 하고 얼마 동안 잔향이 생성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Eyring model을 사용하기 위해선 필요한 몇 가지 매개변수들을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공간의 넓이와 부피, 표면의 평균 흡수 계수 등이 있다. 이러한 매개변수들을 구하기 위해 음원과 청취자로부터 슈팅되어 hit 된 primitive들이 이용된다. 계산된 매개변수들은 IR로 압축되어 저장된다. 최종 오디오는 사운드 트레이싱 paths로 생성된 IRs과 잔향의 IRs을 이용하여서 생성되어 스피커나 헤드셋을 통해 출력된다.
사운드 트레이싱은 초실감 메타버스에 적합한 오디오 기술이지만 몇 가지 단점들이 있다. 첫째, 많은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다른 중요한 작업들(예, 그래픽 프로세싱)에게 영향을 미치면 애플리케이션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너무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 소비 전력이 크다면 모바일 같은 환경에선 쓰로틀링¹ (throttling) 현상이 생기고 이는 성능 저하로 직결된다. 마지막으로, 음원의 개수가 많아졌을 때 사운드 트레이싱의 컴퓨팅 복잡도가 올라가서 실시간 처리를 위한 성능(예, 30 FPS or 60 FPS)까지 나오지 않는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운드 트레이싱을 가속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하드웨어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저전력/고성능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fully dynamic scene²까지 지원하여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오디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¹쓰로틀링(throttling): CPU나 GPU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클록과 전압을 강제적으로 낮추거나 전원을 꺼서 발열을 줄이는 기능.
²다이나믹 씬(dynamic scene): 시간에 따라서 혹은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반응하여 변환하는 객체들을 포함하는 환경.
4. 본 연구팀의 사운드 트레이싱 하드웨어
사운드 트레이싱 하드웨어는 ray tracing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의 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사례가 없다. 본 연구팀은 20여 년간 레이 트레이싱 하드웨어에 대한 연구개발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운드 트레이싱 하드웨어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6, 7].
[그림7]은 사운드 트레이싱 IP³가 구현되어 있는 Xilinx 보드, Host(예, PC, mobile device), 그리고 Xilinx 보드와 Host를 통신하기 위한 FMC 보드를 보여준다. 사운드 트레이싱 하드웨어는 호스트로부터 USB3.0을 통해 geometry data, 음원 데이터, 가속 구조체⁴ 정보 등을 받고 나서 하드웨어 시작 신호를 받으면 사운드 트레이싱 처리를 담당하는 sound tracing unit이 시작된다.
[그림 7] Sound tracing 하드웨어는 sound tracing IP가 들어가 있는 Xilinx Virtex Ultrascale과 호스트와 연결하기 위한 FMC 보드로 구성되어 있고 USB 3.0을 통해 호스트 데이터를 주고받음.
[그림 8] 본 연구팀이 설계한 sound tracing unit의 전체 아키텍처
[그림8]은 본 연구팀이 설계한 sound tracing unit의 전체 아키텍처를 보여준다. 이는 ray processing과 sound processing으로 나뉜다. Ray processing은 레이 트레이싱을 담당하는 units 들로 ray의 생성, 탐색, 교차 테스트 등을 담당한다. 반면에, sound processing은 소리를 생성할 수 있는 유효한 경로들을 찾는 units 들로 ray processing에 의해 찾아진 primitive들이 어떤 타입(반사, 회절 등)의 paths를 생성할 수 있는지, 유효한 경로들인지에 대한 검증, 찾아진 유효한 경로들에 대한 IRs 계산 등을 수행한다.
표1. CPU 방식과 사운드 트레이싱 하드웨어 음원 개수별 성능 비교
본 연구팀은 사운드 트레이싱 FPGA(140MHz)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그래픽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Sibenik (79,000개 triangles, indoor) 씬에서 CPU (i9-10850k 3.6GHz) 가속 방식의 사운드 트레이싱과 비교하였다. 실험은 음원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사운드 트레이싱의 평균 frame time (처리 속도)을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운드 트레이싱 FPGA의 성능이 CPU 가속 방식보다 평균 3.85배 빠르게 처리되었다.
본 연구팀이 사운드 트레이싱 ASIC⁵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PPA (performance, power, area)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지표는 ASIC의 성능, 전력, 면적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본 연구팀은 해당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8nm 설계 공정과 디자인 컴파일러 툴을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운드 트레이싱 ASIC의 PPA는 900MHz 성능, 50mW 전력, 0.31mm² 사이즈를 보여주었다. ASIC의 성능은 FPGA 성능보다 약 6.42배 높아지는 것이고, ASIC의 전력은 i9-10850k(125W)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보이며, ASIC의 사이즈는 최근 모바일 AP의 사이즈가 100 mm²을 넘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운드 트레이싱이 성능, 전력 소모, 크기 면에서 우수성을 검증하였으며 초실감 메타버스를 위한 실시간 3D 오디오를 실현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³IP(Intellectual Property):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 설계와 관련된 지적 재산을 의미.
⁴가속구조체(Accleration Structure (AS)): 3D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할하여 트리 형태로 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ray와 객체들 간의 교차점을 효율적으로 찾게 도와줌.
⁵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특정 응용프로그램이나 기능을 위해 맞춤 설계된 직접 회로 (반도체).
5 결론
메타버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자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각적인 요소는 사용자 경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사운드 렌더링은 이러한 몰입도를 높이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오디오 처리 방식들은 몰입도를 높이는 한계가 있지만 사운드 렌더링은 높은 몰입도와 현실감을 가진 오디오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해당 방식은 높은 계산 비용을 수반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친 레이 트레이싱 하드웨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고성능 사운드 트레이싱 하드웨어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 하드웨어는 기존 CPU 방식보다 평균 3.85배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주며, 성능, 전력 소모, 크기 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 특히, 사운드 트레이싱 ASIC의 성능은 FPGA보다 약 6.42배 높아, 초실감 메타버스 환경에서 실시간 오디오를 제공하는 데 충분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팀의 사운드 트레이싱 하드웨어는 초실감형 메타버스와 같은 고성능 오디오 처리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연구팀의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욱더 현실적이고 몰입감 있는 메타버스 환경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1] https://www.wepc.com/tips/apple-audio-ray-tracing-explained/
[2] https://about.fb.com/news/2023/09/meet-meta-quest-3-mixed-reality-headset/
[3] https://manual.yamaha.com/av/18/rxv685/en-US/448935819.html
[4] Carl F Eyring. 1930. Reverberation time in “dead” room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 2A (1930), 217–241.
[5] https://www.anandtech.com/show/16983/the-apple-a15-soc-performance-
review-faster-more-efficient/3
[6] Eunjae Kim, Sukwon Choi, Jiyoung Kim, Jae-ho Nah, Woonam Jung, Tae-hyeong Lee, Yeon-kug Moon, and Woo-chan Park, "An Architecture and Implementation of Real-Time Sound Propagation Hardware for Mobile Devices," SIGGRAPH ASIA, Accepted to appear.
[7] Eunjae Kim, Sukwon Choi, Cheong Ghil Kim, and Woo-Chan Park, "Multi-Threaded Sound Propagation Algorithm to Improve Performance on Mobile Devices," Sensors, Vol. 23, No. 2, p. 973. Jan 2023.
다음글
원전 해체 발생 방사성 폐액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 소재 공정 개발
이전글
3D 프린팅 잉크와 줄기세포를 활용한 인공 심장 개발의 현황 (The Frontier of Artificial Cardiac Development Using 3D Printing Ink and Stem Cells)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연구
주요연구
3D 프린팅 잉크와 줄기세포를 활용한 인공 심장 개발의 현황 (The Frontier of Artificial Cardiac Development Using 3D Printing Ink and Stem Cells)
2024-01-23
hit
1306
3D 프린팅 잉크와 줄기세포를 활용한 인공 심장 개발의 현황 (The Frontier of Artificial Cardiac Development Using 3D Printing Ink and Stem Cells)
바이오융합공학전공 이길용 교수
1. 서론 (introduction)
3D 프린팅 기술은 최근 제조업, 건축, 항공우주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그 영향력은 매우 두드러지며, 맞춤형 의료 솔루션의 개발, 질병 진단 및 치료 방법의 혁신, 그리고 인공 장기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공 장기 개발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 특히 바이오프린팅 기술은 신체 조직과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3D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도래 되는 인공장기 제작은 장기 기증과 관련된 제약을 극복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D바이오프린팅은 생체 호환성이 높은 재료로 만들어진 바이오잉크를 사용하여 세포, 단백질 및 기타 생물학적 요소들을 층층이 쌓아 올려 실제 인체 조직과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이오잉크의 선택입니다. 바이오잉크는 세포의 생존과 성장, 그리고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인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기계적 특성도 가져야 합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은 다양한 자연적 또는 합성 재료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잉크를 실험하고 있으며, 이 잉크들은 세포를 지지하고, 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하며, 적절한 세포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3D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 장기 개발은 단순히 바이오잉크를 선택하고 인쇄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기술은 세포 생물학, 재료 과학, 기계 공학,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통합된 결과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세포를 적절한 위치에 정밀하게 배치하고, 생체 구조와 기능을 반영하여야 하며, 복잡한 인체 조직의 3차원 구조를 성공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설계와 계획, 그리고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인공 장기가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생체 호환성, 장기 기능성, 안전성 등 여러 면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장기의 생존 기간, 기능 유지, 면역 반응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임상 적용을 위해서는 장기의 장기간 생존과 기능을 검증하는 임상 시험, 그리고 규제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3D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 장기 개발은 매우 복잡하고 다학제적인 분야이며, 아직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의료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연구의 진전과 함께, 이 기술은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고, 맞춤형 의료 솔루션의 발전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D 프린팅 잉크를 활용한 인공장기 개발에서 줄기세포와 바이오잉크의 중요성은 상당하며, 이 두 요소는 현대 조직 공학과 장기 재생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igure 1. 3D 조직 바이오 프린팅을 위한 일반 적인 과정. 단계1. 바이오 프린팅된 조직의 디자인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손상된 조직과 그 환경의 이미징. 단계2. 생체 모방, 조직 자체 조립 및 미니 조직 빌딩 블록을 단독 또는 다양한 조합을 통한 조직 디자인. 단계3,4. 조직의 형태와 기능에 필수적인 생체재료와 세포의 선택. 일반적으로 해당 재료에는 합성 또는 자연 폴리머와 탈세포화 세포외기질이 포함됨. 단계 5. 이러한 구성 요소는 잉크젯, 마이크로 압출 또는 광경화 보조 프린터와 같은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과 통합되어 프린팅. 단계 6. 일부 조직은 이식 전에 성숙 기간이 필요하며, 대안적으로 3D 조직은 신약개발 및 개인화약물을 개발을 위한 체외 진단을 응용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1).
2. 줄기세포 (Stem cells)
세포 기반 인공 심장 제작에서 줄기세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재생 의학 및 조직 공학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심장 세포 유형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심장 조직의 복잡한 구조를 재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환자의 체세포로부터 유도된 iPSCs는 환자 특유의 유전적 및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작된 인공 심장이 환자의 신체와 더 잘 호환될 가능성을 높이고, 이식 후 거부 반응과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는 자가 복구 및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인공 심장 내에서의 세포 손상이나 기능 손실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는 인공 심장의 수명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과 결합하여, 줄기세포는 정밀하게 설계된 심장 조직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줄기세포가 적절한 구조와 환경에 배치되어 자라나며, 최종적으로 기능하는 심장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줄기세포로부터 유도된 심장 세포는 질병 모델을 구축하고 신약의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심장 질환의 병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유도 만능성 줄기세포(iPSCs)의 사용은 윤리적 논란이 적고, 환자 자신의 세포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어, 심장 조직 공학에 있어 선호되는 세포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관점에서 동물 모델은 다양한 질병의 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든 안전성 및 효능 매개변수는 사람 대상 첫 임상 시험 시작 전에 동물에서 계속 테스트됩니다. 하지만, 연구 및 약물 개발에서 동물 모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의 생리 및 병리 생리학 사이의 불일치는 임상 연구에서 80% 이상의 약물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모델은 인간 체계에 존재하는 복잡성이나 병리학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는 임상 성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아 발달 중에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조직 형태 생성의 패턴과 시기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쥐와 인간 사이의 줄기 세포 표면 마커 집합체의 차이는 세포 조직의 운동성과 증식에서 주요 차이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인간 모델 사용이 인간의 장애 대한 분자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밝히고 대상 치료법 개발에 있어 더 신뢰성 있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기능성 줄기세포(pluripotent stem cells, PSCs), 예를 들어 인간 내세포질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s, ESCs)와 유도만능성 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iPSCs)의 발견은 인간 다양한 장기의 형성과 선천성 및 성숙한 심장 질환의 기반을 연구하는데 혁명적인 도구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iPSC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더욱 정확한 질병 모델링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iPSC에서 유래된 다양한 세포(iPSC-CMs)와 유전체 편집 접근법을 사용하여 다수의 단일유전질 및 복잡한 병리학이 체외 (in-vitro)에서 연구되어, 질병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부분의 iPSC에서 유래한 세포 유형, 예를 들어 iPSC에서 유래된 내피세포(iPSC-ECs), iPSC에서 유래된 심장 섬유아세포(iPSC-CFs), 그리고 iPSC에서 유래된 평활근세포(iPSC-SMCs)의 사용은 심장 모델의 세포 다양성을 크게 풍부하게 하며, 성인 심장과 같은 특성의 생리학적 성숙과 재현이 가능합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 기반 인공 심장 제작은 여전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이며, 이 기술이 임상에 적용되기까지는 여러 과학적, 기술적, 규제적 장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엄청나며, 향후 심장 질환 치료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Figure 2 다기능성 줄기세포 (IPSC) 심장 세포로 유도하기 위한 세포 분화 방식. 특정 세포 형태 발생 및 그 정체성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은 발달 경로 (세포 신호)에 표시하였음. 대부분의 경우, 모든 심장 세포 하위 유형은 줄기세포에서 발생하는 중배엽내피 조상 세포(KDR [kinase insert domain receptor] 및 MESP1 [mesodermal posterior 1])에서 기원함. 이후 Wnt 조절은 심근세포(CMs), 내피를 생성하는 데 이르게 하며, 특정 심실의 근육세포 유형은 골 형성 단백질(BMP)과 레티노산(RA) 매개 NOTCH 신호 활성화를 통해 얻어지며, 평활근 세포와 주위 세포는 측판 중배엽(LPM)과 축배엽(PM)에서 발달함. 심장의 섬유아세포는 심장 외피와 중배엽 조상 세포에서 유래하며, APS는 전방 원시 줄기를 나타내며; ESC는 배아줄기세포; ETV2는 ets 변형 전사 인자 2; FGF는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 IFN은 인터페론; IL은 인터류킨; SAN은 방실결절; TPO는 혈소판 생성 인자; VEGF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나타냄 (2).
3. 바이오 잉크 (Bio-ink)
줄기세포 기반 3D 바이오 잉크 개발은 현대의 조직 공학과 재생 의학에서 가장 앞선 연구 분야입니다. 이 기술은 인간 조직과 장기를 모방하고 재생하는 데 필수적인, 혁신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포 기반 인공 심장 제작을 위한 바이오잉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바이오잉크는 세포를 특정 위치에 정밀하게 배치하고, 심장 조직의 복잡한 3차원 구조를 형성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는 심장의 다양한 기능적 영역을 모방하는 복잡한 조직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공하는 생체 호환성 환경은 세포의 생존, 성장, 분화를 촉진하여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심장 세포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이는 인공 심장의 전반적인 기능성과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바이오잉크는 인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인공 심장이 실제 심장과 유사한 기계적 강도와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계적 속성을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심장의 전기적 특성과 혈류 동력학을 모방하는 생물학적 신호를 제공하는 데도 중요하며, 이러한 멀티셀룰러 (multi-cellular) 시스템의 구축은 심장의 복잡한 기능을 더 정확하게 모방하며, 질병 모델링 및 약물 반응 테스트에도 사용될 수 있어, 심장 질환의 병리학적 특징을 모방하고 신약의 효능과 독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잉크의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은 심장 조직 공학의 중심에 서 있으며, 생체 호환성, 기계적 특성, 세포 지지 능력 등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잉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발전은 심장 질환 치료와 재생 의학에 중요한 진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의 의료 혁신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바이오잉크는 또한 다양한 세포 유형과 조직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적 구성과 물리적 특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심장의 복잡한 생리학적 및 기능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심장 조직의 다양한 부분, 예를 들어 심근, 심장 판막, 관상 동맥 등은 서로 다른 기계적 강성과 생물학적 신호가 필요하며, 바이오잉크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바이오잉크의 발전은 또한 체외에서의 심장 조직 배양과 관련된 기술적 도전을 극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세포가 적절하게 분화하고 성숙하여 실제 심장 조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잉크 내에서의 적절한 세포 배치, 영양 공급, 산소 전달 및 폐기물 제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바이오잉크의 개발은 심장 조직 공학의 성공에 결정적입니다. 바이오잉크는 세포 기반 인공 심장 제작에 있어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그 기능과 발전은 심장 조직의 성공적인 재현과 임상적 적용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은 향후 인공 심장 제작의 효율성과 효과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4. 3D 프린팅 및 잉크 기반 심장 조직 개발 (세종대학교-하버드대학교 공동연구)
심장 조직 내의 세포 내부 및 세포 간 조직은 조정된 전기기계적 결합과 심장의 효율적인 근육 수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조직된 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세포 외 기질(ECM) 단백질은 세포에 대한 위상적 및 생화학적 신호로 작용하며, 이는 조직 발달에 중요합니다. 이는 특히 심장에서 중요한데, 여기서 심장 조직의 계층적 조직이 필요하여 여기서는 흥분-수축 결합의 시공간 역학을 조절하고, 이로 인해 심장 주기가 발생합니다. 심장의 구조-기능 관계를 체외에서 재현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을 나타냅니다. 이는 세포 규모와 거시적 장기 수준에서 조직 자체 조직화를 통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심장 세포 조직을 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자들은 마이크로 접촉 인쇄, 광리소그래피, 방향성 동결 건조, 섬유 스피닝 및 마이크로 생리학적 칩 제작을 통해 생체 고분자와 하이드로젤을 공학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복잡한 기하학을 가진 조직을 생산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심장 기능을 완전히 복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3차원(3D) 기하학을 모방하는 장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첨가제 제조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3D 프린팅은 조직 모델을 공학하기 위해 점점 더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인쇄 전에 3D 구조를 쉽게 디자인하고 편집할 수 있게 하고, 유연한 바이오 재료 잉크의 조성으로 복잡한 3D 구조를 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위해, 하이드로젤 기반 잉크나 인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복합 노즐 시스템을 사용한 다재료 잉크 인쇄, 광경화성 하이드로젤 인쇄, 점증제 추가 또는 희생지지재료 인쇄 등 3D 안정성과 형태 충실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조직 자체 조직화와 정렬에 대한 제한된 통제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마이크로미터와 나노미터 규모에서 센티미터 규모로의 규모를 연결하여 공학적 심장 모델 내부의 세포 내부 및 세포 간 조직화를 유도하는 것은 기능성 장기 및 조직의 3D 프린팅에서 주요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세종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사전 제작된 미세 규모 섬유를 포함하는 3D 지지체를 인쇄하는 것이 심근세포가 심장 방을 형성하기 위해 자체 조직화할 수 있는 자기 지지형 지지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심장의 세포 외 기질(ECM) 네트워크에서 영감을 받아, 젤라틴 섬유를 젤라틴과 알지네이트(Gel-Alg) 하이드로젤 매트릭스에 주입하여 우리의 잉크를 설계했습니다 (그림 3).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와 탄소 나노튜브와 같이 이전에 잉크에서 사용된 것과는 달리, 세포외기질 중 하나인 피브로넥틴(Fibronection)이 코팅된 젤라틴 섬유는 매트릭스-세포 부착을 촉진하는 아르기닌-글리신-아스파트산(RGD) 펩타이드 결합 도메인을 포함합니다. 또한, 나노 미세 섬유를 하이드로젤에 포함함으로써 잉크의 유변학적 성질을 변경하여, 지지 구조나 재료 없이도 정확하고 복잡한 3D 지지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진은 위상적 및 화학적 신호를 정렬된 젤라틴 미세섬유의 형태로 통합함으로써, 이런 방식으로 인쇄된 3D 심실 지지체가 심근세포의 이방성 근육 조직으로의 자체 조직화를 촉진할 것 하였습니다 (그림3).
Figure 3. 3D 프린트 된 조직 지지체에 대한 바이오 잉크. (a) 나노 섬유가 포함된 잉크 구성 요소 제작 방법. 파편화된 젤라틴 나노 섬유가 젤라틴-알지네이트 하이드로젤과 결합될 때 (빨강색은 세포외기질), 잉크 점도가 증가하며 고체 같은 행동을 나타내어, 계층적 구조를 가진 심실 지지체의 3D 프린팅을 가능함. (b) 3D 프린팅 도중에 나노 섬유 정렬은 3D 지지체에서 실제 ECM과 유사한 이방성 구조적 특징을 유도하여, 체내 심장 근육을 재현하기 위한 조직 정렬 및 조직화를 촉진. (c) 젤라틴 나노 섬유를 보여주는 주사 전자 현미경 이미지. 100 μm. (d) 바이오잉크에 나노 섬유가 포함되었을 떄 물성 비교. 나노 섬유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프린팅이 불가능 한 낮은 점도의 액체 같은 행동을 나타냄. (e) 바이오 잉크의 물성 테스트, 농도 의존적이고 변형 의존적인 전단 액화 행동 및 솔-젤 전환을 나타냄. (f) 3D 도넛 형태의 프린팅 테스트5 mm. (g) 3D 프린팅을 통한 심장의 왼쪽 심실의 원추형 모델. 2 mm. (h) 3D 프린팅을 통한 주변 방향으로 인쇄된 자기 지지식 이중 심실 챔버와 심장 판막 및 대각선 (30°) 으로 기울어진 왼쪽 심실. (i) 3d프린트된 심실 지지체의 마이크로 컴퓨터 단층촬영 이미지로, 3D 프린트된 형상에서의 섬유 구조를 나타냄, 1 mm. (j) 3D 프린트된 심실 지지체의 주사 전자 현미경 이미지로 인쇄 방향의 섬유 정렬을 나타냄, 200 μm. k, 5 와 8 wt% 나노 섬유를 가진 3D 프린트된 심실 지지체의 공초점 이미지에서 섬유 정렬 분석, 그리고 해당 섬유 방향 각도 분포 그래프; 0°는 인쇄 방향(dir.)을 나타냄, 100 μm. (3)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3D 프린팅 잉크를 활용한 줄기세포 기반 인공 심장 개발은 의학과 생명 공학의 중요한 전진 영역이며, 연구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집중을 요구 합니다. 첫째, 바이오잉크의 고도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심장 조직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더욱 정확하게 모방하기 위해, 바이오잉크의 생체 호환성, 기계적 특성, 생물학적 기능을 개선하는 연구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재료 과학, 생화학, 세포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새로운 소재와 기술을 탐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 세포 분화 및 조직화 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줄기세포가 특정 심장 세포 유형으로 효과적으로 분화하고 적절하게 조직화되어 실제 심장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포 생물학, 생체 공학, 조직 공학의 교차점에 있으며, 여러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실험 설계와 분석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셋째, 인공 심장의 통합 및 시스템화에 대한 연구가 중요합니다. 심장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모방하고 실제 생리적 조건에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세포 유형, 신호 전달 경로, 그리고 기계적 구조를 포함하는 완전한 인공 심장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인공 심장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상적 적용 전에 필수적인 단계로, 잠재적인 부작용, 거부 반응, 장기간 기능 유지 등을 포함합니다. 임상 연구, 생물 통계학, 의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섯째, 줄기세포 기반 인공 심장 개발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규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학제간 협력과 깊은 윤리적 고민을 요구하는 분야로, 사회적,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화된 치료법으로의 확장에 대한 연구를 강조해야 합니다. 각 환자의 유전적 및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심장 질환의 특성에 더 잘 맞는 맞춤형 인공 심장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밀 의료의 전망을 향상시키고, 환자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방향들은 줄기세포 기반 인공 심장 개발의 효과적인 진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여러분의 지식, 기술, 창의력을 발휘하여 심장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혁명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은 해당 연구와 혁신이 이 분야에서 집중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중요한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1. S. V. Murphy, A. Atala, 3D bioprinting of tissues and organs. Nat Biotechnol 32, 773-785 (2014).
2. D. Thomas, S. Choi, C. Alamana, K. K. Parker, J. C. Wu, Cellular and Engineered Organoids for Cardiovascular Models. Circ Res 130, 1780-1802 (2022).
3. S. Choi et al., Fibre-infused gel scaffolds guide cardiomyocyte alignment in 3D-printed ventricles. Nature Materials, (2023).
4. K. Y. Lee et al., An autonomously swimming biohybrid fish designed with human cardiac biophysics. Science 375, 639-647 (2022).
5. H. Chang et al., Recreating the hearts helical structure-function relationship with focused rotary jet spinning. Science 377, 180-185 (2022).
6. A. Lee et al., 3D bioprinting of collagen to rebuild components of the human heart. Science 365, 482-487 (2019).
7. S. J. Park et al., Insights Into the Pathogenesis of Catecholaminergic Poly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 From Engineered Human Heart Tissue. Circulation 140, 390-404 (2019).
다음글
초실감 메타버스를 위한 궁극의 3D 오디오 기술: 사운드 트레이싱 (Sound tracing)
이전글
장주기 쌍성에서 발견된 뉴턴-아인슈타인 표준중력의 붕괴: 천체물리와 우주론에서의 과학혁명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연구
주요연구
장주기 쌍성에서 발견된 뉴턴-아인슈타인 표준중력의 붕괴: 천체물리와 우주론에서의 과학혁명
2024-04-05
hit
1297
장주기 쌍성에서 발견된 뉴턴-아인슈타인 표준중력의 붕괴:
천체물리와 우주론에서의 과학혁명
물리천문학과 채규현 교수
1. 서론 및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지금까지 관측되어온 우주는 중력 시스템들의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는 지구 자체 중력에 의하여 유지되며, 달은 지구와의 상호 중력에 의하여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행성 및 그 외 태양계 천체는 태양 중력의 지배적 영향 하에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 태양 및 수천억 개의 별들은 우리은하의 모든 구성 요소들의 총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각자 자신의 궤도를 따라서 공전한다. 우리은하와 그 외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들은 광활한 우주 속에 존재한다. 일부 은하들은 은하군 또는 은하단 속에서 중력적으로 서로 상호 작용한다. 우주의 팽창 동역학(expansion dynamics) 또한 중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중력의 성질은 태양계 내 행성 운동들의 경험적 수학 법칙을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행성 운동들의 실증적 수학 법칙은 요하네스 케플러가 티코 브라헤(Tyco Brahe)가 평생을 바쳐 축척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1609-1619년 기간 동안 발견하였다. 케플러의 법칙은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이 법칙은 매우 간단한데, 임의의 두 질량 요소가 두 요소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뉴턴의 중력은 지구와 태양계, 심지어 우주 전체의 모든 중력 역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에는 은하들과 우주 팽창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강한 중력에서의 중력 변칙: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도래
19세기에 위르뱅 르 베리에(Urbain Le Verrier) 및 여러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움직임을 연구하였다. 1859년 르 베리에는 태양 주변을 도는 수성 궤도의 세차(precession) 운동이 뉴턴의 태양 중력과 알려진 행성들에 의하여 가해지는 섭동(perturbations)들에 의하여 완벽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중력 변칙은 (천왕성 궤도의 변칙은 해왕성 발견에 의하여 설명됨) 실제였으며 상대적으로 강한 중력에서 뉴턴의 중력이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중력 변칙은 결국 아인슈타인의 새 중력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졌고, 이는 아인슈타인의 역학 및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인 특수 상대성 이론과 모순이 없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5년에 완성되었으며 그 이후로 중력에 대한 표준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가속도가 약할 때, 즉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느린 비상대론적 한계에서 뉴턴의 중력 법칙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우주의 비상대론적 중력 역학에 관한 한 뉴턴의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동일한 예측을 한다. 이와 같이 비상대론 영역에서 뉴턴-아인슈타인 표준 중력은 행성 운동, 은하계, 그리고 은하단들의 역학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시공간 구조와 역학 그리고 블랙홀 및 중력파와 같은 현상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약한 중력에서의 중력 변칙: 암흑 물질 또는 MOND?
1933년 프리츠 츠비키(Fritz Zwicky)는 코마(머리털 자리) 은하단은 뉴턴-아인슈타인 표준 중력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은하들의 궤도 운동이 너무나 빨랐기 때문이다. 그는 표준 중력이 은하들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은하단의 변칙적인 중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암흑 물질을 뜻하는 독일 단어인 ‘dunkle Materie”를 처음으로 상정하였다.
1970년대에 베라 루빈(Vera Rubin)과 알베르트 보스마(Albert Bosma)를 포함한 천문학자들은 은하 중심으로부터 큰 반경까지의 은하 회전 곡선(galactic rotation curves )을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은하 회전 곡선은 약한 중력 또는 낮은 가속도에서 가장 명확하고 특이한 중력 변칙을 보였다 (그림 1). 중력 가속도가 제곱 초당 약 1nm(나노미터)보다 높을 경우 실질적인 중력 변칙은 없었다. 중력 변칙은 제곱 초당 약 1nm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반경이 커지면서 증가하다 거의 평평한 회전 곡선이 된다.
그림 1. 안드로메다 은하(M31)의 관찰된 회전 곡선은 은하의 바깥 부분에서의 명확한 중력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뉴턴의 예측한 곡선이 은하 바깥 부분에서 감소하는 동안 관찰된 회전 곡선은 거의 평평하다. (온라인에서 이미지 발췌)
제곱 초당 1nm보다 약한 중력은 표준 중력이 검증된 내부 태양계의 중력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 하지만, 약한 중력에서 표준 중력이 유지된다는 추정을 통해 눈에 보이는 은하들을 둘러싸는 암흑 물질 헤일로가 제시되었다. 암흑 물질 헤일로는 과학자들로부터 곧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는 두 명의 위대한 권위자들의 이론들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저가속 변칙(low-acceleration anomaly)을 제외하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태양계 내의 실험(solar system tests), 중력파 검출, 그리고 중성자 별과 블랙홀 관측을 통해 성공적으로 검증되었다. 일반 상대성이론에 기초한 표준 우주론은 암흑 물질을 가정하고 발전되었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CMB) 온도 비등방성과 관측된 은하 분포를 통해 밝혀진 우주의 거대 구조를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우주의 암흑물질의 양은 은하와 은하단을 담고 있는 암흑물질 헤일로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준 우주론은 최근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우주에서 측정된 허블 상수와 플랑크 위성이 관측한 CMB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반 상대성이론이 예측한 상수 간의 불일치,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견한 초기 시대의 은하들이 너무 거대하다는 것이다.
암흑 물질은 전자기 방출 또는 흡수를 통해 관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은 물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많은 먼지가 포함되어 빛을 흡수하여 검게 보이는 암흑 성운(dark nebulae)은 암흑 물질이 아니라 일반 중입자이다. 이론적으로 암흑 물질에 대한 후보 입자들은 충분히 제시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약한 상호 작용하는 무거운 입자(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s, WIMPs)들은 선호되는 후보들이었지만 현재 전세계에서 진행된 직접 탐사 실험을 통해 대부분 배제되었다. 초대칭 입자(Supersymmetric particles, SUSY)도 유망한 후보로 간주되었지만, 힉스 입자 발견 이후 CERN 실험을 통해 대부분 배제되었다. 물론 액시온, 미니 블랙홀, 초경량 보존 등 수많은 이론적 후보가 남아 있으며 암흑물질 탐색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암흑물질은 많은 과학자들이 선호하는 중력 변칙에 대한 해결책이지만, 뉴턴-아인슈타인 표준 중력이 낮은 가속도 한계에서 실험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때로 일부 과학자들은 중력렌즈와 같은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 암흑물질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암흑물질은 표준중력을 가정하여 추론되었기 때문에 순환 논법일 수밖에 없고, 암흑물질이 적정량 검출되는 경우에만 낮은 가속도 한계에서도 표준중력이 유효할 것이다.
실제로 모든 과학자들이 암흑 물질이 해결책이라는 것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다. 이미 1983년에 모르데하이 밀그롬(Mordehai Milgrom)은 은하의 특징적인 회전 곡선이 저가속 현상에서 뉴턴의 중력 역학(따라서 일반 상대성 이론도 포함)의 붕괴를 암시한다고 제시했다. 수정 뉴턴 역학(Newtonian dynamics, MOND)이라고 불리는 밀그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표준 중력이 제곱 초당 약 0.1nm(나노미터)인 가속 상수 a_0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약할 때 붕괴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밀그롬은 중력 이론에 새로운 상수를 도입하였다. 수정 뉴턴 역학에서 중력은 자유 낙하하는 중력 시스템의 내부 역학이 주변 시스템의 중력장이 일정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외부 중력장 효과(external field effect)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정 뉴턴 역학의 중력은 중력 역학이 주변 우주의 영향을 받는 다는 마하의 원리(Mach’s principle)를 따른다.
수정 뉴턴 역학은 암흑 물질을 포함시키지 않고도 은하의 관측된 회전 곡선을 설명할 수 있다. 수정 뉴턴 역학이 예측한 케플러 유사 법칙들을 중입자 툴리-피셔 관계, 지름 가속도 관계와 같은 은하 운동학에서 괸측 되었다. 또한, 최근 은하 회전 곡선의 바깥 부분 내에서 외부 중력장 효과(External field effect)가 포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찰들은 암흑 물질 지지자들로부터 저항받고 있는데, 이는 암흑 물질 헤일로가 수정 뉴턴 역학의 예측을 일정 수준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래에 정확한 고정밀 관측이 이뤄진다면 수정 뉴턴 역학과 암흑 물질 헤일로는 결국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4. 장주기 쌍성: 저가속에서 중력을 직접 검증하기 위한 자연 실험실
암흑 물질과 수정 뉴턴 역학을 구분하기 위해 은하를 사용하는 경우, 은하의 외부 부분이 엄청난 공간이기 때문이에 이 두 패러다임들의 중복되는 예측 내용들을 구별해야 한다. 2012년 자비에 헤르난데즈(Xavier Hernandez)와 그의 동료들은 낮은 가속도에서 중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장주기 쌍성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장주기 쌍성은 서로의 상호 중력에 따라 장기간 궤도에 따라 서로를 도는 중력적으로 결합된 쌍성을 의미한다. 전체 질량이 약 1 태양 질량인 일반적인 쌍성의 경우, 간격(또는 궤도 크기)가 수 킬로 천문 단위(kau)일 때 상호 중력은 밀그롬 상수의 약한 가속도에 도달한다. 표준 중력에 의해 예측되는 궤도에 둘러싸인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에 포함된 암흑 물질은 무시해도 될 정도이다. 그러므로 암흑 물질과 수정 뉴턴 역학의 영향을 구별할 필요 없이 중력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다.
유럽항공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의 가이아(Gaia) 우주 망원경은 우리은하에 있는 20억 개의 물체(주로 별)의 3D 지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별의 움직임을 추적해오고 있다. 가이아는 2016년부터 데이터를 공개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것은 데이터 릴리스 3(DR3)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세종대학교 채규현 교수는 중력에 민감한 세 가지 매개변수들을 고려하여 쌍성을 이용해 중력을 시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매개변수들은 하늘 평면에 투사된 관측된 2D 속도, 뉴턴 원형 속도로 정규화된 2D 속도, 그리고 관측된 2D 속도와 2D 간격을 몬테 카를로 방법에 의해서 삼차원의 실제 공간으로 역투영하여 통계적으로 재구성한 운동학적 가속도이다.
가이아의 쌍성에 대한 데이터의 질적 수준은 다양하다. 또한, 일부 쌍성들은 쌍성 중 하나 또는 둘 모두 주변에 위치한 관측되지 않은 별들이 있어 이들 주변에 맴돌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숨겨진 구성 요소가 있는 쌍성들을 다중 별 또는 계층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채 교수는 가장 높은 데이터 품질적 수준을 갖춘 순수한 쌍성 샘플로부터 계층 시스템이 포함된 좀 더 완화된 품질의 데이터가 포함된 10배 이상 더 큰 샘플까지 고려하였다. 계층 시스템이 포함된 샘플의 경우, 채 교수는 표준 중력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1 kau 이하의 간격을 가진 쌍성들을 이용하여 계층 시스템의 발생률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간격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쌍성이 선택되었고, 확인된 계층 시스템들은 이미 제거하였기 때문에 유효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숨겨진 동반자(companion)가 있을 확률은 간격과는 무관한데, 샘플 수집 기준에 의해서 이들의 측광학적, 측성학적 그리고 운동학적 특성들이 통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5. 결과
그림 2에서 엄격한 데이터 질적 요건에 따라 선택된 2463개의 순수 쌍성 샘플들에 대한 중력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곱 초당 약 1 nm보다 높은 가속도 또는 약 2 kau보다 작은 간격에서 관찰된 가속도 또는 속도는 뉴턴의 예측과 일치한다. 이는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인데 관측된 값들에 대한 그 어떠한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턴 역학은 제곱 초당 nm의 가속도 단위까지 관측된 양에 의해 자연스럽게 뒷받침된다.
그러나 제곱 초당 1 nm 또는 2 kau에서 관측된 가속도/속도는 뉴턴의 예측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약 5 kau보다 큰 간격의 경우 속도와 가속도가 약 20% 및 40-50%으로 각각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더 큰 간격들을 가진 쌍성들은 동일한 데이터 품질을 충족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증가치는 실제 중력 변칙을 나타낸다. 놀라운 점은 변칙적 행동의 정도와 특성이 제이콥 베켄스타인(Jacob Bekenstein)과 밀그롬(Milgrom)의 AQUAL 모델로 대표되는 수정 뉴턴 역학의 중력이 은하수의 외부 중력장 효과(external field effect)하에서의 일반적 예측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림 2. 통계적으로 숨겨진 추가 구성요소가 없는 2463개의 순수 쌍성들에 대한 중력 테스트 결과. 중력에 민감한 세 가지 매개변수들, 즉 몬테 카를로 재구성 운동 가속도, 관측된 하늘 평면 투영 상대 속도, 뉴턴 원형 속도로 정규화된 속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됨. 세 가지 경우 모두 관측된 값들은 해당 뉴턴 예측과 비교되었다. 낮은 가속도 및 더 큰 간격에서 중력 변칙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림 3은 계층 (고차 다중) 시스템들을 포함한 두 개의 일반 샘플들에 대한 가속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계층 시스템들 비율의 보정값이 표시되었다. 순수 쌍성 샘플들에 나타난 변칙 현상과 동일하게 관측된 중력은 제곱 초당 1nm에서 뉴턴의 예측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이상의 정도와 추세는 수정 뉴턴 역학의 중력 예측과 일치한다.
그림 3. 계층(다중 별) 시스템을 포함한 두 개의 일반 장주기 쌍성 샘플에 대해 몬테 카를로 재구성 운동 가속도를 사용한 중력 테스트 결과. 분해되지 않은 계층 시스템의 비율은 뉴턴 영역 내 높은 가속도에서 보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순수 쌍성 샘플의 테스트 결과와 일치하지만 표본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림 4는 두 개의 일반 샘플에 대해서 관측된 정규화된 속도를 정규화된 간격에 대한 관계로 나타낸다. 여기서 정규화된 간격 값 1은 가속도 값이 Milgrom 가속도와 같아짐을 나타낸다. 정규화된 간격의 값이 충분히 작을 시, 관측된 정규화된 속도는 뉴턴의 예측과 일치한다. 그러나 정규화된 속도는 정규화된 간격이 약 1에 도달할 때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한 다음, 두 샘플 모두에서 수정 뉴턴 역학의 중력 예측과 마찬가지로 평평해진다.
그림 4. 그림 3과 유사하지만 정규화된 속도가 사용된다. 뉴턴식 예측은 명확하게 배제되며, 밀그롬의 AQUAL 예측은 Gaia 데이터와 일치한다.
6. 시사점: 천체 물리학 및 우주론의 혁명
현재 은하와 은하단에서 발생하는 중력 변칙을 설명하는데 있어 암흑물질이 수정뉴턴역학과 경쟁하는데 이는 우주론적으로 추정되는 암흑물질 밀도가 적정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쟁은 장주기 쌍성에서 관측된 중력 변칙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중력 변칙은 표준 중력이 약한 가속도에서 붕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의미한다. 이는 암흑 물질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별개로 발생하는 것이다.
장주기 쌍성의 중력 변칙이 은하 회전 곡선에서와 동일한 가속도에서 관측된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 은하 회전 곡선에서의 변칙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되기 시작한 암흑 물질은 장주기 쌍성의 변칙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암흑 물질 패러다임 자체는 임기 웅변적 가정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집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암흑물질 입자의 탐지나 식별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물일 수 있다.
AQUAL 및 QUMOND와 같은 수정 뉴턴 역학 중력 모델은 은하와 장주기 쌍성 내 중력 변칙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외부 중력장 효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은하와 장주기 쌍성의 변칙의 엄청난 크기 차이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수정 뉴턴 역학의 기본 원리인 표준 중력이 수정 뉴턴 역학의 가속도 상수를 통해 붕괴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수정 뉴턴 역학이 비표준(또는 수정) 중력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한다.
수정 뉴턴 역학이 천체 물리학과 우주론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영향에 못지 않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과 시공간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블랙홀 및 중력파와 같은 상대론적 현상으로 확장한 반면, 행성계, 항성계, 은하, 은하단과 같은 비상대론적 현상에서는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비상대론적 현상은 밀그롬 상수에 의해 설정된 수정 뉴턴 역학 영역에 도달할 때마다 밀그롬의 원리를 따르게 되고, 선형성과 중첩 원리를 잃게 되며, 외부 중력장 효과를 갖게 된다. 장주기 쌍성에서 볼 수 있듯이 밀그로미안 현상은 항성계, 은하계, 우주 자체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중력 역학은 가장 강한 중력부터 가장 약한 중력에 이르기까지 마하의 원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강한 중력 영역에서 마하의 중력 성질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비선형 이론으로 대표되며, 약한 중력 영역에서는 밀그롬의 이론으로 대표된다. 태양계 안쪽에서와 같이 “정상 중력”이라는 최적 지점에서만 뉴턴의 이론과 선형성이 유지되며 중력 역학은 마하의 원리를 망각하게 된다.
7. 향후 연구 및 전망
현재 밀그롬 중력에 대한 증거는 가이아 DR3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이아는 2026년 초에 DR4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아 DR4는 측성학적, 측광학적, 그리고 시선속도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 목록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장주기 쌍성 중력 테스트 결과의 통계값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장비를 통해서 잘 선별된 장주기 쌍성의 시선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하늘의 2D 속도보다 더 직접적인 중력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3D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스펙클 측광(speckle photometry)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현재까지 측광학적으로 분해 안 된 별들에 숨겨져 있는 추가별을 찾아내어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밀그롬 중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이미 얻어졌으므로, 수정 뉴턴 역학 패러다임의 이론적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수정 뉴턴 역학에 기반한 우주론은 로버트 샌더스(Robert Sanders)의 선구적인 연구를 따라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넘어서는 상대론적 이론들의 이론적 발전과 함께 올바른 수정 뉴턴 역학 현상학에 근거하여 이뤄져야 한다. 근본적인 기본 이론에 대한 탐구는 상대론 영역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매우 약한 가속도에서의 수정 뉴턴 역학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 이론은 중력의 양자물리학을 성공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1. F. Zwicky 1933 Helvetica Physica Acta (in German) 6 110–127 "Die Rotverschiebung von extragalaktischen Nebeln" [The red shift of extragalactic nebulae]
2. V. Rubin, W. K. Jr. Ford 1970 Astrophysical Journal 159 379 "Rotation of the Andromeda Nebula from a Spectroscopic Survey of Emission Regions"
3. A. Bosma 1978 Ph.D. thesis “The Distribution and Kinematics of Neutral Hydrogen in Spiral Galaxies of Various Morphological Types” (Rijksuniversiteit Groningen)
4. M. Milgrom 1983 Astrophysical Journal 270 365 "A modification of the Newtonian dynamics as a possible alternative to the hidden mass hypothesis”
5. S. S. McGaugh, J. M. Schombert, G. D. Bothun, and W. J. G. de Blok 2000 Astrophysical Journal 533 L99 “The Baryonic Tully-Fisher Relation”
6. Stacy S. McGaugh, Federico Lelli, and James M. Schombert 2016 Phys. Rev. Lett. 117, 201101 “Radial Acceleration Relation in Rotationally Supported Galaxies”
7. Kyu-Hyun Chae, Federico Lelli, Harry Desmond, Stacy S. McGaugh, Pengfei Li, and James M. Schombert 2020 Astrophysical Journal 904 51 “Testing the Strong Equivalence Principle: Detection of the External Field Effect in Rotationally Supported Galaxies”
8. Kyu-Hyun Chae 2022 Astrophysical Journal 941 55 “Distinguishing Dark Matter, Modified Gravity, and Modified Inertia with the Inner and Outer Parts of Galactic Rotation Curves”
9. X. Hernandez, M. A. Jiménez, C. Allen 2012 The European Physical Journal C 72 1884 “Wide binaries as a critical test of classical gravity”
10. Kyu-Hyun Chae 2023 Astrophysical Journal 952 128 “Breakdown of the Newton–Einstein Standard Gravity at Low Acceleration in Internal Dynamics of Wide Binary Stars”
11. Kyu-Hyun Chae 2024 Astrophysical Journal 960 114 “Robust Evidence for the Breakdown of Standard Gravity at Low Acceleration from Statistically Pure Binaries Free of Hidden Companions”
12. Kyu-Hyun Chae 2024 Astrophysical Journal (submitted; preprint arXiv:2402.05720)
13. J. Bekenstein, M. Milgrom 1984 Astrophysical Journal 286 7 "Does the missing mass problem signal the breakdown of Newtonian gravity?”
14. M. Milgrom 1983 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 403 886 "Quasi-linear formulation of MOND”
15. R. H. Sanders 1998 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 296 1009 "Cosmology with modified Newtonian dynamics (MOND)”
다음글
3D 프린팅 잉크와 줄기세포를 활용한 인공 심장 개발의 현황 (The Frontier of Artificial Cardiac Development Using 3D Printing Ink and Stem Cells)
이전글
고효율 전력변환을 위한 전력반도체 기술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연구
주요연구
고효율 전력변환을 위한 전력반도체 기술
2024-08-16
hit
663
고효율 전력변환을 위한 전력반도체 기술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임유승
1. 서론
전력변환(Power conversion)이란 용어가 낮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전력변환 기술을 통해 모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가 에너지라고 일컫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모든 가정에 공급이 된다. 우리가 쓰고 있는 220V 교류(AC)전압은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전달될까?
그림 1. 가정에 공급되는 전압과 전력반도체의 역할 [1]
생산된 전기는 도심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승압이란 과정을 거쳐서 매우 높은 전압을 변환된다. 전압을 크게 바꾸기 위해서는 교류를 이용한 경우 쉽게 가능하고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먼 거리를 가능케 한다. 현재 154kV에서 765kV까지 승압을 통해 전달하고 가정에는 배전이란 과정을 거쳐 교류 220V를 공급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정에 220V 교류가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쉽게 다가온다.
그런데 전력변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직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직류는 시간에 따라 전압이 변하지 않는 에너지로 노트북, TV,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모든 전자기기까지 직류를 사용하고, 각각의 기기가 요구하는 전력량에 따라 다른 전압을 채택한다. 즉, 220V 교류전압을 5V, 10V, 15V 등의 직류전압으로 바꿔줘야 한다. 여기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댑터(Adapter)를 떠올릴 수 있다. 즉, 어댑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주고, 원하는 전압으로 낮춰주거나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는 반도체의 정류작용(Rectification)이 활용된다. 즉,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특징을 활용해, 양과 음 전압으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교류를 한쪽 방향을 걸러 직류로 만들어 주는 기술이 적용된다. 반대로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 줄 때는 펄스 폭 변조(Pulse Width Modulation, PWM)를 이용해 교류형태로 만들어 주는 기술을 활용한다. 여기에도 당연히 반도체가 활용된다. 그림 2는 전력변환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나타낸다. 순서대로 교류를 직류로 변환, 교류의 주파수변환, 직류 전압의 변경, 직류를 교류로 변환을 나타내며 응용 환경에 따라 사용처가 모두 다르다.
그림 2. 전력변환 종류 [1]
전력변환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도대체 왜 고에너지갭이란 반도체 소재가 필요하며, 고효율이 왜 요구되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 높은 전압을 견딘다는 의미
반도체는 밴드갭이란 고유 특성을 갖고 있고, 반도체에 전압을 가할 시 특정 전압 이상에서 항복현상(breakdown)이 발생해 급격히 전류가 증가해 반도체를 제어할 수 없게 되고 열화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항복현상은 반도체의 밴드갭 크기에 의존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Si은 1.1eV의 밴드갭을 갖는다. 이를 항복전계(Breakdown Electrical Field)로 변환하면 0.3MV/cm 값을 갖는다. 즉, Si 자체의 항복전압의 임계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복전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저항성을 키워야 한다. 저항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불순물 농도(impurity concentraion)를 낮추어 저항을 크게 가져가는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반도체는 불순물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전류를 매우 잘 흐르게 할 수도, 매우 적게 흐르게 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반도체 특성을 보이는 최적의 디바이스 특성에 저항을 키우기 위한 적은 양의 불순물 농도를 갖는 층을 첨가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저항이 높은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저항이 높은 영역의 폭이 넓을수록 전류가 흐르기 더욱 어렵게 되고 견딜 수 있는 항복전압도 키울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반도체는 전자(Electron)와 정공(Hole)의 각각의 양에 따라 n타입 및 p타입으로 만들 수 있다. 즉, 전자가 많은 상태의 반도체를 n타입, 정공이 많은 상태의 반도체를 p타입으로 일컫는다. 두 반도체가 서로 접합(Junction)을 이룰 때, 우리는 다이오드(Diode)라고 부르며, 이 다이오드가 바로 정류작용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가 된다. 이런 반대 극성(Polarity)를 갖는 성분을 이러한 항복전압을 높이기 위한 층으로 활용함으로써도 항복전압을 높일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같은 극성을 갖는 반도체 내 불순물농도가 다른 층을 삽입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극성을 갖는 층을 삽입하여 두 극성이 만나는 접합면에 공핍층(Depletion layer)이란 층을 형성하여 저항을 키우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반도체의 항복전압을 높임으로서 응용분야에 맞는 소자 설계를 가능케 한다.
3. 높은 전압 구현의 필요성, Si의 한계 그리고 산업
앞서서 전압의 종류와 변환 그리고 사용분야에 대해 알아 보았다면, 좀 더 전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압(Voltage)란 전위차(Electric Potential Difference)라고도 불리며, 전기장(Electric Field) 안에서 전하가 갖는 전위(Electric Potential)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어느 구간 사이에 서로 간의 위치에너지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전압이 크다는 것은 전하들이 더욱 큰 힘을 갖고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시간 당 이동하는 전하의 양이 많다는 뜻을 갖는다. 전압을 얘기할 때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전력(Electric Power, P)이다. 전력은 전기에너지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단위 시간당 전달되거나 변환된 전기에너지에 의해 수행된 일의 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전력(P)는 전압(V)와 전류(I)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같은 전력량을 나타내는 A, B 사례에서 A는 B보다 높은 전압을 가지면 상대적으로 적은 전류량을 나타낼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 전류가 크면 많은 전자들이 동시간에 흐르게 된다. 이는 내부에 진동 및 충돌을 유발하고 점진적으로 열을 발생시킨다. 열은 곧 손실(Loss)로서 나타나게 된다. 즉, 같은 전력량을 가질 때 높은 전압과 낮은 전류는 손실 측면 및 설계관점에서 보다 유리해 진다.
그러면, 전압을 높이는 것이 항상 옳은 판단인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전압을 높인 다는 것은 결국 반도체의 항복전압을 높여 개방(Open) 상태를 만들어 줘야하는데 항복전압을 높이기 위한 저항층의 두께 증가는 결국 반도체 전체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증가된 저항에 의해 전류를 흘려야하는 상태에서 높은 저항성분으로 인해 손실이 그 만큼 발생한다. 즉, 항복전압과 저항은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여기서는 소재의 한계 극복에 국한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3. (좌)물질에 따른 밴드갭 및 항복전계 특성. (우)항복전압 설계에 따른 요구 온저항 특성
그림 3의 좌측 그래프는 물질에 따른 밴드갭 값 및 변환된 항복전계 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Si의 밴드갭은 1.1eV이고 여기 표시된 각각의 소재들은 다른 밴드갭을 나타낸다. 이 중, 가장 널리 Si를 대체할 소재로서 연구되고 제품화된 소재는 4H-SiC(3.3eV) 및 GaN(3.4eV)이다. 각각 밴드갭이 Si 대비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소재 자체의 항복전압 특성이 우수하여 저항 설계에 이점을 갖는다. 이에 대해 그림3 우측에 반도체소자가 동작할 때의 저항값과 설계한 항복전압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에 주목해보자. 가령 1000V의 전압을 견디는 반도체를 제작했다고 가정하면, Si을 사용할 경우 앞서 언급한 저항층의 두께와 저항도를 고려할 때 100mΩ⦁cm2 이상의 저항값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반면, 4H-SiC 소재를 이용할 경우 0.5mΩ⦁cm2 수준으로 200배 가까이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갖는 넓은 밴드갭을 갖는 소재들을 기반한 전력반도체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다. SiC, GaN 이외에도 Ga2O3, AlN, Diamond에 이르는 울트라와이드 밴드갭을 갖는 소재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압이 우리 일상에서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이러한 고전압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가져와 봤다.
그림 4. (좌)전기자동차 배러티 충전 및 사용장치 별 전력변환. (우)전압에 따른 자동차 충전 시간
그림4의 왼쪽 그림은 전기자동차 전력변환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전력의 변환이 전체 시스템에 적용된 사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현재 400V 및 800V 전압을 사용하는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용량은 60kWh에서 현재 80kWh 이상으로 증가돼 왔다. 즉, 800V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직류는 오디오, 계기판 등 전자장치에 사용되는 전압(12 또는 24V)로 변환시켜줘야 하며, 모터 구동에 있어서는 교류로 바꿔줘야 한다. 또한, 높은 전압을 차용한 충전에서는 더욱 차별화가 나타나는데, 우측 그림에서와 같이 충전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표준화처럼 쓰고 있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시스템은 480V 충전을 지원한다. 반면, 국내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아이오닉5 모델은 800V 충전 지원을 통해, 테슬라보다 1.6배 가량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시간에 대한 고민은 모든 사용자가 갖고 있는 고민이고 빠른 충전시간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화에 크게 기여한다. 즉, 고전압을 이용한 시스템 설계는 효율성과 더불어 편의성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여기서 800V 시스템에는 800V를 버티는 반도체를 쓰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위칭이 요구되는 전력변환에 있어 스위칭 및 충방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의 심한 파형 변화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이에 과도(Surge) 전압이 발생한다. 짧은 시간(수나노초)이지만 이로 인해 반도체에는 설계 전압보다 매우 큰 전압이 인가되고 이로 인해 소자 파괴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약 10~20% 이상의 전압 마진을 통해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800V 전압용으로는 1200V 내압특성을 갖는 반도체 소자가 사용된다. 즉, 고전압 설계는 일상 속에 이미 아래 그림과 같이 활용처가 매우 넓고 제품군 또한 매우 다양하다.
가전기기에서 상업용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 이러한 전력반도체는 아이러니하게도 국산화된 기술을 통한 국내 자립도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전력반도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국내 키 플레이어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소품종 대량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과는 달리 전력반도체는 소량 다품종 분야로서 기업마다 제각각인 전력용량을 맞춰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필드엔지니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고객사에 맞춤형 제품을 제공뿐만 아니라 설계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내 기업이 아직 진출하지 못한 것도 수십 년 간 쌓아온 이러한 생태계에 맞춰 준비해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숙제로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메모리 분야 외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전력반도체는 전망이 밝고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 해지고 더욱 지능화하는 전자기기 및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들의 근육이자 힘의 원천이 되는 전력반도체의 연구 개발 및 국내 자립도 증대는 또 다른 국내 연구자들의 숙제이자 목표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그림 5. 전력반도체 분야 세계 기업 현황(2023년 YOLE 리포트)
4. 울트라와이드밴드갭 산화갈륨 기술
앞서 S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에너지갭 소재가 갖는 장점들을 살펴보았다면, 실제 연구, 개발 사용화 사례를 다뤄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탄화규소(SiC)와 질화갈륨(GaN)에 대해 살펴보자. 탄화규소는 3.3eV 의 넓은 밴드갭과 높은 열전도 특성 (Si 대비 3배 이상)을 갖는다. 대전력 구동에서 높은 전류는 소자에 많은 열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열을 빠르게 방출 시키기 위해서 소재의 열 방출 특성이 뛰어나고, 이를 뒷받침한 방열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SiC 는 최적의 소재라 할 수 있다. SiC의 Si 대체 가장 성공적인 상업화는 테슬라 Model 3의 인버터 탑재라 할 수 있다. 650V 내압 특성을 planar MOSFET을 이용하여 총 48개의 die를 병렬로 연결한 사례이다. 최근에는 구동계 말고도 충전시스템에 까지 적용 검토가 되고 있고 현대자동차를 비롯 많은 자동차 회사에서 SiC 모델 적용을 진행하고 있다.
GaN의 경우 SiC 대비 고내압 특성의 구조 제작에 어려움이 있으나 2차원전자가스층(Two-Dimensional Electron Gas, 2DEG)을 기반으로 초고속 스위칭이 가능한 High-Electron Mobility Transistor(HEMT) 소자 구현을 통해 5G통신 중계기, X-밴드, k-밴드든 광대역, 고주파용 응용기 가능하다. 특히, 고전력이 요구되는 RF소자에서 입출력 임피던스가 높아 정합회로 구현이 용이하고, 작은 칩면적 구현, Si 대비 주파수 특성이 우수하다. 마지막으로 산화갈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산화갈륨(Ga2O3)은 4.8eV-5.3eV의 매우 넓은 밴드갭을 갖고 있고 앞선 SiC 및 GaN과 가장 큰 차별점으로 Si과 같은 대구경 웨이퍼 잉곳(Ingot)기반의 소재 생산이 가능하다. 4인치 SiC 웨이퍼 한 장의 가격이 연구용으로 100만원 가까이 하고, GaN의 경우에도 50-80만원에 이르는 등 가격이 매우 높다. 이에 반해 산화갈륨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한데, 아직 연구 초기 단계로서 실질적인 웨이퍼 가격은 매우 고가이다 (2인치 기준 30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이 용이하고 초고전압 응용에 적합한 특성으로 국내외 연구진들의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현 시점에서 산화갈륨은 국외 의존도가 높은 전력반도체 시장에 국내 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원천기술에서부터 사용화 기술까지 이르는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필자 또한 1200V급 산화갈륨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개발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국내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이 세계적으로 선도 되기를 희망한다.
그림 6.(좌)테슬라 Model 3에 탑재된 메인 인버터의 24개 650V급 SiC MOSFET 탑재 사진. (우)400V 테슬라 Model 3 시스템의 650V SiC Planar MOSFET 기반 3상 모터 구동을 위한 구동계 인버터 모델 [3]
5. 결론
고효율 전력변환은 점차 커져가는 에너지 소비의 중요성과 더불어 저탄소 기술 구현에 필수 요건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다. 전자제품에서부터 전기자동차, 전기항공/수상택시, 전기저장시스템, 발전소, 대형 선박, 기차, 항공 등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모든 기술에 전력변환은 필수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에 친환경, 에너지 효율 극대화라는 두 키워드는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할 숙제라 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자립도가 가장 낮은 반도체 분야인 전력반도체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 그리고 기초연구와 함께 많은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기울여야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메모리 편중 시장에서 보다 넓은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현재 국내 대기업들이 하나 둘 전력반도체 제품 개발에 뛰어드는 것을 지켜보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https://www.semicon.sanken-ele.co.jp/en/guide/powersemicon.html
[2] https://www.yolegroup.com/strategy-insights/power-electronics-meeting-the-shift-towards-electrification-and-renewable-energy-trends/
[3] https://www.pgcconsultancy.com/post/examining-tesla-s-75-sic-reduction
다음글
장주기 쌍성에서 발견된 뉴턴-아인슈타인 표준중력의 붕괴: 천체물리와 우주론에서의 과학혁명
이전글
칼코겐 화합물의 특성과 차세대 반도체 응용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연구
주요연구
칼코겐 화합물의 특성과 차세대 반도체 응용
2024-10-10
hit
1146
칼코겐 화합물의 특성과 차세대 반도체 응용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엄태용 교수
1. 서론
차세대 반도체 및 메모리 소자에서 칼코겐 화합물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소자의 미세화, 고성능화, 저전력화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재료와 이를 이용한 소자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칼코겐 화합물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상변화 메모리(PCM)는 칼코겐 화합물의 가역적인 상변화 특성을 이용하여 비휘발성 메모리를 구현함으로써 기존 메모리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Ovonic Threshold Switching (OTS) 소자는 칼코겐 화합물의 임계 전압 (Vth) 특성을 활용하여 저항변화 메모리 셀의 선택소자 역할을 수행하며 고집적 메모리 어레이에서의 누설 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원의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TMDCs)과 산화칼코겐화합물(Oxychalcogenides)은 높은 전하 이동도로 차세대 논리 소자의 채널 재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칼코겐 화합물의 독특한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뉴로모픽 소자, 센서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혁신적인 소자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칼코겐 화합물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이 독특하게 가지는 유용한 특성 때문이다. 첫째, 전기적 특성의 폭넓은 조절이 가능하다. 금속성, 반도체성, 절연성 등 다양한 전기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 소자의 기능에 따라 재료를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다. 둘째, 상변화 및 임계 스위칭 특성을 가진다. 일부 칼코겐 화합물은 온도나 전기장에 따라 비정질상과 결정상 사이의 상변화를 보이며, 이는 메모리 소자와 스위칭 소자에 활용된다. 셋째, 2차원 구조 형성이 가능하다. 칼코겐 화합물 중 일부는 원자층 수준의 얇은 2D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 고이동도 전자 소자에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재료 공학적 조절이 용이하다. 조성 및 구조의 변화를 통해 물리적, 전기적 특성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맞춤형 소자 개발이 가능하다.
그림 1. 칼코겐 화합물의 특성과 차세대 반도체 소자에서의 응용 분야를 나타낸 개념도
따라서 이 글에서는 칼코겐 화합물의 독특한 전기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반도체 소자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칼코겐 화합물의 개념과 특성
칼코겐 화합물은 주기율표 16족에 속하는 칼코겐 원소인 황(S), 셀레늄(Se), 텔루륨(Te)이 금속 또는 준금속 원소와 결합하여 형성되는 화합물을 지칭한다. 산소(O)도 같은 족에 속하지만, 칼코겐 원소는 산소에 비해 전기음성도가 낮아 결합은 이온성보다 공유 결합성이 더 강하다. 또한, d 오비탈이 반응에 참여하여 다양한 산화 상태가 존재하는 등 산화물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보여 별도의 화합물로 분류한다. [1]
칼코겐 화합물의 전기적 특성은 주로 결정 구조와 결합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결정 구조는 원자들의 배열과 대칭성이 에너지 밴드 구조에 영향을 주어 전기적 특성을 결정한다. 또한, 공유 결합, 이온 결합, 반데르발스 결합 등의 비율과 강도는 재료의 전기 전도성과 반도체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칼코겐 화합물이 주목받는 상변화 특성과 OTS 특성은 이러한 결합 종류 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2]
그림 2. 칼코겐 화합물의 특성 (a) 상전이 특성 (b) OTS 특성
2.1 상변화 특성
칼코겐 화합물은 열적 또는 전기적 자극에 의해 비정질상과 결정상 사이의 가역적인 상변화를 보인다. 비정질상은 원자 배열이 무질서한 상태로 높은 저항을 가지며, 결정상은 규칙적인 원자 배열로 낮은 저항을 가진다. [3] 상변화 메커니즘은 주로 원자 이동과 재배열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전기적 특성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 상변화는 수백 ns 수준의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어 고속 메모리 소자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상변화 과정에서의 열적 안정성은 데이터 보존과 소자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며, 재료 조성 및 구조 조절을 통해 최적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변화 재료로는 Ge2Sb2Te5(GST)가 있으며, 이는 상변화 메모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료로 빠른 상변화 속도와 안정적인 동작 특성을 가진다.
2.2 OTS 특성
OTS특성은 특정 임계 전압(Vth) 이하에서는 높은 저항 상태를 유지하다가, 임계 전압을 초과하면 급격히 낮은 저항 상태로 전환되는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비선형 전류-전압 특성은 메모리 어레이에서 누설 전류를 억제하고 선택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된다. 임계 전압 이상에서는 칼코겐 원소의 결합이 전계에 의해 이동하면서 금속성을 가지게 되거나 비공유 전자쌍이 활성화되어 전하의 이동을 도와 많은 전류를 흐르게 된다. [4] 대표적인 임계 스위칭 재료로는 SiAsTe, GeSe 등이 있으며, OTS 소자에서 임계 스위칭 특성을 나타내는 재료로 연구되고 있다.
2.3 2차원 칼코겐 화합물
칼코겐 화합물의 특별한 형태로 2D 칼코겐 화합물이 있다. 이는 단일 또는 몇 개의 원자층 두께를 가지는 층상 구조를 가지며, 대표적으로 TMDC가 있다. TMDC는 전이 금속 원소(M)와 칼코겐 원소(X)의 화합물로, 일반적인 화학식은 MX2이며, 각 층은 M 원자가 X 원자에 의해 샌드위치된 구조를 가진다. 층과 층 사이에는 약한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하여 2D 구조를 형성한다.
TMDC의 밴드 구조는 단일층에서 직접 밴드갭을 가지며, 이는 광학적 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층수가 증가하면 간접 밴드갭으로 전이되며, 이는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전기적 특성 측면에서, MoS2, WS2 등은 넓은 밴드갭을 가지는 반도체로, 고온에서의 안정성과 높은 전자 이동도를 가진다. 반면, TiSe2, VSe2 등은 금속성을 나타내며 전극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NbSe₂ 등은 저온에서 초전도성을 보여 양자 소자에 응용 가능하다.
전하 이동도 측면에서, 2D 구조로 인해 전하 운반자의 산란이 감소하여 높은 이동도를 나타내며, 이는 빠른 스위칭과 낮은 전력 소모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외부 전기장, 기계적 변형(strain), 화학적 도핑 등을 통해 밴드갭과 전기적 특성을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맞춤형 소자 개발이 가능하다.
3. 칼코겐 화합물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
칼코겐 화합물은 독특한 특성 때문에 전자, 광학, 열전, 에너지 소자 등에서 고루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에서 메모리 및 로직 IC의 차세대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1 메모리 소자
3.1.1 Phase Change Memory (PCM)
차세대 메모리 소자인 PCM은 칼코겐 화합물의 상변화 특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5] 메모리 동작 원리는 칼코겐 화합물에 낮은 전류 펄스를 인가하여 결정상(낮은 저항 상태)으로 전환시키는 SET 동작과, 강한 전류 펄스를 짧은 시간 동안 인가하여 비정질상(높은 저항 상태)으로 전환시키는 RESET 동작을 통해 정보를 저장한다. 구체적으로 SET 동작은 낮은 전류 펄스를 인가하여 상변이 물질을 결정화 온도 이상, 녹는점 이하의 온도로 가열하여 결정화를 진행시킨다. RESET 동작은 강한 전류 펄스를 인가하여 상변이 물질을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한 후 급속 냉각하여 비정질 상태로 만든다. 이때, RESET 동작에서 높은 전류가 필요하며, 이는 전력 소모와 열 간섭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재료 및 특성 측면에서, GST는 빠른 상변화 속도와 안정적인 동작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장점으로는 높은 스위칭 속도와 안정적인 사이클 내구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 소모와 낮은 상변화 온도로 인해 데이터 보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도핑된 GST는 N, C 등의 도핑을 통해 열적 안정성과 데이터 보존 특성을 개선한다. GeSb 합금은 빠른 스위칭 속도와 낮은 전력 소모를 보여 차세대 PCM 재료로 연구되고 있다.
PCM의 장점으로는 빠른 속도, 높은 내구성, 다중 레벨 저장 등이 있다.
그림 3 상전이 메모리 소자 (a) 소자 구조 (b) 소자 단면 TEM 이미지 (c) 전기적 특성
3.1.2 Ovonic Threshold Switching (OTS)
OTS 소자는 임계 스위칭 특성을 가져 저항변화 메모리 어레이에서 메모리 셀을 선택적으로 액세스하기 위한 셀렉터 소자로 활용이 가능하다. 동작 원리는 임계 전압 이하에서는 높은 저항을 유지하여 누설 전류를 억제하고, 임계 전압을 초과하는 전압이 인가되면 급격히 낮은 저항 상태로 전환되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전압이 감소하여 홀드 전압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OFF 상태로 복귀한다.
재료 및 특성 측면에서, Se 기반 칼코겐 화합물은 높은 열적 안정성과 넓은 밴드갭으로 누설 전류를 감소시킨다. Te 기반 칼코겐 화합물은 낮은 임계 전압으로 저전력 구동이 가능하지만, 열적 안정성이 낮을 수 있다. 다원 칼코겐 화합물은 Si, Ge, As, Se, Te 등의 조합으로 재료 특성을 최적화한다.
OTS 소자의 장점으로는 높은 선택성과 빠른 동작 속도를 보여 단순한 구조의 메모리 어레이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림 4 OTS 소자 (a) 단위 소자 적층 구조 (b) Crossbar array 구조 (c) 전기적 특성
3.1.3 Selector Only Memory (SOM)
SOM 소자는 셀렉터와 메모리 기능을 하나의 칼코겐 화합물 층에 통합하여 소자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능을 향상시킨다. 동작 원리는 전압의 극성 변화나 전류 제어를 통해 OTS 특성을 일으키는 임계 전압을 조절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며, 이 상태를 유지하여 비휘발성 메모리로 동작한다. [6, 7]
이 소자는 하나의 칼코겐 화합물 층이 셀렉터 기능과 메모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전극-칼코겐 화합물-전극 단층 샌드위치 크로스바 어레이 구조를 통해 메모리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소자의 개발은 OTS 소자에서 발생하던 임계전압의 이동 현상을 메모리 특성으로 이용한 것으로, OTS 기술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
재료 및 제조 기술 측면에서, GeSe 기반의 칼코겐 화합물이 낮은 임계 전압과 높은 내구성으로 SOM에 적합하며, SiGeAsTe와 같은 Te 계열의 칼코겐 화합물도 연구되고 있다.
SOM의 장점으로는 구조 단순화와 빠른 동작 속도, 에너지 효율성, 긴 소자 수명 등이 있다. 특히 PCM 대비 낮은 동작 전압으로 인해 주변 메모리 셀에 대한 열 간섭이 적어 고집적을 달성하기 유리하며, 고온 동작과 물질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동작에 의한 소자의 열화 발생이 적다.
그림 5 SOM 소자 (a) 소자 구조 (b) 소자 단면 TEM 이미지 (c) 전기적 특성
3.2 Logic IC용 High Mobility TFT 소자
고이동도 박막 트랜지스터(TFT)는 디스플레이, 센서, 논리 소자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칼코겐 화합물을 채널 재료로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TMDC인 MoS2는 단일층에서 벌집 구조를 가지며, S-Mo-S의 삼중층으로 구성된다. 전기적 특성으로 단일층에서 직접 밴드갭을 가지며, 높은 전자 이동도(최대 200 cm2/Vs 이상)를 나타낸다. 이러한 높은 전하 이동도는 빠른 스위칭과 낮은 전력 소모를 가능하게 하며, 얇은 두께와 기계적 유연성, 높은 광투과성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센서 등에 적용 가능하다.
4. 도전 과제 및 최신 연구 현황
4.1 Memory 소자 도전 과제 및 최신 연구
PCM 소자는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모, 열적 안정성, 집적도 향상 등의 과제가 있다. 특히 RESET 동작 과정에서 높은 전류가 필요하여 전력 효율 개선이 필요하며, 이때 발생한 열에 의해 열 간섭이 발생해 저장 데이터와 소자 수명의 열화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소자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 간섭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OTS 소자는 임계 전압 제어, 내구성 향상 등의 과제가 있다. 소자의 동작에 따라 Vth의 이동이 발생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해야 하며, 내구성 향상을 위해 반복적인 스위칭에도 특성이 유지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SOM 소자는 동작 원리가 PCM이 가지고 있는 발열 문제와 OTS가 가지고 있는 Vth의 이동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재료 특성 최적화를 위해 임계 전압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연구에서는 재료 조성 최적화, 증착 기술의 발전, 소자 구조 혁신, 신뢰성 향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료 조성 최적화 측면에서, GeSe 기반 재료는 Ge와 Se의 비율을 조절하여 임계 전압과 내구성을 최적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원 합금으로 Si, Ge, As, Se 등의 원소를 조합하여 열적 안정성과 스위칭 특성을 개선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8]
소자 구조 측면에서 수직 구조(VSOM)를 통해 3D 적층을 구현하여 고집적 메모리 어레이를 개발하고, 저장 용량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증착 기술 측면에서는 선택적 ALD를 활용하여 선택적으로 박막을 형성하고, 3D 구조의 구현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때 저온 증착을 통해 비정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하여 칼코겐 화합물의 ALD는 칼코겐 실리콘 화합물 전구체의 리간드 주도 교환 반응을 통해 GeTe, GeSe, SbTe, GST 비정질 박막의 공정이 연구되어 VSOM 소자에 적용 가능성이 연구 중이다. [9-12]
그림 6 SOM 소자의 향후 개발 과제
4.2 High Mobility TFT 소자 도전 과제 및 최신 연구
최근 연구에서는 표면 상태 개선, 이종접합 구조 개발, 소자 안정성 향상 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2D 반도체는 수직 방향으로 결합을 하지 않는 특성으로 금속 전극 연결이 용이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면의 화학적 처리, 계면 층 삽입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종접합 구조 개발 측면에서 TMDC와 같은 2D 반도체 소재에 3D 유전막이 접속하면 계면에 전자 상태가 형성되어 2D 반도체 소재의 특성을 열화시킬 수 있어 h-BN과 같은 2D 유전막 집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소자 안정성 향상 측면에서, 쉽게 산화되는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호층 등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동작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최근 연구된 물질인 Bi2O2Se와 Bi2SeO5는 층상 구조를 가지는 2D 칼코겐 화합물로, 금속산화물층과 칼코겐 층이 반복적으로 존재하며 층과 층 사이가 반데르발스 힘으로 상호작용한다. 여기서 Bi2O2Se는 높은 전자 이동도를 보이는 반도체 물질이며, Bi2SeO5는 채널의 특성 저하가 없는 고유전 박막(High-k)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13] 이 물질은 기존에 Exfoliation이나 반도체에서 사용되지 않는 STO 또는 Mica 단결정 기판에서 CVD 성장만이 가능했지만, 최근 SiO2 기판 등에 ALD 방식으로 증착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14]
5. 결론
칼코겐 화합물은 그 독특한 전기적 특성과 구조적 다양성으로 인해 반도체 소자에서 혁신적인 가능성을 제공한다.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칼코겐 화합물은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재료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래의 정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 노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핵심 요소인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소자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산업 전반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6. 참조
[1] F. Jellinek, "Transition metal chalcogenides. relationship between chemical composition, crystal structure and physical properties," Reactivity of Solids, vol. 5, no. 4, pp. 323-339, 1988, doi: 10.1016/0168-7336(88)80031-7.
[2] D. Lencer, M. Salinga, B. Grabowski, T. Hickel, J. Neugebauer, and M. Wuttig, "A map for phase-change materials," Nat. Mater., vol. 7, no. 12, pp. 972-977, 2008, doi: 10.1038/nmat2330.
[3] A. V. Kolobov, P. Fons, A. I. Frenkel, A. L. Ankudinov, J. Tominaga, and T. Uruga, "Understanding the phase-change mechanism of rewritable optical media," Nat. Mater., vol. 3, no. 10, pp. 703-708, 2004, doi: 10.1038/nmat1215 http://www.nature.com/nmat/journal/v3/n10/suppinfo/nmat1215_S1.html.
[4] M. Zhu, K. Ren, and Z. Song, "Ovonic threshold switching selectors for three-dimensional stackable phase-change memory," MRS Bull., vol. 44, no. 9, pp. 715-720, 2019, doi: 10.1557/mrs.2019.206.
[5] S. R. Ovshinsky, "Reversible Electrical Switching Phenomena in Disordered Structures," Phys. Rev. Lett., vol. 21, no. 20, p. 1450, 1968. doi: 10.1103/PhysRevLett.21.1450.
[6] S. Hong et al., "Extremely high performance, high density 20nm self-selecting cross-point memory for Compute Express Link," in 2022 International Electron Devices Meeting (IEDM), 3-7 Dec. 2022 2022, pp. 18.6.1-18.6.4, doi: 10.1109/IEDM45625.2022.10019415.
[7] I. M. Park et al., "Enhanced Endurance Characteristics in High Performance 16nm Selector Only Memory (SOM)," in 2023 International Electron Devices Meeting (IEDM), 9-13 Dec. 2023 2023, pp. 1-4, doi: 10.1109/IEDM45741.2023.10413748.
[8] T. Ravsher et al., "Polarity-Induced Threshold Voltage Shift in Ovonic Threshold Switching Chalcogenides and the Impact of Material Composition," phys. status solidi (RRL) – Rapid Research Letters, vol. 17, no. 8, p. 2200417, 2023, doi: https://doi.org/10.1002/pssr.202200417.
[9] V. Pore, T. Hatanpää, M. Ritala, and M. Leskelä, "Atomic Layer Deposition of Metal Tellurides and Selenides Using Alkylsilyl Compounds of Tellurium and Selenium," J. Am. Chem. Soc., vol. 131, no. 10, pp. 3478-3480, 2009, doi: 10.1021/ja8090388.
[10] T. Eom et al., "Conformal Formation of (GeTe2)(1–x)(Sb2Te3)x Layers by Atomic Layer Deposition for Nanoscale Phase Change Memories," Chem. Mater., vol. 24, no. 11, pp. 2099-2110, 2012, doi: 10.1021/cm300539a.
[11] T. Eom et al., "Combined Ligand Exchange and Substitution Reactions in Atomic Layer Deposition of Conformal Ge2Sb2Te5 Film for Phase Change Memory Application," Chem. Mater., vol. 27, no. 10, pp. 3707-3713, 2015, doi: 10.1021/acs.chemmater.5b00805.
[12] S. Yoo, C. Yoo, E.-S. Park, W. Kim, Y. K. Lee, and C. S. Hwang, "Chemical interactions in the atomic layer deposition of Ge–Sb–Se–Te films and their ovonic threshold switching behavior," J. Mater. Chem. C, vol. 6, no. 18, pp. 5025-5032, 2018, doi: 10.1039/C8TC01041B.
[13] T. Li and H. Peng, "2D Bi2O2Se: An Emerging Material Platform for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Industry," Accounts of Materials Research, vol. 2, no. 9, pp. 842-853, 2021, doi: 10.1021/accountsmr.1c00130.
[14] H. Park et al., "Direct Growth of Bi2SeO5 Thin Films for High-k Dielectrics via Atomic Layer Deposition," ACS Nano, vol. 18, no. 33, pp. 22071–22079, 2024, doi: 10.1021/acsnano.4c05273.
다음글
고효율 전력변환을 위한 전력반도체 기술
이전글
작업 상황 이해 및 추론이 가능한 거대 인공지능 모델 기반 로봇 조작 작업 학습 기술 개발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연구
주요연구
작업 상황 이해 및 추론이 가능한 거대 인공지능 모델 기반 로봇 조작 작업 학습 기술 개발
2025-02-04
hit
507
작업 상황 이해 및 추론이 가능한 거대 인공지능 모델 기반 로봇 작업 학습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robotic manipulation task learning based on Foundation model to understand and reason about task situations)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구영현 교수
1. 서론
최근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의 발전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과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거대 언어 모델과 로봇 분야의 결합은 매우 주목받는 주제로, 복잡한 환경에서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인간과의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로봇 학습은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통해 작업을 배우고 적응하는 기술로, 기존에는 주로 센서 데이터와 정형화된 명령어에 의존했다. 그러나 거대 언어 모델의 도입으로 인해 로봇은 비정형적인 자연어 명령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구글 딥마인드 AutoRT[1] - LLM을 통한 명령 이해, 작업 수행, 주변 상황 미학습 물체 이해 및 자율적으로 명령어 생성 가능
예를 들어, 사용자가 “테이블 청소 해줘”라고 말하면, LLM은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여 로봇이 실행 가능한 작업 계획(Task Planning)을 생성하고 나아가 해당 작업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액션 코드(Action Code)를 생성하여 로봇 제어가 가능하게끔 한다. 로봇의 작업 계획은 로봇이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 임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행동들을 최적의 순서대로 나열하여 계획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로봇 작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헝가리안 알고리즘 등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조립계획서와 같은 작업 계획에 대한 데이터셋을 딥러닝 모델의 학습을 통해서 수행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대 언어 모델의 추론 능력을 기반으로 로봇이 수행할 작업을 입력하면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소 행동들을 계획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거대 언어 모델은 사전에 학습한 데이터셋의 지식을 기반으로 추론을 수행한다. 모델은 학습 당시 포함되지 않은 최신 정보나 새로운 지식에 대해 알지 못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정보와 관련된 추론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다양한 작업환경 또는 기존에 학습하지 않은 제품이 작업환경에 나타났을 경우 추론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
그림 2. 작업 상황 이해 및 추론이 가능한 거대 인공지능 모델 기반 로봇 작업 학습 기술 개발 개념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추론 결과가 부정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Chain-of-Thought
Chain-of-thought의 특성은 언어모델의 추론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한 데이터셋을 추가하고 새롭게 학습하는 방식이 아닌 몇 개의 예제를 통해 원하는 분야의 해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2].
그림 3. Standard Prompt와 Chain-of-Thought Prompt의 비교 예시, CoT가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해하여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하는 것을 확인[2]
이러한 방식은 로봇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작업 계획을 생성하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대 언어 모델은 단순히 명령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사고 과정(Chain-of-Thought)을 통해 로봇의 작업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 이 사고 과정은 인간의 사고 흐름과 유사하게 정보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뜻한다.
사용자가 “테이블을 정리해줘”라고 명령하면, 거대 언어 모델은 해당 문장의 의도를 분석하고 로봇이 어떤 물건을 어디로 옮길지 계획하고, 작업의 순서를 최적화하여, 체계적으로 계획한다. 또한 로봇이 여러 가능한 작업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도와준다. 이는 인간의 논리적 사고 과정을 모방하여 문제를 분해하고 분석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보다 유연하고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Chain-of-Thought 기법은 로봇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용자의 의도 해석을 통해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정리”가 필요한 이유를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 및 근거에 따라 최적의 작업 순서를 포함한 작업 계획을 설계한다.
Chain-of-Thought 기법은 로봇의 작업 수행 능력을 한 차원 높여주며,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인간과의 협업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
“미학습 물체(unseen/unknow object)”란 인공지능 모델이 사전에 학습하지 않은 물체를 의미한다. 이는 모델의 훈련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이나 클래스, 즉 기존 데이터에서 관찰되지 않은 특성을 가진 물체를 포괄한다. 현실에는 학습 데이터로 모두 커버할 수 없는 많은 물체와 상황이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물체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벨링하는 것은 비용, 시간, 자원 면에서 비효율적일 뿐 더러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접근성에서도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사전에 학습하지 않은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학습 물체 인식”에서의 “미학습 물체”의 클래스는 “open vocabulary”를 통해 정의된다.
"Open vocabulary"라는 개념은 머신러닝과 자연어처리(NLP) 연구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기존의 "closed vocabulary"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유래되었다. 전통적으로 NLP 모델은 미리 정의된 고정된 어휘(vocabulary)에 의존하여 언어를 처리했는데, 이 방식은 새로운 단어(unknown words)나 특정 도메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유 용어들을 다루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open vocabulary”가 제안되었다. 이는 모델이 사전에 고정된 어휘 집합에 의존하지 않고, 학습 과정에서 새로운 단어와 개념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시스템에서는 사전 정의된 어휘로 모든 개념을 포괄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포맷과 컨텍스트를 학습하면서 어휘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open vocabulary”이라는 개념을 촉진했다.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은 기존 데이터만 의존하지 않고, 인간처럼 새로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당 기술은 범용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필요적인 요소로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거대 언어 모델과 로봇 분야의 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자율주행, 보안,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다.
로봇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와 고도로 특화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정 작업에 특화된 데이터셋은 부족하며, 이를 확보하는데는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과 작업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은 로봇분야의 연구방향에서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로봇에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 적용을 통해 미리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물체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작업 환경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물체가 추가되어도 로봇의 성능이 유지된다. 또한 사전 학습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셋을 수집하거나 학습시키는 과정을 필요하지 않아, 다양한 물체를 인식하고 조작할 수 있으므로 작업의 범위와 효율성이 확대된다. 이는 데이터 라벨링 및 모델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은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패턴이나 특징을 기반으로 물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체가 추가되더라도 재학습 과정 없이 새로운 물체를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어 동적인 환경에서 유연하게 인간-로봇 상화작용을 진행할 수 있다.
4. 검색 증강 생성
검색 증강 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RAG) 모델은 거대 언어 모델과 정보 검색 시스템을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첨단 AI 기술이다. 거대 언어 모델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각(Halluciation) 문제, 지식 업데이트 문제, 도메인 별 전문성 부족과 같은 몇 가지의 핵심 문제로 로봇 분야 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LLM을 증강하는 검색 증강 생성의 등장은 LLM의 이러단 단점을 보완했다[3]. 검색 증강 생성 모델은 주어진 입력에 기반하여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한다. 그 다음 검색된 정보를 융합 기술을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와 결합한다. 마지막으로 입력과 해당 검색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기가 예측을 수행한다.
그림 4. 검색 증강 생성 개요, 검색 증강 생성은 크게 검색기(Retirever), 검색 융합(Retrieval Fusions), 생성기(Generations)로 구성됨[3]
4.1 검색기(Retriever)
검색기는 입력된 쿼리에 대한 관련성 높은 문서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는 구성요소이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는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도로 최적화된 검색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4.2 검색 융합(Retrieval Fusions)
검색 융합은 검색된 정보를 활용하여 생성 과정을 보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융합 기법은 크게 쿼리 기반 융합(Query-based fusion), 잠재 융합(Latent fusion) 그리고 로짓 기반 융합(Logits-based fusion)으로 나뉜다. 쿼리 기반 융합은 검색된 정보를 생성기에 입력하기 전에 이를 입력 데이터에 추가하여 보강한다. 잠재 융합은 검색된 표현을 생성기의 잠재 표현에 도입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로봇 기반 융합은 생성기의 출력 로짓에 초점을 맞추며, 검색된 정보의 로짓을 융합하여 더 견고한 로짓 출력을 제공한다.
4.3 생성기(Generator)
생성기는 기본 생성기와 검색 증강 생성기로 분류된다. 기본 생성기에는 대부분의 사전 학습 또는 미세 조정된 대규모 언어 모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GPT 계열의 모델, 그리고 Gemini 계열의 모델 등이 있다. 검색 증강 생성기는 검색된 정보를 융합하는 모듈을 포함한 사전 학습 또는 미세 조정된 생성기를 의미한다.
거대 언어 모델은 사전 훈련된 지식을 기반으로 추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새로 업데이트된 지식에 대한 정보가 없다. 또한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 기반으로 작업환경에서 새로 나타나거나 기존에 학습하지 않은 물체의 이름을 알아도 해당 물체의 정의 또는 기능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추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로봇 작업에 검색 증강 생성 모델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작업환경에서 처음 나타나거나 기존에 학습하지 못한 물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거대 언어 모델이 더욱 정확한 조작 계획을 추론할 수 있게끔 하는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그림 5. Chain-of-thought,미학습 물체 인식, 검색 증강 생성 등 기술을 통한 모호한 명령 추론 기반 작업 계획 생성
5. In-Context Learning
In-Context Learning은 거대 언어 모델이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 학습(Fine-tuning) 없이, 주어진 문맥 내에서 제공된 예시를 통해 작업의 패턴을 학습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언어모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특정 작업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요한 기법이다. In-Context Learning 기법 적용 시 입력으로 사용되는 프롬프트(Prompt)는 거대 언어 모델이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문맥을 제공하는 입력 텍스트를 의미한다. 프롬프트는 모델이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그림 6. In-Context Learning 예시[4]
기존의 로봇은 강화 학습과 지도 학습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해당 학습 방법들은 학습 데이터 생성 및 모델 학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와, 고가의 센서,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이 어렵고 모델 학습에 컴퓨팅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로봇은 다양한 작업 수행에 대한 적응성을 필요로 한다. 단일 작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번 새롭게 학습하거나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In-Context Learning 기술은 로봇이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인간처럼 유연하게 적응하며 다양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술이다. 예를 들어, 가정 환경에서 사용되던 로봇 모델을 사무실 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작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모델이 적절한 작업 계획을 생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In-Context Learning 기술을 활용하면, 사무실 환경에 대한 몇 가지 예시만 제공해도 로봇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이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제조 공장 등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7. 로봇 작업에서 거대 언어 모델에 직접 In Context Learning 기법을 적용한 예시와 거대 언어 모델 기반 모호한 명령 이해 및 추론 모델에 In-Context Learning 기법을 적용한 예시 비교
6. 작업 상황 추론 LLM 로봇 기술 개발
앞서 거대인공지능 모델이 로봇 분야에서의 다양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살펴보았다면, 해당 기술들을 모두 적용할 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Chain-of-Thought 기술은 비록 논리 및 근거에 따라 로봇의 작업 계획을 생성하지만 거대 언어 모델이 사전에 학습한 지식에 의거하기 때문에 생성한 작업계획이 불완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은 로봇더러 동적인 작업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물체의 클래스(이름)을 거대 언어 모델에 알려준다. 하지만 물체의 이름만 알고 해당 물체의 기능, 해당 환경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면 여전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적용하여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 및 Chain-of-Thought 기술 기반 단계별 보다 정확한 추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술이 다양한 환경에서의 빠른 적응을 위해 In-Context Learning 기술을 도입한다.
그림 8. human robot interface 예시
7. 결론
실시간 대응 로봇 자동화 기술은 국제적인 기술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고 국내 기관에서도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에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제조, 사무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도 노동력 부족 현상과 서비스 수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자동화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거대 언어 모델을 적용한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할 작업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 접근 장벽을 낮추고 기술 지원 및 활성화를 기대하고, 특정 산업 외 전 산업에 결쳐 자동화율을 높임과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하여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 전문 서비스 분야의 자동화나, 질병 혹은 고령화로 인해 자립적인 물체 조작과 같은 상황 대응이 어려운 사람을 보조하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 자동화 기술을 확장함으로써 서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Reference
[1] Ahn, M., Dwibedi, D., Finn, C., Arenas, M. G., Gopalakrishnan, K., Hausman, K., ... & Xu, Z. (2024). Autort: Embodied foundation models for large scale orchestration of robotic agents. arXiv preprint arXiv:2401.12963.
[2] Wei, J., Wang, X., Schuurmans, D., Bosma, M., Xia, F., Chi, E., ... & Zhou, D. (2022). Chain-of-thought prompting elicits reasoning in large language model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5, 24824-24837.
[3 Wu, S., Xiong, Y., Cui, Y., Wu, H., Chen, C., Yuan, Y., ... & Xue, C. J. (2024).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 survey. arXiv preprint arXiv:2407.13193.
[4] Dong, Q., Li, L., Dai, D., Zheng, C., Ma, J., Li, R., ... & Sui, Z. (2022). A survey on in-context learning. arXiv preprint arXiv:2301.00234.
다음글
칼코겐 화합물의 특성과 차세대 반도체 응용
이전글
손 안의 정밀 위치 기술 : 스마트폰을 활용한 GNSS 정밀 측위의 현재와 미래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단신 주요단신 세종투자연구회 ‘세투연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모의투자대회 사상 첫 팀 부문 연속 수상 쾌거 2025-06-04 hit 72 ▲수상팀 ‘세투연자산운용’ 사진 중앙동아리 세종투자연구회(이하 세투연) 산하 ‘세투연자산운용’이 한국투자증권 주최 제11회 대학생 모의투자대회에서 팀 부문 2위와 개인 부문 4, 8위를 차지하며, 작년에 이어 국내 주식 팀 부문 사상 첫 연속 수상과 개인 부문 동시 입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는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4주간 진행됐으며, 전국 452개 대학에서 5,181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투연 자산운용팀은 최종 수익률 483.1%로 팀 부문 2위를 차지했고, 개인 부문에서는 김태원(데이터사이언스학과·19) 학생이 150.1%의 수익률로 4위, 고서연(경제학과·23) 학생이 113.4%의 수익률로 8위를 차지했다. 개인 부문 수상자는 한국투자증권 입사 지원 시 인적성 평가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세투연자산운용’은 세투연 자산운용팀 소속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팀장 이재범(항공우주공학과·19) 학생을 중심으로 고서연, 김태원, 박종원(데이터사이언스학과·21), 방지현(경영학과·21), 송원근(데이터사이언스학과·20), 정우진(법학부·19), 조동우(경제학과·21), 최훈제(외식경영학과·16) 학생이 참여했다. 세투연 상임고문 김태원(데이터사이언스학과·19) 학생은 “세투연이 동일 부문 내 첫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워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매년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팀 부문만큼은 우리 세종대 세투연이 매년 가져올 수 있도록 운용 체계를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재/ 이현석 홍보기자(hslee901@naver.com) 다음글 학술정보원, 소장 도서 100만 권 등록 기념 이벤트 진행 이전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세종열린특강 옥토제너리언으로 살기 위한 생애 설계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단신 주요단신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세종열린특강 옥토제너리언으로 살기 위한 생애 설계 진행 2025-06-04 hit 57 ▲강연 중인 김석란 교수의 모습 ▲강연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와 세종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는 지난 5월 24일 광개토관 108A호에서 ‘옥토제너리언(Octogenarian)’으로 살기 위한 생애 설계’라는 주제로 세종열린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초고령사회에서 주도적인 옥토제너리언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략 모색을 돕고자 기획됐으며, 강연은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소속 김석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삼성전자 경력컨설팅센터에서 전직 지원, 생애 설계, 경력 관리 컨설팅 및 강의를 담당했으며, 현재는 퇴직 준비 직원을 위한 전직 지원과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음길HR에서 교육사업본부를 총괄·운영하고 있다. 특강은 △초고령사회, 옥토제너리언의 의미 △변화하는 노후의 삶 △생애 5대 요소 점검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다뤘다. 김 교수는 ‘꼰대’, ‘권위적’ 등 고령자에 대해 존재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고령자들의 은퇴 후 재취업과 사회 참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노후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애 5대 영역인 △재무 △일 △건강 △관계 △여가를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의 영역에서는 전문성과 시대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격증 취득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실제 수요 있는 분야를 사전에 파악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의 영역에서는 50대 이후 재취업자의 75% 이상이 지인 추천 등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하며, 공개 채용보다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속적인 경력 관리와 관계 형성이 고용 가능성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나이 들어가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남이 아닌 스스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자기목적적(오토텔릭, autotelic)인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만족도 높은 노년기를 여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김 교수는 “이 강의가 학생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활동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진행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기획한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오는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학년도 후기 3차 신·편입생을 모집하며, 세종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사회복지전공과 더불어 △상담복지 △노인보건의료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등 세부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복지 실천 현장 전문가 교육과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정책대학원(02-3408-3044~5), 세종사이버대(02-2204-8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취재/ 이가은 홍보기자(lee9adong@naver.com) 다음글 세종투자연구회 ‘세투연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모의투자대회 사상 첫 팀 부문 연속 수상 쾌거 이전글 산업대학원, (주)포티움과 MOU 체결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단신 주요단신 산업대학원, (주)포티움과 MOU 체결 2025-06-05 hit 21 ▲협약식 참석자 단체 사진 산업대학원은 지난 5월 26일 광개토관 926호에서 ㈜포티움과 MOU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연구 및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양 기관의 기술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포티움은 지난 2014년 설립된 스포츠과학연구기업으로, 헬스케어 제품 개발, 사업장 건강관리, 국가대표선수 재활 트레이닝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산업대학원 최진호 원장, 강덕모 스포츠산업학과 주임교수, 강대진 교학과 부서장과 ㈜포티움 엄성흠 대표이사, 성봉주 선임연구원, 이아라 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추진 △연구시설 공동 활용 △교육지원(장학금 혜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대학원 최진호 원장은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포티움과의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교육과 함께 미래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재/ 최수연 홍보기자(soo6717@naver.com) 다음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세종열린특강 옥토제너리언으로 살기 위한 생애 설계 진행 이전글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25 여름방학 ‘토픽 집중반’ 수강생 모집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단신 주요단신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25 여름방학 ‘토픽 집중반’ 수강생 모집 2025-06-05 hit 31 ▲여름방학 토픽 집중반 포스터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오는 6월 30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2025 여름방학 ‘토픽 집중반’을 개강한다.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단기간에 진행되는 토픽 집중학습 프로그램으로 토픽 실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세종대 재학생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6월 28일까지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 또는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kai.quv.kr/)를 통해 가능하다. 수업은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5주간 주 2회 진행되며 신청한 분반에 따라 요일과 시간대는 달라진다. 수강료는 10만 원이다.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이번 여름방학 집중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꾸준한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단기간 내 한국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집현관 913호/02-3408-2994/seckc@sejong.ac.kr)로 문의하면 된다. 취재/ 권상혁 홍보기자(seankweon@naver.com) 다음글 산업대학원, (주)포티움과 MOU 체결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세종특강 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베러모먼트코퍼레이션 김준영 대표, 강연 진행 2025-03-27 hit 123 ‘베러모먼트코퍼레이션’의 대표이자 21.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포리얼’ 김준영 대표가 지난 19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비상식적 창업학’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준영 대표는 강연에서 사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라고 강조하며, 우리 인생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을 바라보는 김 대표의 강연을 직접 현장에 가 들어봤다. ▲김준영 대표 사업은 어려운 게 아니다 김준영 대표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언젠가 직장을 나왔을 때, 스스로 돈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에서 훌륭한 커리어를 보낸 사람들도 은퇴 이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인생에서 사업이라는 옵션을 지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며, 퇴직을 앞두고 사업을 결심하면 늦으니 대학생 때부터 작게나마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투자를 받아 요양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회사 내 정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인생에서 취업이라는 옵션을 생각해 본 적 없던 그는 유튜브를 시작으로 현재의 자리에 올랐다. 사업 구조가 변화하다 김준영 대표는 온라인의 발달로 사업의 기회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기존의 사업 구조가 오프라인에만 머무는 형태라면, 최근의 사업 구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말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는 무료로 정보를 올린 뒤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가치 있는 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다고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자신만의 아이템을 구독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이라는 것이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가 혼자서 돈을 벌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래에는 기본 소득에만 의존하는 사람과 기본 소득과 추가 소득을 모두 얻는 사람으로 나뉘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 예상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도 계속 벌어질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영역을 계속해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대표가 질의응답하고 있다.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김준영 대표는 AI가 발달하는 시대에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귀하다고 강조하며,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어른들이 정해놓은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만 많아지다 보면 세상은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인생에 정해진 정답이 없으니 다양한 길을 열어두라고 조언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새로운 걸 만들 필요는 없고, 롤모델을 정해놓고 그의 생각을 참고한다면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말했다. 그는 우리가 삶을 맹목적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데,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우리가 살면서 우등 비교가 아닌 열등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취재/ 문준호 홍보기자(mjh30279@naver.com) 다음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매직메이커 권혁민 대표, 강연 진행 이전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밭 이미소 대표, 강연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세종특강 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밭 이미소 대표, 강연 진행 2025-04-02 hit 189 농업회사법인 밭의 이미소 대표가 지난 3월 26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감자빵 창업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감자빵을 개발하여 연매출 200억 원을 달성한 그는, 자신의 창업 경험을 청중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미소 대표 어린 시절의 도전과 감자빵 창업의 시작 이미소 대표는 강원도 춘천에서 감자빵을 개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세종대 패션디자인학과 10학번인 그는 다니던 스타트업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인 춘천으로 내려가 감자 농사를 도우며 감자빵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감자 농사를 지으며 겪었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감자 농가의 소득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창업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IT 회사에서 근무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감자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감자빵은 물론 감자 프레첼, 감자만두, 감자전병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마침내 감자빵을 성공시켰다. 도전을 통해 얻은 배움과 실행의 중요성 이미소 대표는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배움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창기 시도했던 제품들이 잘 팔리지 않아 실망스러운 경험도 많았지만, 지속적인 실험과 분석을 통해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장에 내놓고 피드백을 얻는 린 스타트업 방식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소 대표는 정부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 조사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점차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유통망을 넓혀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조언했다. ▲이미소 대표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미소 대표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꿈꾸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들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 초기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공의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말고,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며 자신감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창업이라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는 과정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미소 대표는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모든 도전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취재/ 유재혁 홍보기자(db1345@naver.com) 다음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베러모먼트코퍼레이션 김준영 대표, 강연 진행 이전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옴니콤미디어 양희윤 전 대표, 강연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세종특강 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1] 옴니콤미디어 양희윤 전 대표, 강연 진행 2025-04-08 hit 319 ‘옴니콤미디어’ 양희윤 전 대표가 지난 2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양희윤 대표는 강연에서 광고 대행사의 세계가 매우 넓다고 말했다. 광고 시장을 선도하는 양 대표의 강연을 직접 현장에 가 들어봤다. ▲양희윤 대표 점점 커지는 광고 시장 양희윤 대표는 브랜드와 제품이 서로 다른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B2C 기업뿐만 아니라 B2B 기업도 브랜드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가 크게 광고 대행사, 홍보 대행사, 리테일 마케팅 대행사, 디지털 대행사, SNS 대행사로 나뉜다며 각각의 예시를 들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대행사 업무 영역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으며, 주식·숫자·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도 은행에서 일하다가 광고 기획자로 노선을 변경해 광고업계로 들어왔다고 말하며, 광고 시장의 경계가 넓어진 만큼 미디어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걸 다 도전해 보라고 조언했다. 타깃 오디언스의 중요성 양희윤 대표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깃 오디언스라고 말했다. 그는 타깃 인사이트가 우리 삶의 전반을 관통하는 개념이라고 말하며, 커뮤니케이션할 타깃을 정의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대표는 나이, 성별, 지역, 직업 등의 데모그래픽도 중요하지만 사회 계층, 라이프 스타일, 개성 등의 사이코그래픽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 화장품 등을 예시로 들어 타깃 오디언스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독립 변수인 광고비와 종속 변수의 세일즈 매출이 양의 상관관계를 띠는 심플한 마케팅의 세계였지만, 현재는 디지털의 출시로 인해 복잡한 마케팅의 세계가 되었다고 말했다. ▲양희윤 대표가 질의응답하고 있다. AI 시대에서의 광고 시장 양희윤 대표는 AI가 출시되면서 미디어뿐만 아니라 대행사의 업무도 많이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SNS 광고 시장의 변동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양 대표는 자신의 부모님 세대에는 없던 새로운 분야의 기업을 스스로가 일궈냈듯이, 다가오는 AI 시대에 학생들 중 누군가가 새로운 세계를 열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각자 멋진 직업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항상 ‘BEST’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Finding One Better Way’라는 말을 끝으로 강연을 마쳤다. 취재/ 문준호 홍보기자(mjh30279@naver.com) 다음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밭 이미소 대표, 강연 진행 이전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필라멘트리 문두열 대표, 강연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세종특강 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1] 필라멘트리 문두열 대표, 강연 진행 2025-04-15 hit 164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업 필라멘트리의 문두열 대표가 지난 4월 9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창업 특강을 진행했다. 방송사 PD 출신으로 콘텐츠 스타트업을 창업해 연쇄 창업과 투자까지 영역을 확장해 온 문두열 대표의 강연을 직접 들어봤다. ▲문두열 대표 프레임을 설정하는 콘텐츠 전략 문두열 대표는 유리병에 담긴 박카스와, 같은 음료를 플라스틱 병에 옮겨 담았을 때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예시로 들며 강연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용물보다 외형, 즉 프레임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며 콘텐츠 역시 그 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을 창업에 연결시켜 창업 아이템도 어떻게 프레이밍하고 포지셔닝하느냐에 따라 같은 아이템이라도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계산기’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해석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사물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창조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패를 통해 성공에 다가가는 구조적 반복 문두열 대표는 창업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 대표는 첫 사업 당시 콘텐츠 제작 경험은 있었지만 창업 지식은 전무한 상태로 후원을 받기 위해 직접 만든 PPT 하나를 들고 여러 기관들을 찾아다녔고, 결국 2억여 원의 후원을 이끌어내며 첫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그는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은 통계적으로 낮지만, 열두 번 정도 도전하면 반드시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다며 이를 확률적 구조로 이해하고 성공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도전할 것을 조언했다. 다만 창업 도전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과감히 포기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이때 정부나 학교의 창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 자본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한 다양한 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두열 대표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협업과 창업에 필요한 요소 강연 말미에는 조직문화와 동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문 대표는 처음에는 친구들로부터 ‘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함께할 동료를 만나면서 사업이 가능해졌다고 회고했다. 그는 동료를 ‘나를 세뇌시키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울’이라고 표현하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인 만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라멘트리의 사내 구조를 예시로 들며 수직적인 명령 구조보다는 자율성과 책임이 공존하는 수평적 조직문화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라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창업에 필요한 요소로 동기, 재능, 운을 꼽으며, 이 중 어느 하나가 월등한 것보다 어느 하나가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매일 일정한 루틴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본인을 세뇌하고 실천을 반복하다 보면 진짜 원하는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목표가 생기는 순간 인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갖게 된다고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취재/ 유재혁 홍보기자(db1345@naver.com) 다음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옴니콤미디어 양희윤 전 대표, 강연 진행 이전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더존비즈온 지용구 부사장, 강연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세종특강 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더존비즈온 지용구 부사장, 강연 진행 2025-04-25 hit 201 더존비즈온’ 부사장이자 ‘더존넥스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지용구 대표가 지난 16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업무 도구의 진화, 업무 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지용구 대표는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또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삶에서 창업이라는 키워드와 기업가 정신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현장에 가 강연을 들어봤다. ▲지용구 대표 목적성을 가져라 지용구 대표는 기업의 자산과 업무를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인 ‘Amaranth 10’을 만들었다. 그는 쉽고 안전하게 기술과 정보에 접근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는 스마트한 ICT 기술 도구를 만들고자 했고, 이에 성공하여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86%가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지 대표는 AI를 데이터를 쌓는 도구라고 정의하며, 작년부터 이를 자사 플랫폼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지식이 된다고 말하며, 기업이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AI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창업이라는 것이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하며,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에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명 의식을 갖게 하라 지용구 대표는 기술과 아이디어 없이 회사를 창업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설령 기술을 잘 모를지라도 기술을 다루는 사람과 최소한의 소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직원들에게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건 어려우나, 사명 의식과 소명 의식을 갖게 하는 건 리더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사명 그룹∙직업 그룹∙노동 그룹으로 나누며, 리더로서 직원들을 사명 그룹에 속하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인 칼릴 지브란이 말한 ‘만일 그대가 무관심 속에서 빵을 굽는다면 그대는 인간의 배고픔을 반밖에는 채우지 못하는 맛없는 빵을 굽는 것과 같다’는 명언을 인용하여, 사명 의식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지용구 대표가 질의응답하고 있다. 세상을 즐겨라 지용구 대표는 힘들지 않은 의미 있는 일, 힘들지 않으면서 재미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며, 자기가 맡은 일을 즐기면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열정적으로 살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인드 셋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 대표는 창업자가 사업 성장 단계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을 유연하게 변화하여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틀린 결정보다 느린 결정이 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들에게 열심히만 노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열심히 똑똑하게 일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 세대에 영리하게 일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말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응원한다는 말을 전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취재/ 문준호 홍보기자(mjh30279@naver.com) 다음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필라멘트리 문두열 대표, 강연 진행 이전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케어닥 장지호 전무이사, 강연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세종특강 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1] 케어닥 장지호 전무이사, 강연 진행 2025-05-08 hit 194 헬스케어 스타트업 ‘닥터나우’의 공동창업자이자 현재 케어닥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장지호 전무이사가 지난 4월 30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실패가 두려운 우리에게’ 를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서 장 전무이사는 본인의 창업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현실적인 창업 조언을 풀어냈다. ▲장지호 전무이사 실패는 가장 값비싼 자산 장지호 전무는 7번의 창업 실패 경험을 되짚으며 강연을 시작했다. 다양한 아이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했고, 시장의 흐름을 잘못 읽거나 시기상조였던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그는 실패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후회가 더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패를 겁내지 말고 도전하라고 권했다. 20대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며, 실패하지 않고 얻는 작은 성공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므로 진정으로 생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위해선 실패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을 만드는 사람, 흐름을 읽는 사람이 되라 실패의 반복 속에서도 장 전무는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시장조사나 경쟁 분석보다는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장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닥터나우’에 합류했고, 원격진료 플랫폼을 개발해 팬데믹 상황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장 전무는 ‘혁신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지금 당장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문제 해결의 의지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지호 전무이사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본인을 규정짓지 않는 태도와 ‘레이저 포커스’ 창업자의 태도와 조직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사람은 자신을 규정하는 순간, 그 규정 안에 갇히게 된다며, 창업자라면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기보다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 과정에서의 핵심 역량으로는 ‘레이저 포커스’를 언급하며, 딱 하나의 문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해결하는 능력이야말로 창업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지호 전무는 “시장 1등이 되고 싶다면,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획력과 시장을 재정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확한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부딪히며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취재/ 유재혁 홍보기자(db1345@naver.com) 다음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더존비즈온 지용구 부사장, 강연 진행 이전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레드타이 정승환 대표, 강연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세종특강 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레드타이 정승환 대표, 강연 진행 2025-05-14 hit 121 국내 최대 컨시어지 그룹 ‘레드타이’ 정승환 대표가 지난 7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지금은 움직여야만 할 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가 사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기 위해 직접 강연 현장을 찾았다. 정승환 대표는 원래 목표가 세종대에 입학하는 것이었는데, 비록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세종대 학생들에게 강연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전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정승환 대표 인간관계와 나의 역할의 중요성 정승환 대표는 군대를 전역한 뒤 워커힐 호텔에서 프런트 직원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호텔 내에서 선후배 간의 가교 역할을 굉장히 잘했으며, 자신이 맡은 업무를 넘어 주변 동료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어떤 역할에 임할 때는 무슨 일을 처리하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지와 상관없이 분명히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 그럴 때 거만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업을 대하는 진정성과 책임감의 중요성 정승환 대표는 호텔에서 퇴사한 뒤 자기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초기 자본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이었고, 혼자 힘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트타임으로 현장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파트타임부터 슈퍼바이저 더 나아가 팀장까지 여러 일을 경험했다. 특히 그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도 마치 자신의 매장인 것처럼 열심히 일했다고 밝혔다. 매사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손님들이 자신을 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호칭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연습해야 언젠가 정말 사업을 했을 때 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을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사람들의 인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며 기회와 역할 또한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정승환 대표가 질의응답하고 있다.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는 힘의 중요성 정승환 대표는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사업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 보니, 기회가 하나둘씩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 대표는 회사 대표들이 자신과 같이 사람의 평소 행실을 보고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현재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미래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시대 흐름을 언급하며, 학생들 스스로가 빠른 수익을 만들고 싶은 요구가 있고 창업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하며 강연을 마쳤다. 취재/ 문준호 홍보기자(mjh30279@naver.com) 다음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케어닥 장지호 전무이사, 강연 진행 이전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오롤리데이 박신후 대표, 강연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세종특강 세종특강 [창업과 기업가 정신1] 오롤리데이 박신후 대표, 강연 진행 2025-05-22 hit 69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롤리데이(Oh, Lolly Day!)’의 박신후 대표가 지난 5월 14일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작은 브랜드가 10년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생존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서 박 대표는 10년 넘게 브랜드를 지속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브랜드의 생존 전략과 팬덤 마케팅, 그리고 건강한 조직문화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박신후 대표 진심으로 설득하는 작은 브랜드의 생존 전략 박신후 대표는 작은 브랜드가 대형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브랜드 초창기, 대형 광고비 경쟁 대신 제품의 완성도와 고객 경험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저렴한 가격대의 문구 제품이라도 포장에 정성을 더해 선물처럼 전달하고,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사용법과 의도를 담아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방식 등의 진심 어린 운영 방식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브랜드에 대한 공감과 이야기를 형성하게 했으며, 오롤리데이가 1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고 전했다. 숫자보다 밀도에 집중한 ‘찐팬’ 마케팅 박 대표는 2020년 인스타그램 계정 해킹 사건이 브랜드 운영 방식에 대한 반성과 전환점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기존의 공지형 게시물 위주 운영에서 벗어나, 이후 오롤리데이의 새 계정은 브랜드 철학과 제작 과정, 대표 개인의 고민까지 공유하는 소통의 창으로 바뀌었다. 그는 브랜드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찐팬’이라 불리는 진성 고객층이 생겨났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브랜드를 응원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존재가 되었다고 전했다. SNS 외에도 유튜브, 뉴스레터, 오프라인 매장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점을 강조하며, 숫자보다 밀도가 중요한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신후 대표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조직이 지속가능성을 만든다 박 대표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 운영을 위해서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롤리데이는 ‘행복을 파는 브랜드’라는 미션 아래, 실수와 고민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문화를 조성해왔으며, 구성원 각자가 성찰할 수 있는 리포트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는 이력서보다 ‘당신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가치관과 태도를 중시하며, 결국 브랜드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기에, 구성원 간의 신뢰와 유대가 브랜드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진심이 담긴 목표 설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 브랜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출발하며, 결국 그 진심이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취재/ 유재혁 홍보기자(db1345@naver.com) 다음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레드타이 정승환 대표, 강연 진행 이전글 [창업과 기업가 정신1] 메이코더스 최새미 대표, 강연 진행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연구 주요연구 원전 해체 발생 방사성 폐액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 소재 공정 개발 2023-07-24 hit 1162 원전 해체 발생 방사성 폐액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 소재 공정 개발 (Development of Eco-friendly Bio-material to Improve the Treatment Performance of Radioactive Liquid Waste from Decommissioning)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윤미용 교수 1. 서론 (Introduction) 전 세계적으로 영구 정지된 원전의 해체는 원전보유국으로서는 큰 국가적 목표이며, 국내에서는 현재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해체를 준비 중이다. 현재 전 세계 204기 영구정지 원전 중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4개국만이 해체를 완료한 경험이 있다. 해체 경험이 없는 한국은 소규모 원자력 시설(연구로 1·2호기, 우라늄변환시설) 및 운영 원전 대형 기기 교체(증기발생기, 원자로 압력관 및 원자로 헤드 교체) 경험을 통해 해체 기술을 확보 중이며, 계속해서 원전 해체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원전 해체 과정에서 대량의 방사성폐기물 발생, 막대한 해체 비용, 장기적 관리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준 및 발생량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해외 기술을 직접 도입하기보다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토의 면적 대비 인구가 많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증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현재 방사성 폐액 처리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온교환수지는 방사성 이온 물질로 포화가 되면 방사성 폐수지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2차 핵 폐기물이 양산 된다. 국내에서 겪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족 문제 때문에, 2차 핵폐기물 감용에 대한 관련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팀은 정부에서 주도 하는 원자력 에너지개발사업 일환으로 압타머를 적용한 폐액 처리 공정(그림 1)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보고된 연구에서 압타머가 특정 이온성 원소에 높은 선택성을 갖고 결합할 수 있다는 결과들과 본 연구팀이 코발트 및 니켈을 제거하는 압타머 기술을 바탕으로 압타머를 원자력분야에 적용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특정 표적 물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압타머 고유의 특징을 활용하여, 원전 해체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액 내 특정 원소를 제거 및 처리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림 1) 그리고 이를 방사성 폐액 처리에 활용함에 따라 액체 방사성폐기물 감용 및 처리비용 절감과 같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1) 압타머 기반 폐액 처리 공정 개요 2. 방사성물질 제어를 위한 방사성 금속 이온 특이적 압타머 발굴 압타머(Aptamer)는 “fitting”이라는 뜻을 가지는 라틴어 “aptus”와 그리스 접미사 “-mer”의 합성어로, 표적 분자에 친화적/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핵산(ssDNA, RNA)으로 구성된다. 즉, 압타머는 안정된 3차원 구조를 유지하면서 특정 분자에 특이적으로 강하게 결합한다는 특징을 지닌 친환경 바이오 소재이다. (그림 2) (그림 2) 친환경 바이오 소재 압타머 친환경 바이오 소재인 압타머는 그 고유 구조에 의해 표적 물질 별로 선택성을 가지고 결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방사성 폐액 내 특정 원소를 제거하기 위한 ‘친환경 바이오 소재 공정’을 개발하였다. 압타며 발굴을 위해 보편적으로 SELEX(Systematic evolution of ligands by exponential enrichment) 기술이 사용된다. SELEX 기술은 1990년 Larry Gold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해당 기술을 통해 무작위로 합성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라이브러리(oligonucleotide library: 서로 다른 종류의 수십 조개의 압터머가 포함 되어있음)로부터 표적 물질과 친화력을 가지는 소수의 압타머를 선별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저분자 화합물부터 고분자 단백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적 물질에 친화력을 가지고 결합할 수 있는 압타머를 발굴할 수 있다. SELEX 방법에서 이용되는 단일 가닥 압타머는 1015개 이상의 다양한 염기서열을 포함하며, 양 말단에는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위한 프라이머(primer) 서열이 존재하는 특징을 지닌다. 무작위로 만들어진 압타머 라이브러리(library)에는 방사성 금속 이온과 강한 결합력을 가진 소수의 압타머 후보군들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성 금속 이온과 결합한 후보군들은 결합하지 않은 개체들과 구별되어 PCR로 증폭되고, 이러한 과정이 6~15회 반복되어 선별된다 (그림 3). 이때 SELEX의 전반적인 속도는 표적 물질에 결합하고 있는 압타머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선별해낼 수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반복된 실험과정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면서 결합 친화도가 높은 압타머를 선별하는 것이 SELEX 기술의 핵심이다. (그림 3) SELEX(Systematic evolution of ligands by exponential enrichment)를 이용한 방사성 금속 이온 결합 압타머 발굴 위의 SELEX 방식을 통해 방사성 폐액에 존재하는 대표 핵종인 코발트(Co), 니켈(Ni), 망간(Mn) 이온에 대한 압타머를 발굴하였다. 각각의 표적 이온과의 결합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SPR(Surface Plasmon Resonance)로 결합 친화도(Kd value)를 측정한 결과, 10-9(nM)의 높은 결합력을 확인하였다. (표 1) (표1) 발굴된 방사성 이온 압타머의 결합 친화도 3. 방사성물질 제어를 위한 압타머 구조분석 및 최적화 발굴한 방사성 이온 특이적 압타머의 효율성과 생산 단가 절감을 위해 압타머 서열 분석 및 압타머를 고정할 비드와의 결합 비율 최적화 단계를 수행하였다. 우선, SELEX를 통해 획득한 압타머의 금속 이온과 결합하는 부위 및 압타머 안정화에 관여하는 부위 등을 예측하기 위해 핵산 구조 분석 프로그램(m-fold/NUPACK)을 이용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압타머의 주요 부위 혹은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돌연변이(mutation) 혹은 제거(deletion) 등의 방식으로 변이를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압타머 2차 구조 변화 여부를 예측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표적 이온과 결합하는데 기여하는 결합 부위 서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깁스 자유 에너지(Gibbs free energy; ∆G) 값이 낮을수록 압타머 구조가 안정적이므로, 압타머의 2차구조 및 결합 부위 서열을 유지하면서 더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최적의 서열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산 단가 절감을 위해 결합 부위 서열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압타머 서열 만을 남기는 크롤링(crawling-염기 서열을 끝에서부터 일정하게 제거하면서 구조 변화를 검증) 방식을 통해 서열을 최적화 하였다. (그림 4) (그림 4) 구조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압타머 구조 분석 및 서열 최적화 최적화된 압타머 서열 획득한 후, 압타머를 고정할 비드와의 최적 결합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하나의 비드에 압타머 10개가 최대치로 결합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산술적으로 최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압타머 개수를 1개부터 조금씩 양을 늘려서 언제 압타머 개수가 최대치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압타머에 형광을 붙인 상태에서 위의 실험을 수행한다면, 압타머 개수가 10개에 도달했을 때 형광 값이 가장 밝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10개 이상이면 더 이상 밝기가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값을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압타머를 최대치로 붙이는 것이 최선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압타머의 밀도가 높은 경우, 오히려 서로 금속 이온 결합에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팀은 압타머를 비드에 최대치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금속과 결합하는 비드/압타머 비율을 결정하는 실험을 별도로 수행하였다. 기존 방법(형광 현미경 혹은 형광측정기)으로는 압타머/비드 효율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는 데 반해, 본 연구팀은 새로운 방식을 접목시켜 쉽고 빠르게 압타머/비드 비율 최적화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5A에서 보듯이, Flow cytometry(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하여 형광이 부착된 압타머와 비드 복합체를 분석하면 실험에 사용된 모든 압타머/비드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샘플의 질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림 5A, B). 나아가, 이와 같이 새로 접목된 실험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 방식(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유세포분석기 결과를 검증하였다. 그림 5를 통해 서로 다른 실험 방식에서 유사한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A, C, D). (그림 5) 유세포 분석기(A-C)와 형광 현미경(D)을 이용한 압타머-비드 복합체 비율 결정 실험 결과 4. 최적화된 방사성 이온 압타머의 성능 평가 방사성물질 제어를 위한 금속 이온 압타머의 이온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타머의 이온 제거 성능과 제거한 이온을 다시 회수한 뒤 압타머를 재사용 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압타머의 성능 평가에는 금속 이온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를 사용하였다. (그림 6) (그림 6) ICP-OES를 통한 압타머 성능 평가 (제거율 및 수거율) 본 연구팀은 코발트, 니켈, 망간, 유로피움 등의 원소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압타머를 다수 발굴하였다. 이렇게 발굴한 코발트, 니켈, 망간에 특이 결합하는 압타머를 비드에 각각 고정시킨 후 각각의 표적 이온을 대상으로 이온 제거율 및 제거한 이온 수거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에서 코발트, 니켈, 망간 압타머 모두 99% 이상의 표적 이온 제거율이 보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7A).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운용 중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방사성 금속이온 제거용 이온교환수지의 경우 방사성 금속이온으로 포화가 되면, 이를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2차 핵폐기물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국내 핵폐기물장의 부지 선정의 지연으로, 이러한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원자력분야의 최대 골칫거리로 자리잡고 있다. 이온교환수지에서 방사능 금속 이온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 또한 황산 등의 강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2차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강산과 섞여 있는 방사성 물질의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에는 방사능 물질로 포화된 이온교환수지를 핵폐기물장에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2차 핵 폐기물 감용 기술 개발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팀이 개발한 압타머/비드 컬럼을 사용했을 경우 컬럼에 결합되어 있는 방사성 금속 이온을 쉽게 분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컬럼을 이용한 결과, 그림 7B에서 보듯이 분리된 금속 이온이 99.96% 이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이는 기술력이 수거율 100%에 이를 정도로 발전 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7) 압타머의 표적 이온 (A) Removal rate(제거율) 및 (B) Recovery rate(수거율)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압타머로 포집한 방사성 금속 이온을 거의 100%에 가까운 수거율로 회수 할 수 있다는 것은, 압타머/비드 컬럼 내에 방사성 금속 이온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는 제품을 다시 재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을 재사용 한다는 것은 유지 비용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과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압타머/비드 컬럼의 재사용 검증 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림 8). 그림에서 보이듯이 20회 정도의 반복적인 재사용에도 95% 이상의 코발트 이온의 제거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재사용 회수를 늘려 제거율 측정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8) 압타머의 재사용 횟수에 따른 제거율 압타머는 기본 구조에 음성을 띠고 있어 양이온과의 결합이 쉽게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팀이 개발한 압타머가 표적 이온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실험을 진행 하기 위해 9가지 이온 혼합 샘플을 압타머 기반 컬럼으로 처리하고, 처리 전과 후의 농도를 측정하여 제거율을 평가하였다. 코발트/니켈/망간 특이적 압타머 혼합 컬럼의 경우 대상 이온에 대해 70~85% 정도의 높은 제거율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압타머가 대상 금속 이온에 대해 높은 선택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9) (그림 9) 다표적(코발트, 니켈, 망간 압타머) 컬럼의 표적 이온 선택성 검증 5. 현장 시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본 연구팀이 개발한 압타머들이 높은 선택성으로 표적 방사성 이온을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실험실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샘플들은 대상 방사성 이온만 존재하게끔 만든 인위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 샘플을 이용한 검증이 필요하였다. 실제 방사성 조건에서도 압타머를 이용한 제거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 된 현장 시험은 크게 두 곳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였다. 한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물질 포함 시료를 대상으로 현장 시험을 수행하였고, 다른 한 곳은 영광 한빛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1차 계통수를 대상으로 현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독립된 실험 두 곳에서 방사성 이온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0).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험한 경우 실험실 조건과 동일하게 99%의 방사성 코발트와 니켈 금속 이온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빛원자력발전소 역시 다양한 방사성 금속 이온이 샘플 내에 존재하였지만, 90%의 방사성 코발트와 망간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 방사성 조건에서 압타머 성능평가를 위한 현장 시험 6. 결론 및 전망 (Conclusion and outlook) 본 연구는 의료 및 산업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압타머를 원자력 분야에 도입하여 방사성 폐액에 존재하는 이온성 원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신규 공정을 개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특히 본 연구팀이 개발한 압타머/비드 컬럼은 방사성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을 90% 넘는 높은 효율로 제거 하였기 때문에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표적 물질 특이적 압타머 기술을 활용한 방사성 폐액 처리용 압타머 컬럼은 표적 방사성 이온에 결합력이 특히 강하므로, 이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폐액의 특성 및 환경에 맞춰 처리 공정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팀은 압타머 개발 시 표적 이온과의 결합 예측 부위 분석으로 결합에 관여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열은 제거함으로써 압타머의 생산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개발된 압타머는 표적 이온을 높은 선택성으로 포집하는 것이 가능하고, 포집된 이온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특히 개발한 압타머/비드 컬럼에 포집된 이온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 하여 추후 현장에 적용할 때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반복적인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현장에서 유지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사용자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존 방사성 이온 제거 방식인 이온교환수지의 경우 방사성 물질로 포화가 되면 2차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되어 왔지만, 본 연구팀이 개발한 압타머/비드 컬럼의 경우 2차 방사성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 중 원자력발전소 및 발전소 해체 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 양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험실 규모의 저용량 규모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실제 원전 해체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원전 해체 환경 혹은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하여 방사성 폐액 양의 증가, 컬럼에 유입되는 폐액 유압 및 유속 등이 압타머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이 추가로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압타머를 이용하여 방사성 이온을 제거 하는 기술은 국내외 유일하기 때문에 추가 연구를 통해 방사성 폐액 처리 기술 및 공정 개발이 완벽하게 이뤄지면 관련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기술은 해체 발생 폐액 외에도 특정 금속 이온을 제거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높은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 본 기술은 특정 원소를 제거 및 회수 한다는 점에서 타 기술들과 차별화되므로 원천기술의 고도화를 통하여 미래 환경분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래드코어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김송현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되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참고문헌 1. 압타머 활용 해체 원전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량 예측 및 저감 방안 도출. 방사선산업학회지 2022, vol. 16, no.4, pp.497-503. 2. RNA 앱타머 (Aptamer): 간단한 원리부터 복잡한 응용까지. 분자세포생물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7년 3월 p. 23-29. 3. Sun Young Lee, Dae Hyuk Jang, Hyuncheol Kim and Miyong Yun. 2023. Removal and isolation of radioactive cobalt using DNA aptamers. Radiochimica Acta. 2022-0112. 4. Sekhon, S. S., Lee, S. H., Lee, K. A., Min, J., Lee, B. T., Kim, K. W., Ahn, J. Y., Kim, Y. H. Defining the copper binding aptamotif and aptamer integrated recovery platform (AIRP). Nanoscale 2017, 9, 2883–2894. 5. Eilers A, Witt S and Walter J. 2020. Aptamer-Modified Nanoparticles in Medical Applications. Adv. Biochem. Eng. Biotechnol. 174:161-193. 6. Tuerk C and Gold L. 1990. Systematic evolution of ligands by exponential enrichment: RNA ligands to bacteriophage T4 DNA polymerase. Science 249(4968):505-510. 7. Hofmann HP, Limmer S, Hornung V and Sprinzl M. 1997. Ni2+-binding RNA motifs with an asymmetric purine-rich internal loop and a G-A base pair. RNA 3(11):1289-1300. 8. Rajendran M and Ellington AD. 2008. Selection of fluorescent aptamer beacons that light up in the presence of zinc. Anal. Bioanal. Chem. 390(4):1067-1075. 다음글 Low-acceleration catastrophe of gravity from Gaia observations of wide binary stars: dawn of a new scientific revolution 이전글 초실감 메타버스를 위한 궁극의 3D 오디오 기술: 사운드 트레이싱 (Sound tracing)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연구 주요연구 Low-acceleration catastrophe of gravity from Gaia observations of wide binary stars: dawn of a new scientific revolution 2023-07-24 hit 2083 Low-acceleration catastrophe of gravity from Gaia observations of wide binary stars: dawn of a new scientific revolution Department of Phsics & Astronomy, Sejong University Prof. Kyu-Hyun Chae A new study reports conclusive evidence for the breakdown of standard gravity in the low acceleration limit from a verifiable analysis of the orbital motions of long-period, widely separated, binary stars, usually referred to as wide binaries in astronomy and astrophysics. The study carried out by Kyu-Hyun Chae, professor of physics and astronomy at Sejong University in Seoul, used up to 26,500 wide binaries within 650 light years (LY) observed by European Space Agency’s Gaia space telescope. ▲Left: A binary star system with a nested inner binary (credit: Wikipedia). Right: Gravitational anomaly at low acceleration observed in 20,000 wide binaries (credit: Kyu-Hyun Chae) For a key improvement over other studies Chae’s study focused on calculating gravitational accelerations experienced by binary stars as a function of their separation or, equivalently the orbital period, by a Monte Carlo deprojection of observed sky-projected motions to the three-dimensional space. Chae explains on this point, “From the start it seemed clear to me that gravity could be most directly and efficiently tested by calculating accelerations because gravitational field itself is an acceleration. My recent research experiences with galactic rotation curves led me to this idea. Galactic disks and wide binaries share some similarity in their orbits, though wide binaries follow highly elongated orbits while hydrogen gas particles in a galactic disk follow nearly circular orbits.” Also, unlike other studies Chae calibrated the occurrence rate of hidden nested inner binaries at a benchmark acceleration as shown in the Figure. The study finds that when two stars orbit around with each other with accelerations lower than about one nanometer per second squared start to deviate from the prediction by Newton’s universal law of gravitation and Einstein’s general relativity. For accelerations lower than about 0.1 nanometer per second squared, the observed acceleration is about 30 to 40 percent higher than the Newton-Einstein prediction. The significance is very high meeting the conventional criteria of 5 sigma for a scientific discovery. In a sample of 20,000 wide binaries within a distance limit of 650 LY two independent acceleration bins respectively show deviations of over 5 sigma significance in the same direction. Because the observed accelerations stronger than about 10 nanometer per second squared agree well with the Newton-Einstein prediction from the same analysis, the observed boost of accelerations at lower accelerations is a mystery. What is intriguing is that this breakdown of the Newton-Einstein theory at accelerations weaker than about one nanometer per second squared was suggested 40 years ago by theoretical physicist Mordehai Milgrom at the Weizmann Institute in Israel in a new theoretical framework called modified Newtonian dynamics (MOND) or Milgromian dynamics in current usage. Moreover, the boost factor of about 1.4 is correctly predicted by a MOND-type Lagrangian theory of gravity called AQUAL, proposed by Milgrom and the late physicist Jacob Bekenstein. What is remarkable is that the correct boost factor requires the external field effect from the Milky Way galaxy that is a unique prediction of MOND-type modified gravity. Thus, what the wide binary data show are not only the breakdown of Newtonian dynamics but also the manifestation of the external field effect of modified gravity. On the results, Chae says, “It seems impossible that a conspiracy or unknown systematic can cause these acceleration-dependent breakdown of the standard gravity in agreement with AQUAL. I have examined all possible systematics as described in the rather long paper. The results are genuine. I foresee that the results will be confirmed and refined with better and larger data in the future. I have also released all my codes for the sake of transparency and to serve any interested researchers.” Unlike galactic rotation curves in which the observed boosted accelerations can, in principle, be attributed to dark matter in the Newton-Einstein standard gravity, wide binary dynamics cannot be affected by it even if it existed. The standard gravity simply breaks down in the weak acceleration limit in accordance with the MOND framework. Implications of wide binary dynamics are profound in astrophysics, theoretical physics, and cosmology. Anomalies in Mercury’s orbits observed in the nineteenth century eventually led to Einstein’s general relativity. Now anomalies in wide binaries require a new theory extending general relativity to the low acceleration MOND limit. Despite all the successes of Newton’s gravity, general relativity is needed for relativistic gravitational phenomena such as black holes and gravitational waves. Likewise, despite all the successes of general relativity, a new theory is needed for MOND phenomena in the weak acceleration limit. The weak-acceleration catastrophe of gravity may have some similarity to the ultraviolet catastrophe of classical electrodynamics that led to quantum physics. Wide binary anomalies are a disaster to the standard gravity and cosmology that rely on dark matter and dark energy concepts. Because gravity follows MOND, a large amount of dark matter in galaxies (and even in the universe) are no longer needed. This is also a big surprise to Chae who, like typical scientists, “believed in” dark matter until a few years ago. A new revolution in physics seems now under way. On the present results and the future prospects, Milgrom says, “Chae’s finding is a result of a very involved analysis of cutting-edge data, which, as far as I can judge, he has performed very meticulously and carefully. But for such a far-reaching finding -- and it is indeed very far reaching -- we require confirmation by independent analyses, preferably with better future data. If this anomaly is confirmed as a breakdown of Newtonian dynamics, and especially if it indeed agrees with the most straightforward predictions of MOND, it will have enormous implications for astrophysics, cosmology, and for fundamental physics at large.“ Xavier Hernandez, professor at UNAM in Mexico who first suggested wide binary tests of gravity a decade ago, says, “It is exciting that the departure from Newtonian gravity that my group has claimed for some time has now been independently confirmed, and impressive that this departure has for the first time been correctly identified as accurately corresponding to a detailed MOND model. The unprecedented accuracy of the Gaia satellite, the large and meticulously selected sample Chae uses and his detailed analysis, make his results sufficiently robust to qualify as a discovery.” Pavel Kroupa, professor at Bonn University and at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has come to the same conclusions concerning the law of gravitation. He says, "With this test on wide binaries as well as our tests on open star clusters nearby the Sun, the data now compellingly imply that gravitation is Milgromian rather than Newtonian. The implications for all of astrophysics are immense." The finding was published in the 1 August 2023 issue of the Astrophysical Journal. Reference: https://iopscience.iop.org/article/10.3847/1538-4357/ace101 “Breakdown of the Newton–Einstein Standard Gravity at Low Acceleration in Internal Dynamics of Wide Binary Stars” (The Astrophysical Journal, 2023, Vol. 952, article ID 128) 다음글 기뢰 매몰률 예측에 대한 기술동향 및 발전방향 이전글 원전 해체 발생 방사성 폐액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 소재 공정 개발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연구 주요연구 초실감 메타버스를 위한 궁극의 3D 오디오 기술: 사운드 트레이싱 (Sound tracing) 2023-10-24 hit 1368 초실감 메타버스를 위한 궁극의 3D 오디오 기술: 사운드 트레이싱 (Sound tracing)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우찬 1. 서론 최근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용어가 산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주요하게 거론되는 키워드이다. 메타버스는 가상 혹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즉,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 가상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실제로 메타버스의 개념은 단순한 이론적인 존재를 넘어, 현재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그 활용 사례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IT 기업들이다. 많은 기업이 메타버스의 무한한 잠재력을 인지하며, 이를 중심으로 연구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몰입도와 현실감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요 연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시각적 연구를 넘어서 청각적 연구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현존하는 오디오 기술의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애플의 Vision Pro (왼쪽)과 메타의 Meta Quest3 (오른쪽) 기존의 오디오 기술은 메타버스에서 원하는 수준의 몰입도와 현실감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사용자 주위에 다양한 환경과 물리적인 특성들을 반영하기 어려워, 사용자들에게 초실감 오디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IT 기업이 초실감 오디오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애플은 메타버스와 유사한 개념인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을 위한 HMD(Head Mounted Display) 기기인 Vision Pro를 공개하였고 자사 제품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오디오 솔루션인 오디오 레이트레이싱(audio raytracing)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메타도 최근 혼합현실(Mixed Reality)을 위한 HMD로서 Meta Quest3를 발표하였고 해당 제품 또한 초실감 오디오를 강조하였다[1, 2]. 이처럼 메타버스의 성공은 단순히 시각적인 경험을 넘어서, 청각적인 경험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현실 세계의 모든 물리적인 특성과 상호작용을 디지털 환경에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사운드 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 최신의 IT 기기들이 초실감 오디오 기술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러한 트렌드의 반영이다. 본 기사에서는 오디오 기술의 동향과 최신 오디오 기술인 Geometric Acoustic (GA) 기반 사운드 트레이싱을 살펴보고,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저전력/고성능을 위한 사운드 트레이싱 하드웨어를 소개한다. 2. 오디오 기술 동향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오디오 기술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멀티채널 오디오 (Multi-channel audio), HRTF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 사운드 렌더링 (Sound Rendering). [그림 2] 7.2 멀티채널 오디오 예시 (front left (FL), front right (FR), center (C), surround left (SL), surround right (SR), front presence L (FPL), front presence right (FPR), subwoofer (SW) * 2) [3] 멀티채널 오디오는 다양한 스피커들을 활용하여 청취자 주변에 입체적인 소리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5.1, 7.1 혹은 그 이상의 채널을 활용하여, 청취자는 실제 환경과 같은 소리의 방향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림 2] 참조). 영화관, 홈시어터 등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여 청취자에게 깊은 몰입감을 제공한다. Dolby나 Auro3D와 같은 오디오 전문 회사들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여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이 방식이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멀티채널 사운드를 경험하려면 특정 형식을 지원하는 스피커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그 설치를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둘째, 스피커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 사용자의 위치나 방향이 바뀜에 따라 소리를 다시 조절해야 한다. HRTF는 음원(sound source)의 방향에 따른 소리의 진폭(amplitude)을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인간의 귀와 머리의 형태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HRTF는 이런 특징을 이용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음원의 방향에 따른 소리의 감쇄 값(attenuation) 테이블이 필요하다. 이는 실제 무향실에서 스피커와 사람의 머리와 귀의 형태를 모방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방향에서의 주파수 대역별 감쇄 값을 측정하여 생성한다. [그림 3] HRTF 처리 방식의 예시 [그림 3]은 HRTF 처리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음원으로부터 귀까지의 방향이 정해지면, 방향에 따라서 주파수 대역별 감쇄 테이블로부터 감쇄 값을 가져온다. 그 후 음원 데이터와 감쇄 값의 콘볼루션 연산을 통해 최종 오디오를 생성한다. 해당 방식은 방향에 따른 감쇄를 주파수 대역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은 오디오 퀄리티를 제공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머리와 귀의 크기와 형태가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된 경험이 어렵고, 음원의 개수가 많아졌을 때 계산 복잡도가 올라가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방향에 특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소리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사운드 렌더링은 음원을 생성하는 음원 합성 단계, 소리의 파형을 모델링하는 사운드 전파 단계, 최종 오디오 시그널을 생성하는 사운드 생성 단계를 거쳐서 청취자 주위에 물리적인 소리 효과들을 계산하여 현실적인 소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즉, 청취자, 음원, 주변 환경(재질, 차폐, 방 크기 등)들과의 상호작용을 전부 고려하여서 현실과 같은 물리적인 소리가 만들어진다. 이 중 핵심 단계는 소리의 파형을 모델링하여서 청취자 주위에 물리적인 환경을 반영하게 해주는 사운드 전파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wave 기반 방식과 geometric acoustic (GA) 기반 방식으로 나뉜다. Wave 기반 방식은 2차 편미분 방정식(second-orde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이루어진 파동방정식을 풀면서 실제 소리 파형을 그대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는 매우 정확하게 현실과 같은 소리가 가능하지만 엄청난 컴퓨팅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실시간(real-time rates) 처리를 필요로 하는 메타버스와 같은 콘텐츠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반면에 GA 방식은 소리의 파동을 직접적으로 모델링하는 대신 ray, beam, frustum 등을 이용하여서 음원, 청취자, 그리고 씬의 기하학적 정보 (geometry information of scene) 사이에 유효한 경로(path)들을 찾는 것이다. 해당 경로들은 소리를 생성하기 위한 여러 매개변수(parameters)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소리의 방향, 소리의 속도, 소리의 딜레이, 차폐 여부, 주파수 밴드에 따른 감쇄 등이 있고 이들은 Impulse Response (IR)이라는 형태로 압축되어 저장된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최종적으로 스피커나 이어폰과 같은 end-point device에서 출력될 소리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GA 방식은 wave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대략적인(approximately) 방식이지만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하여서 메타버스와 같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 본 연구팀은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을 이용한 GA 기반 사운드 전파 방식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으며, 이를 사운드 트레이싱(sound + ray tracing = sound tracing)이라고 명명했다. 이하 본문에서는 사운드 전파를 사운드 트레이싱(혹은 sound tracing)이라고 표기한다. 3. Ray를 이용한 사운드 트레이싱 [그림 4] 시간에 따른 다양한 소리 효과들의 amplitude (direct sound, ER, LR) 사운드 트레이싱은 ray를 이용해 다양한 소리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그림4]는 시간에 따라서 소리 효과들(direct sound, early reflection (ER), late reverberation (LR))의 amplitude 특성을 보여준다. Direct sound는 음원으로부터 청취자까지 직접 오는 소리이며 음원과 청취자 사이에 방향과 거리에 따른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다른 효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amplitude도 매우 크다. ER은 직접음이 도착한 이후에 들어오는 반사음(echo)이며, 일반적으로 직접음 ~ 60ms의 사이의 딜레이를 충족하는 반사음들로 ER이 정의된다. 이는 오브젝트들과의 반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amplitude를 가지지만 direct sound의 amplitude를 보강할 수 있고 소리를 좀 더 명료해지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LR은 잔향음 (2차 반사음)으로 초기반사음 이후에 들어오는 반사음들을 의미한다. 현실에서 콘서트홀이나 연주회장 같은 곳에서 울림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소리가 바로 잔향음이다. 이는 소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청취자에게 주변 공간의 크기, 재질, 반사율 등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소리 효과들이 생성되어야만 현실과 유사한 소리를 생성해 낼 수 있는데, 이들은 ray를 이용한 사운드 트레이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레이 트레이싱과 매우 유사하다. 레이 트레이싱은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발사되어 다양한 객체와 상호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반사되어 오는 빛의 색상을 계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운드 트레이싱은 음원으로부터 발사되는 ray(소리)가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우리 귀로 들어오게 되는 소리를 찾는 것이다. [그림 5] 사운드 트레이싱 path의 종류 [그림 6] 사운드 트레이싱 SW 모바일 데모 사운드 트레이싱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수 개의 음원의 위치에서 ray를 슈팅하고 청취자 위치에서 ray를 슈팅한다. 슈팅 된 각각의 ray는 자신과 hit 된 primitive(예, triangle)를 찾고, hit 된 primitive에 대하여 반사, 투과, 회절에 해당하는 ray를 생성한다. 이와 같은 처리는 ray의 생성, 탐색, 충돌검사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과정이 재귀적(recursive)으로 수행되면서 사운드 트레이싱 path의 IR과 잔향의 IR를 만든다. 음원(혹은 청취자)에서 슈팅 된 ray가 청취자(혹은 음원)와 만나게 될 수 있으며, 만나게 되는 path를 사운드 트레이싱 path라고 한다. 이는 결국 음원(혹은 청취자) 위치에서 출발한 sound가 그림 5와 6과 같이 반사, 투과, 흡수, 회절 등을 거쳐서 청취자(혹은 음원)에 도착하는 유효한 path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운드 트레이싱 paths를 기반하여 IRs들이 계산된다. 사운드 트레이싱은 잔향을 생성하기 위한 모델로서 Eyring model[4]을 이용하는데, 이는 음원의 intensity가 얼마나 떨어져야 하고 얼마 동안 잔향이 생성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Eyring model을 사용하기 위해선 필요한 몇 가지 매개변수들을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공간의 넓이와 부피, 표면의 평균 흡수 계수 등이 있다. 이러한 매개변수들을 구하기 위해 음원과 청취자로부터 슈팅되어 hit 된 primitive들이 이용된다. 계산된 매개변수들은 IR로 압축되어 저장된다. 최종 오디오는 사운드 트레이싱 paths로 생성된 IRs과 잔향의 IRs을 이용하여서 생성되어 스피커나 헤드셋을 통해 출력된다. 사운드 트레이싱은 초실감 메타버스에 적합한 오디오 기술이지만 몇 가지 단점들이 있다. 첫째, 많은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다른 중요한 작업들(예, 그래픽 프로세싱)에게 영향을 미치면 애플리케이션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너무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 소비 전력이 크다면 모바일 같은 환경에선 쓰로틀링¹ (throttling) 현상이 생기고 이는 성능 저하로 직결된다. 마지막으로, 음원의 개수가 많아졌을 때 사운드 트레이싱의 컴퓨팅 복잡도가 올라가서 실시간 처리를 위한 성능(예, 30 FPS or 60 FPS)까지 나오지 않는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운드 트레이싱을 가속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하드웨어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저전력/고성능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fully dynamic scene²까지 지원하여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오디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¹쓰로틀링(throttling): CPU나 GPU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클록과 전압을 강제적으로 낮추거나 전원을 꺼서 발열을 줄이는 기능. ²다이나믹 씬(dynamic scene): 시간에 따라서 혹은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반응하여 변환하는 객체들을 포함하는 환경. 4. 본 연구팀의 사운드 트레이싱 하드웨어 사운드 트레이싱 하드웨어는 ray tracing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의 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사례가 없다. 본 연구팀은 20여 년간 레이 트레이싱 하드웨어에 대한 연구개발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운드 트레이싱 하드웨어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6, 7]. [그림7]은 사운드 트레이싱 IP³가 구현되어 있는 Xilinx 보드, Host(예, PC, mobile device), 그리고 Xilinx 보드와 Host를 통신하기 위한 FMC 보드를 보여준다. 사운드 트레이싱 하드웨어는 호스트로부터 USB3.0을 통해 geometry data, 음원 데이터, 가속 구조체⁴ 정보 등을 받고 나서 하드웨어 시작 신호를 받으면 사운드 트레이싱 처리를 담당하는 sound tracing unit이 시작된다. [그림 7] Sound tracing 하드웨어는 sound tracing IP가 들어가 있는 Xilinx Virtex Ultrascale과 호스트와 연결하기 위한 FMC 보드로 구성되어 있고 USB 3.0을 통해 호스트 데이터를 주고받음. [그림 8] 본 연구팀이 설계한 sound tracing unit의 전체 아키텍처 [그림8]은 본 연구팀이 설계한 sound tracing unit의 전체 아키텍처를 보여준다. 이는 ray processing과 sound processing으로 나뉜다. Ray processing은 레이 트레이싱을 담당하는 units 들로 ray의 생성, 탐색, 교차 테스트 등을 담당한다. 반면에, sound processing은 소리를 생성할 수 있는 유효한 경로들을 찾는 units 들로 ray processing에 의해 찾아진 primitive들이 어떤 타입(반사, 회절 등)의 paths를 생성할 수 있는지, 유효한 경로들인지에 대한 검증, 찾아진 유효한 경로들에 대한 IRs 계산 등을 수행한다. 표1. CPU 방식과 사운드 트레이싱 하드웨어 음원 개수별 성능 비교 본 연구팀은 사운드 트레이싱 FPGA(140MHz)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그래픽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Sibenik (79,000개 triangles, indoor) 씬에서 CPU (i9-10850k 3.6GHz) 가속 방식의 사운드 트레이싱과 비교하였다. 실험은 음원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사운드 트레이싱의 평균 frame time (처리 속도)을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운드 트레이싱 FPGA의 성능이 CPU 가속 방식보다 평균 3.85배 빠르게 처리되었다. 본 연구팀이 사운드 트레이싱 ASIC⁵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PPA (performance, power, area)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지표는 ASIC의 성능, 전력, 면적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본 연구팀은 해당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8nm 설계 공정과 디자인 컴파일러 툴을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운드 트레이싱 ASIC의 PPA는 900MHz 성능, 50mW 전력, 0.31mm² 사이즈를 보여주었다. ASIC의 성능은 FPGA 성능보다 약 6.42배 높아지는 것이고, ASIC의 전력은 i9-10850k(125W)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보이며, ASIC의 사이즈는 최근 모바일 AP의 사이즈가 100 mm²을 넘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운드 트레이싱이 성능, 전력 소모, 크기 면에서 우수성을 검증하였으며 초실감 메타버스를 위한 실시간 3D 오디오를 실현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³IP(Intellectual Property):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 설계와 관련된 지적 재산을 의미. ⁴가속구조체(Accleration Structure (AS)): 3D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할하여 트리 형태로 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ray와 객체들 간의 교차점을 효율적으로 찾게 도와줌. ⁵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특정 응용프로그램이나 기능을 위해 맞춤 설계된 직접 회로 (반도체). 5 결론 메타버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자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각적인 요소는 사용자 경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사운드 렌더링은 이러한 몰입도를 높이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오디오 처리 방식들은 몰입도를 높이는 한계가 있지만 사운드 렌더링은 높은 몰입도와 현실감을 가진 오디오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해당 방식은 높은 계산 비용을 수반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친 레이 트레이싱 하드웨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고성능 사운드 트레이싱 하드웨어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 하드웨어는 기존 CPU 방식보다 평균 3.85배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주며, 성능, 전력 소모, 크기 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 특히, 사운드 트레이싱 ASIC의 성능은 FPGA보다 약 6.42배 높아, 초실감 메타버스 환경에서 실시간 오디오를 제공하는 데 충분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팀의 사운드 트레이싱 하드웨어는 초실감형 메타버스와 같은 고성능 오디오 처리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연구팀의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욱더 현실적이고 몰입감 있는 메타버스 환경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1] https://www.wepc.com/tips/apple-audio-ray-tracing-explained/ [2] https://about.fb.com/news/2023/09/meet-meta-quest-3-mixed-reality-headset/ [3] https://manual.yamaha.com/av/18/rxv685/en-US/448935819.html [4] Carl F Eyring. 1930. Reverberation time in “dead” room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 2A (1930), 217–241. [5] https://www.anandtech.com/show/16983/the-apple-a15-soc-performance- review-faster-more-efficient/3 [6] Eunjae Kim, Sukwon Choi, Jiyoung Kim, Jae-ho Nah, Woonam Jung, Tae-hyeong Lee, Yeon-kug Moon, and Woo-chan Park, "An Architecture and Implementation of Real-Time Sound Propagation Hardware for Mobile Devices," SIGGRAPH ASIA, Accepted to appear. [7] Eunjae Kim, Sukwon Choi, Cheong Ghil Kim, and Woo-Chan Park, "Multi-Threaded Sound Propagation Algorithm to Improve Performance on Mobile Devices," Sensors, Vol. 23, No. 2, p. 973. Jan 2023. 다음글 원전 해체 발생 방사성 폐액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 소재 공정 개발 이전글 3D 프린팅 잉크와 줄기세포를 활용한 인공 심장 개발의 현황 (The Frontier of Artificial Cardiac Development Using 3D Printing Ink and Stem Cells)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연구 주요연구 3D 프린팅 잉크와 줄기세포를 활용한 인공 심장 개발의 현황 (The Frontier of Artificial Cardiac Development Using 3D Printing Ink and Stem Cells) 2024-01-23 hit 1306 3D 프린팅 잉크와 줄기세포를 활용한 인공 심장 개발의 현황 (The Frontier of Artificial Cardiac Development Using 3D Printing Ink and Stem Cells) 바이오융합공학전공 이길용 교수 1. 서론 (introduction) 3D 프린팅 기술은 최근 제조업, 건축, 항공우주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그 영향력은 매우 두드러지며, 맞춤형 의료 솔루션의 개발, 질병 진단 및 치료 방법의 혁신, 그리고 인공 장기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공 장기 개발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 특히 바이오프린팅 기술은 신체 조직과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3D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도래 되는 인공장기 제작은 장기 기증과 관련된 제약을 극복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D바이오프린팅은 생체 호환성이 높은 재료로 만들어진 바이오잉크를 사용하여 세포, 단백질 및 기타 생물학적 요소들을 층층이 쌓아 올려 실제 인체 조직과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이오잉크의 선택입니다. 바이오잉크는 세포의 생존과 성장, 그리고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인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기계적 특성도 가져야 합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은 다양한 자연적 또는 합성 재료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잉크를 실험하고 있으며, 이 잉크들은 세포를 지지하고, 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하며, 적절한 세포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3D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 장기 개발은 단순히 바이오잉크를 선택하고 인쇄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기술은 세포 생물학, 재료 과학, 기계 공학,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통합된 결과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세포를 적절한 위치에 정밀하게 배치하고, 생체 구조와 기능을 반영하여야 하며, 복잡한 인체 조직의 3차원 구조를 성공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설계와 계획, 그리고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인공 장기가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생체 호환성, 장기 기능성, 안전성 등 여러 면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장기의 생존 기간, 기능 유지, 면역 반응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임상 적용을 위해서는 장기의 장기간 생존과 기능을 검증하는 임상 시험, 그리고 규제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3D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 장기 개발은 매우 복잡하고 다학제적인 분야이며, 아직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의료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연구의 진전과 함께, 이 기술은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고, 맞춤형 의료 솔루션의 발전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D 프린팅 잉크를 활용한 인공장기 개발에서 줄기세포와 바이오잉크의 중요성은 상당하며, 이 두 요소는 현대 조직 공학과 장기 재생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igure 1. 3D 조직 바이오 프린팅을 위한 일반 적인 과정. 단계1. 바이오 프린팅된 조직의 디자인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손상된 조직과 그 환경의 이미징. 단계2. 생체 모방, 조직 자체 조립 및 미니 조직 빌딩 블록을 단독 또는 다양한 조합을 통한 조직 디자인. 단계3,4. 조직의 형태와 기능에 필수적인 생체재료와 세포의 선택. 일반적으로 해당 재료에는 합성 또는 자연 폴리머와 탈세포화 세포외기질이 포함됨. 단계 5. 이러한 구성 요소는 잉크젯, 마이크로 압출 또는 광경화 보조 프린터와 같은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과 통합되어 프린팅. 단계 6. 일부 조직은 이식 전에 성숙 기간이 필요하며, 대안적으로 3D 조직은 신약개발 및 개인화약물을 개발을 위한 체외 진단을 응용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1). 2. 줄기세포 (Stem cells) 세포 기반 인공 심장 제작에서 줄기세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재생 의학 및 조직 공학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심장 세포 유형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심장 조직의 복잡한 구조를 재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환자의 체세포로부터 유도된 iPSCs는 환자 특유의 유전적 및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작된 인공 심장이 환자의 신체와 더 잘 호환될 가능성을 높이고, 이식 후 거부 반응과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는 자가 복구 및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인공 심장 내에서의 세포 손상이나 기능 손실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는 인공 심장의 수명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과 결합하여, 줄기세포는 정밀하게 설계된 심장 조직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줄기세포가 적절한 구조와 환경에 배치되어 자라나며, 최종적으로 기능하는 심장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줄기세포로부터 유도된 심장 세포는 질병 모델을 구축하고 신약의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심장 질환의 병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유도 만능성 줄기세포(iPSCs)의 사용은 윤리적 논란이 적고, 환자 자신의 세포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어, 심장 조직 공학에 있어 선호되는 세포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관점에서 동물 모델은 다양한 질병의 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든 안전성 및 효능 매개변수는 사람 대상 첫 임상 시험 시작 전에 동물에서 계속 테스트됩니다. 하지만, 연구 및 약물 개발에서 동물 모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의 생리 및 병리 생리학 사이의 불일치는 임상 연구에서 80% 이상의 약물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모델은 인간 체계에 존재하는 복잡성이나 병리학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는 임상 성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아 발달 중에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조직 형태 생성의 패턴과 시기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쥐와 인간 사이의 줄기 세포 표면 마커 집합체의 차이는 세포 조직의 운동성과 증식에서 주요 차이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인간 모델 사용이 인간의 장애 대한 분자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밝히고 대상 치료법 개발에 있어 더 신뢰성 있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기능성 줄기세포(pluripotent stem cells, PSCs), 예를 들어 인간 내세포질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s, ESCs)와 유도만능성 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iPSCs)의 발견은 인간 다양한 장기의 형성과 선천성 및 성숙한 심장 질환의 기반을 연구하는데 혁명적인 도구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iPSC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더욱 정확한 질병 모델링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iPSC에서 유래된 다양한 세포(iPSC-CMs)와 유전체 편집 접근법을 사용하여 다수의 단일유전질 및 복잡한 병리학이 체외 (in-vitro)에서 연구되어, 질병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부분의 iPSC에서 유래한 세포 유형, 예를 들어 iPSC에서 유래된 내피세포(iPSC-ECs), iPSC에서 유래된 심장 섬유아세포(iPSC-CFs), 그리고 iPSC에서 유래된 평활근세포(iPSC-SMCs)의 사용은 심장 모델의 세포 다양성을 크게 풍부하게 하며, 성인 심장과 같은 특성의 생리학적 성숙과 재현이 가능합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 기반 인공 심장 제작은 여전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이며, 이 기술이 임상에 적용되기까지는 여러 과학적, 기술적, 규제적 장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엄청나며, 향후 심장 질환 치료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Figure 2 다기능성 줄기세포 (IPSC) 심장 세포로 유도하기 위한 세포 분화 방식. 특정 세포 형태 발생 및 그 정체성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은 발달 경로 (세포 신호)에 표시하였음. 대부분의 경우, 모든 심장 세포 하위 유형은 줄기세포에서 발생하는 중배엽내피 조상 세포(KDR [kinase insert domain receptor] 및 MESP1 [mesodermal posterior 1])에서 기원함. 이후 Wnt 조절은 심근세포(CMs), 내피를 생성하는 데 이르게 하며, 특정 심실의 근육세포 유형은 골 형성 단백질(BMP)과 레티노산(RA) 매개 NOTCH 신호 활성화를 통해 얻어지며, 평활근 세포와 주위 세포는 측판 중배엽(LPM)과 축배엽(PM)에서 발달함. 심장의 섬유아세포는 심장 외피와 중배엽 조상 세포에서 유래하며, APS는 전방 원시 줄기를 나타내며; ESC는 배아줄기세포; ETV2는 ets 변형 전사 인자 2; FGF는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 IFN은 인터페론; IL은 인터류킨; SAN은 방실결절; TPO는 혈소판 생성 인자; VEGF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나타냄 (2). 3. 바이오 잉크 (Bio-ink) 줄기세포 기반 3D 바이오 잉크 개발은 현대의 조직 공학과 재생 의학에서 가장 앞선 연구 분야입니다. 이 기술은 인간 조직과 장기를 모방하고 재생하는 데 필수적인, 혁신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포 기반 인공 심장 제작을 위한 바이오잉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바이오잉크는 세포를 특정 위치에 정밀하게 배치하고, 심장 조직의 복잡한 3차원 구조를 형성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는 심장의 다양한 기능적 영역을 모방하는 복잡한 조직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공하는 생체 호환성 환경은 세포의 생존, 성장, 분화를 촉진하여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심장 세포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이는 인공 심장의 전반적인 기능성과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바이오잉크는 인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인공 심장이 실제 심장과 유사한 기계적 강도와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계적 속성을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심장의 전기적 특성과 혈류 동력학을 모방하는 생물학적 신호를 제공하는 데도 중요하며, 이러한 멀티셀룰러 (multi-cellular) 시스템의 구축은 심장의 복잡한 기능을 더 정확하게 모방하며, 질병 모델링 및 약물 반응 테스트에도 사용될 수 있어, 심장 질환의 병리학적 특징을 모방하고 신약의 효능과 독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잉크의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은 심장 조직 공학의 중심에 서 있으며, 생체 호환성, 기계적 특성, 세포 지지 능력 등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잉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발전은 심장 질환 치료와 재생 의학에 중요한 진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의 의료 혁신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바이오잉크는 또한 다양한 세포 유형과 조직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적 구성과 물리적 특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심장의 복잡한 생리학적 및 기능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심장 조직의 다양한 부분, 예를 들어 심근, 심장 판막, 관상 동맥 등은 서로 다른 기계적 강성과 생물학적 신호가 필요하며, 바이오잉크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바이오잉크의 발전은 또한 체외에서의 심장 조직 배양과 관련된 기술적 도전을 극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세포가 적절하게 분화하고 성숙하여 실제 심장 조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잉크 내에서의 적절한 세포 배치, 영양 공급, 산소 전달 및 폐기물 제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바이오잉크의 개발은 심장 조직 공학의 성공에 결정적입니다. 바이오잉크는 세포 기반 인공 심장 제작에 있어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그 기능과 발전은 심장 조직의 성공적인 재현과 임상적 적용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은 향후 인공 심장 제작의 효율성과 효과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4. 3D 프린팅 및 잉크 기반 심장 조직 개발 (세종대학교-하버드대학교 공동연구) 심장 조직 내의 세포 내부 및 세포 간 조직은 조정된 전기기계적 결합과 심장의 효율적인 근육 수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조직된 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세포 외 기질(ECM) 단백질은 세포에 대한 위상적 및 생화학적 신호로 작용하며, 이는 조직 발달에 중요합니다. 이는 특히 심장에서 중요한데, 여기서 심장 조직의 계층적 조직이 필요하여 여기서는 흥분-수축 결합의 시공간 역학을 조절하고, 이로 인해 심장 주기가 발생합니다. 심장의 구조-기능 관계를 체외에서 재현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을 나타냅니다. 이는 세포 규모와 거시적 장기 수준에서 조직 자체 조직화를 통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심장 세포 조직을 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자들은 마이크로 접촉 인쇄, 광리소그래피, 방향성 동결 건조, 섬유 스피닝 및 마이크로 생리학적 칩 제작을 통해 생체 고분자와 하이드로젤을 공학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복잡한 기하학을 가진 조직을 생산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심장 기능을 완전히 복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3차원(3D) 기하학을 모방하는 장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첨가제 제조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3D 프린팅은 조직 모델을 공학하기 위해 점점 더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인쇄 전에 3D 구조를 쉽게 디자인하고 편집할 수 있게 하고, 유연한 바이오 재료 잉크의 조성으로 복잡한 3D 구조를 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위해, 하이드로젤 기반 잉크나 인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복합 노즐 시스템을 사용한 다재료 잉크 인쇄, 광경화성 하이드로젤 인쇄, 점증제 추가 또는 희생지지재료 인쇄 등 3D 안정성과 형태 충실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조직 자체 조직화와 정렬에 대한 제한된 통제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마이크로미터와 나노미터 규모에서 센티미터 규모로의 규모를 연결하여 공학적 심장 모델 내부의 세포 내부 및 세포 간 조직화를 유도하는 것은 기능성 장기 및 조직의 3D 프린팅에서 주요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세종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사전 제작된 미세 규모 섬유를 포함하는 3D 지지체를 인쇄하는 것이 심근세포가 심장 방을 형성하기 위해 자체 조직화할 수 있는 자기 지지형 지지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심장의 세포 외 기질(ECM) 네트워크에서 영감을 받아, 젤라틴 섬유를 젤라틴과 알지네이트(Gel-Alg) 하이드로젤 매트릭스에 주입하여 우리의 잉크를 설계했습니다 (그림 3).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와 탄소 나노튜브와 같이 이전에 잉크에서 사용된 것과는 달리, 세포외기질 중 하나인 피브로넥틴(Fibronection)이 코팅된 젤라틴 섬유는 매트릭스-세포 부착을 촉진하는 아르기닌-글리신-아스파트산(RGD) 펩타이드 결합 도메인을 포함합니다. 또한, 나노 미세 섬유를 하이드로젤에 포함함으로써 잉크의 유변학적 성질을 변경하여, 지지 구조나 재료 없이도 정확하고 복잡한 3D 지지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진은 위상적 및 화학적 신호를 정렬된 젤라틴 미세섬유의 형태로 통합함으로써, 이런 방식으로 인쇄된 3D 심실 지지체가 심근세포의 이방성 근육 조직으로의 자체 조직화를 촉진할 것 하였습니다 (그림3). Figure 3. 3D 프린트 된 조직 지지체에 대한 바이오 잉크. (a) 나노 섬유가 포함된 잉크 구성 요소 제작 방법. 파편화된 젤라틴 나노 섬유가 젤라틴-알지네이트 하이드로젤과 결합될 때 (빨강색은 세포외기질), 잉크 점도가 증가하며 고체 같은 행동을 나타내어, 계층적 구조를 가진 심실 지지체의 3D 프린팅을 가능함. (b) 3D 프린팅 도중에 나노 섬유 정렬은 3D 지지체에서 실제 ECM과 유사한 이방성 구조적 특징을 유도하여, 체내 심장 근육을 재현하기 위한 조직 정렬 및 조직화를 촉진. (c) 젤라틴 나노 섬유를 보여주는 주사 전자 현미경 이미지. 100 μm. (d) 바이오잉크에 나노 섬유가 포함되었을 떄 물성 비교. 나노 섬유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프린팅이 불가능 한 낮은 점도의 액체 같은 행동을 나타냄. (e) 바이오 잉크의 물성 테스트, 농도 의존적이고 변형 의존적인 전단 액화 행동 및 솔-젤 전환을 나타냄. (f) 3D 도넛 형태의 프린팅 테스트5 mm. (g) 3D 프린팅을 통한 심장의 왼쪽 심실의 원추형 모델. 2 mm. (h) 3D 프린팅을 통한 주변 방향으로 인쇄된 자기 지지식 이중 심실 챔버와 심장 판막 및 대각선 (30°) 으로 기울어진 왼쪽 심실. (i) 3d프린트된 심실 지지체의 마이크로 컴퓨터 단층촬영 이미지로, 3D 프린트된 형상에서의 섬유 구조를 나타냄, 1 mm. (j) 3D 프린트된 심실 지지체의 주사 전자 현미경 이미지로 인쇄 방향의 섬유 정렬을 나타냄, 200 μm. k, 5 와 8 wt% 나노 섬유를 가진 3D 프린트된 심실 지지체의 공초점 이미지에서 섬유 정렬 분석, 그리고 해당 섬유 방향 각도 분포 그래프; 0°는 인쇄 방향(dir.)을 나타냄, 100 μm. (3)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3D 프린팅 잉크를 활용한 줄기세포 기반 인공 심장 개발은 의학과 생명 공학의 중요한 전진 영역이며, 연구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집중을 요구 합니다. 첫째, 바이오잉크의 고도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심장 조직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더욱 정확하게 모방하기 위해, 바이오잉크의 생체 호환성, 기계적 특성, 생물학적 기능을 개선하는 연구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재료 과학, 생화학, 세포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새로운 소재와 기술을 탐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 세포 분화 및 조직화 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줄기세포가 특정 심장 세포 유형으로 효과적으로 분화하고 적절하게 조직화되어 실제 심장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포 생물학, 생체 공학, 조직 공학의 교차점에 있으며, 여러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실험 설계와 분석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셋째, 인공 심장의 통합 및 시스템화에 대한 연구가 중요합니다. 심장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모방하고 실제 생리적 조건에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세포 유형, 신호 전달 경로, 그리고 기계적 구조를 포함하는 완전한 인공 심장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인공 심장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상적 적용 전에 필수적인 단계로, 잠재적인 부작용, 거부 반응, 장기간 기능 유지 등을 포함합니다. 임상 연구, 생물 통계학, 의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섯째, 줄기세포 기반 인공 심장 개발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규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학제간 협력과 깊은 윤리적 고민을 요구하는 분야로, 사회적,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화된 치료법으로의 확장에 대한 연구를 강조해야 합니다. 각 환자의 유전적 및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심장 질환의 특성에 더 잘 맞는 맞춤형 인공 심장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밀 의료의 전망을 향상시키고, 환자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방향들은 줄기세포 기반 인공 심장 개발의 효과적인 진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여러분의 지식, 기술, 창의력을 발휘하여 심장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혁명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은 해당 연구와 혁신이 이 분야에서 집중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중요한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1. S. V. Murphy, A. Atala, 3D bioprinting of tissues and organs. Nat Biotechnol 32, 773-785 (2014). 2. D. Thomas, S. Choi, C. Alamana, K. K. Parker, J. C. Wu, Cellular and Engineered Organoids for Cardiovascular Models. Circ Res 130, 1780-1802 (2022). 3. S. Choi et al., Fibre-infused gel scaffolds guide cardiomyocyte alignment in 3D-printed ventricles. Nature Materials, (2023). 4. K. Y. Lee et al., An autonomously swimming biohybrid fish designed with human cardiac biophysics. Science 375, 639-647 (2022). 5. H. Chang et al., Recreating the hearts helical structure-function relationship with focused rotary jet spinning. Science 377, 180-185 (2022). 6. A. Lee et al., 3D bioprinting of collagen to rebuild components of the human heart. Science 365, 482-487 (2019). 7. S. J. Park et al., Insights Into the Pathogenesis of Catecholaminergic Poly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 From Engineered Human Heart Tissue. Circulation 140, 390-404 (2019). 다음글 초실감 메타버스를 위한 궁극의 3D 오디오 기술: 사운드 트레이싱 (Sound tracing) 이전글 장주기 쌍성에서 발견된 뉴턴-아인슈타인 표준중력의 붕괴: 천체물리와 우주론에서의 과학혁명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연구 주요연구 장주기 쌍성에서 발견된 뉴턴-아인슈타인 표준중력의 붕괴: 천체물리와 우주론에서의 과학혁명 2024-04-05 hit 1297 장주기 쌍성에서 발견된 뉴턴-아인슈타인 표준중력의 붕괴: 천체물리와 우주론에서의 과학혁명 물리천문학과 채규현 교수 1. 서론 및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지금까지 관측되어온 우주는 중력 시스템들의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는 지구 자체 중력에 의하여 유지되며, 달은 지구와의 상호 중력에 의하여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행성 및 그 외 태양계 천체는 태양 중력의 지배적 영향 하에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 태양 및 수천억 개의 별들은 우리은하의 모든 구성 요소들의 총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각자 자신의 궤도를 따라서 공전한다. 우리은하와 그 외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들은 광활한 우주 속에 존재한다. 일부 은하들은 은하군 또는 은하단 속에서 중력적으로 서로 상호 작용한다. 우주의 팽창 동역학(expansion dynamics) 또한 중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중력의 성질은 태양계 내 행성 운동들의 경험적 수학 법칙을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행성 운동들의 실증적 수학 법칙은 요하네스 케플러가 티코 브라헤(Tyco Brahe)가 평생을 바쳐 축척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1609-1619년 기간 동안 발견하였다. 케플러의 법칙은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이 법칙은 매우 간단한데, 임의의 두 질량 요소가 두 요소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뉴턴의 중력은 지구와 태양계, 심지어 우주 전체의 모든 중력 역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에는 은하들과 우주 팽창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강한 중력에서의 중력 변칙: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도래 19세기에 위르뱅 르 베리에(Urbain Le Verrier) 및 여러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움직임을 연구하였다. 1859년 르 베리에는 태양 주변을 도는 수성 궤도의 세차(precession) 운동이 뉴턴의 태양 중력과 알려진 행성들에 의하여 가해지는 섭동(perturbations)들에 의하여 완벽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중력 변칙은 (천왕성 궤도의 변칙은 해왕성 발견에 의하여 설명됨) 실제였으며 상대적으로 강한 중력에서 뉴턴의 중력이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중력 변칙은 결국 아인슈타인의 새 중력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졌고, 이는 아인슈타인의 역학 및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인 특수 상대성 이론과 모순이 없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5년에 완성되었으며 그 이후로 중력에 대한 표준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가속도가 약할 때, 즉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느린 비상대론적 한계에서 뉴턴의 중력 법칙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우주의 비상대론적 중력 역학에 관한 한 뉴턴의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동일한 예측을 한다. 이와 같이 비상대론 영역에서 뉴턴-아인슈타인 표준 중력은 행성 운동, 은하계, 그리고 은하단들의 역학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시공간 구조와 역학 그리고 블랙홀 및 중력파와 같은 현상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약한 중력에서의 중력 변칙: 암흑 물질 또는 MOND? 1933년 프리츠 츠비키(Fritz Zwicky)는 코마(머리털 자리) 은하단은 뉴턴-아인슈타인 표준 중력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은하들의 궤도 운동이 너무나 빨랐기 때문이다. 그는 표준 중력이 은하들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은하단의 변칙적인 중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암흑 물질을 뜻하는 독일 단어인 ‘dunkle Materie”를 처음으로 상정하였다. 1970년대에 베라 루빈(Vera Rubin)과 알베르트 보스마(Albert Bosma)를 포함한 천문학자들은 은하 중심으로부터 큰 반경까지의 은하 회전 곡선(galactic rotation curves )을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은하 회전 곡선은 약한 중력 또는 낮은 가속도에서 가장 명확하고 특이한 중력 변칙을 보였다 (그림 1). 중력 가속도가 제곱 초당 약 1nm(나노미터)보다 높을 경우 실질적인 중력 변칙은 없었다. 중력 변칙은 제곱 초당 약 1nm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반경이 커지면서 증가하다 거의 평평한 회전 곡선이 된다. 그림 1. 안드로메다 은하(M31)의 관찰된 회전 곡선은 은하의 바깥 부분에서의 명확한 중력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뉴턴의 예측한 곡선이 은하 바깥 부분에서 감소하는 동안 관찰된 회전 곡선은 거의 평평하다. (온라인에서 이미지 발췌) 제곱 초당 1nm보다 약한 중력은 표준 중력이 검증된 내부 태양계의 중력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 하지만, 약한 중력에서 표준 중력이 유지된다는 추정을 통해 눈에 보이는 은하들을 둘러싸는 암흑 물질 헤일로가 제시되었다. 암흑 물질 헤일로는 과학자들로부터 곧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는 두 명의 위대한 권위자들의 이론들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저가속 변칙(low-acceleration anomaly)을 제외하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태양계 내의 실험(solar system tests), 중력파 검출, 그리고 중성자 별과 블랙홀 관측을 통해 성공적으로 검증되었다. 일반 상대성이론에 기초한 표준 우주론은 암흑 물질을 가정하고 발전되었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CMB) 온도 비등방성과 관측된 은하 분포를 통해 밝혀진 우주의 거대 구조를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우주의 암흑물질의 양은 은하와 은하단을 담고 있는 암흑물질 헤일로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준 우주론은 최근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우주에서 측정된 허블 상수와 플랑크 위성이 관측한 CMB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반 상대성이론이 예측한 상수 간의 불일치,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견한 초기 시대의 은하들이 너무 거대하다는 것이다. 암흑 물질은 전자기 방출 또는 흡수를 통해 관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은 물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많은 먼지가 포함되어 빛을 흡수하여 검게 보이는 암흑 성운(dark nebulae)은 암흑 물질이 아니라 일반 중입자이다. 이론적으로 암흑 물질에 대한 후보 입자들은 충분히 제시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약한 상호 작용하는 무거운 입자(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s, WIMPs)들은 선호되는 후보들이었지만 현재 전세계에서 진행된 직접 탐사 실험을 통해 대부분 배제되었다. 초대칭 입자(Supersymmetric particles, SUSY)도 유망한 후보로 간주되었지만, 힉스 입자 발견 이후 CERN 실험을 통해 대부분 배제되었다. 물론 액시온, 미니 블랙홀, 초경량 보존 등 수많은 이론적 후보가 남아 있으며 암흑물질 탐색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암흑물질은 많은 과학자들이 선호하는 중력 변칙에 대한 해결책이지만, 뉴턴-아인슈타인 표준 중력이 낮은 가속도 한계에서 실험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때로 일부 과학자들은 중력렌즈와 같은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 암흑물질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암흑물질은 표준중력을 가정하여 추론되었기 때문에 순환 논법일 수밖에 없고, 암흑물질이 적정량 검출되는 경우에만 낮은 가속도 한계에서도 표준중력이 유효할 것이다. 실제로 모든 과학자들이 암흑 물질이 해결책이라는 것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다. 이미 1983년에 모르데하이 밀그롬(Mordehai Milgrom)은 은하의 특징적인 회전 곡선이 저가속 현상에서 뉴턴의 중력 역학(따라서 일반 상대성 이론도 포함)의 붕괴를 암시한다고 제시했다. 수정 뉴턴 역학(Newtonian dynamics, MOND)이라고 불리는 밀그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표준 중력이 제곱 초당 약 0.1nm(나노미터)인 가속 상수 a_0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약할 때 붕괴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밀그롬은 중력 이론에 새로운 상수를 도입하였다. 수정 뉴턴 역학에서 중력은 자유 낙하하는 중력 시스템의 내부 역학이 주변 시스템의 중력장이 일정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외부 중력장 효과(external field effect)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정 뉴턴 역학의 중력은 중력 역학이 주변 우주의 영향을 받는 다는 마하의 원리(Mach’s principle)를 따른다. 수정 뉴턴 역학은 암흑 물질을 포함시키지 않고도 은하의 관측된 회전 곡선을 설명할 수 있다. 수정 뉴턴 역학이 예측한 케플러 유사 법칙들을 중입자 툴리-피셔 관계, 지름 가속도 관계와 같은 은하 운동학에서 괸측 되었다. 또한, 최근 은하 회전 곡선의 바깥 부분 내에서 외부 중력장 효과(External field effect)가 포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찰들은 암흑 물질 지지자들로부터 저항받고 있는데, 이는 암흑 물질 헤일로가 수정 뉴턴 역학의 예측을 일정 수준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래에 정확한 고정밀 관측이 이뤄진다면 수정 뉴턴 역학과 암흑 물질 헤일로는 결국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4. 장주기 쌍성: 저가속에서 중력을 직접 검증하기 위한 자연 실험실 암흑 물질과 수정 뉴턴 역학을 구분하기 위해 은하를 사용하는 경우, 은하의 외부 부분이 엄청난 공간이기 때문이에 이 두 패러다임들의 중복되는 예측 내용들을 구별해야 한다. 2012년 자비에 헤르난데즈(Xavier Hernandez)와 그의 동료들은 낮은 가속도에서 중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장주기 쌍성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장주기 쌍성은 서로의 상호 중력에 따라 장기간 궤도에 따라 서로를 도는 중력적으로 결합된 쌍성을 의미한다. 전체 질량이 약 1 태양 질량인 일반적인 쌍성의 경우, 간격(또는 궤도 크기)가 수 킬로 천문 단위(kau)일 때 상호 중력은 밀그롬 상수의 약한 가속도에 도달한다. 표준 중력에 의해 예측되는 궤도에 둘러싸인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에 포함된 암흑 물질은 무시해도 될 정도이다. 그러므로 암흑 물질과 수정 뉴턴 역학의 영향을 구별할 필요 없이 중력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다. 유럽항공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의 가이아(Gaia) 우주 망원경은 우리은하에 있는 20억 개의 물체(주로 별)의 3D 지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별의 움직임을 추적해오고 있다. 가이아는 2016년부터 데이터를 공개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것은 데이터 릴리스 3(DR3)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세종대학교 채규현 교수는 중력에 민감한 세 가지 매개변수들을 고려하여 쌍성을 이용해 중력을 시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매개변수들은 하늘 평면에 투사된 관측된 2D 속도, 뉴턴 원형 속도로 정규화된 2D 속도, 그리고 관측된 2D 속도와 2D 간격을 몬테 카를로 방법에 의해서 삼차원의 실제 공간으로 역투영하여 통계적으로 재구성한 운동학적 가속도이다. 가이아의 쌍성에 대한 데이터의 질적 수준은 다양하다. 또한, 일부 쌍성들은 쌍성 중 하나 또는 둘 모두 주변에 위치한 관측되지 않은 별들이 있어 이들 주변에 맴돌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숨겨진 구성 요소가 있는 쌍성들을 다중 별 또는 계층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채 교수는 가장 높은 데이터 품질적 수준을 갖춘 순수한 쌍성 샘플로부터 계층 시스템이 포함된 좀 더 완화된 품질의 데이터가 포함된 10배 이상 더 큰 샘플까지 고려하였다. 계층 시스템이 포함된 샘플의 경우, 채 교수는 표준 중력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1 kau 이하의 간격을 가진 쌍성들을 이용하여 계층 시스템의 발생률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간격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쌍성이 선택되었고, 확인된 계층 시스템들은 이미 제거하였기 때문에 유효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숨겨진 동반자(companion)가 있을 확률은 간격과는 무관한데, 샘플 수집 기준에 의해서 이들의 측광학적, 측성학적 그리고 운동학적 특성들이 통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5. 결과 그림 2에서 엄격한 데이터 질적 요건에 따라 선택된 2463개의 순수 쌍성 샘플들에 대한 중력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곱 초당 약 1 nm보다 높은 가속도 또는 약 2 kau보다 작은 간격에서 관찰된 가속도 또는 속도는 뉴턴의 예측과 일치한다. 이는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인데 관측된 값들에 대한 그 어떠한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턴 역학은 제곱 초당 nm의 가속도 단위까지 관측된 양에 의해 자연스럽게 뒷받침된다. 그러나 제곱 초당 1 nm 또는 2 kau에서 관측된 가속도/속도는 뉴턴의 예측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약 5 kau보다 큰 간격의 경우 속도와 가속도가 약 20% 및 40-50%으로 각각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더 큰 간격들을 가진 쌍성들은 동일한 데이터 품질을 충족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증가치는 실제 중력 변칙을 나타낸다. 놀라운 점은 변칙적 행동의 정도와 특성이 제이콥 베켄스타인(Jacob Bekenstein)과 밀그롬(Milgrom)의 AQUAL 모델로 대표되는 수정 뉴턴 역학의 중력이 은하수의 외부 중력장 효과(external field effect)하에서의 일반적 예측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림 2. 통계적으로 숨겨진 추가 구성요소가 없는 2463개의 순수 쌍성들에 대한 중력 테스트 결과. 중력에 민감한 세 가지 매개변수들, 즉 몬테 카를로 재구성 운동 가속도, 관측된 하늘 평면 투영 상대 속도, 뉴턴 원형 속도로 정규화된 속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됨. 세 가지 경우 모두 관측된 값들은 해당 뉴턴 예측과 비교되었다. 낮은 가속도 및 더 큰 간격에서 중력 변칙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림 3은 계층 (고차 다중) 시스템들을 포함한 두 개의 일반 샘플들에 대한 가속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계층 시스템들 비율의 보정값이 표시되었다. 순수 쌍성 샘플들에 나타난 변칙 현상과 동일하게 관측된 중력은 제곱 초당 1nm에서 뉴턴의 예측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이상의 정도와 추세는 수정 뉴턴 역학의 중력 예측과 일치한다. 그림 3. 계층(다중 별) 시스템을 포함한 두 개의 일반 장주기 쌍성 샘플에 대해 몬테 카를로 재구성 운동 가속도를 사용한 중력 테스트 결과. 분해되지 않은 계층 시스템의 비율은 뉴턴 영역 내 높은 가속도에서 보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순수 쌍성 샘플의 테스트 결과와 일치하지만 표본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림 4는 두 개의 일반 샘플에 대해서 관측된 정규화된 속도를 정규화된 간격에 대한 관계로 나타낸다. 여기서 정규화된 간격 값 1은 가속도 값이 Milgrom 가속도와 같아짐을 나타낸다. 정규화된 간격의 값이 충분히 작을 시, 관측된 정규화된 속도는 뉴턴의 예측과 일치한다. 그러나 정규화된 속도는 정규화된 간격이 약 1에 도달할 때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한 다음, 두 샘플 모두에서 수정 뉴턴 역학의 중력 예측과 마찬가지로 평평해진다. 그림 4. 그림 3과 유사하지만 정규화된 속도가 사용된다. 뉴턴식 예측은 명확하게 배제되며, 밀그롬의 AQUAL 예측은 Gaia 데이터와 일치한다. 6. 시사점: 천체 물리학 및 우주론의 혁명 현재 은하와 은하단에서 발생하는 중력 변칙을 설명하는데 있어 암흑물질이 수정뉴턴역학과 경쟁하는데 이는 우주론적으로 추정되는 암흑물질 밀도가 적정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쟁은 장주기 쌍성에서 관측된 중력 변칙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중력 변칙은 표준 중력이 약한 가속도에서 붕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의미한다. 이는 암흑 물질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별개로 발생하는 것이다. 장주기 쌍성의 중력 변칙이 은하 회전 곡선에서와 동일한 가속도에서 관측된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 은하 회전 곡선에서의 변칙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되기 시작한 암흑 물질은 장주기 쌍성의 변칙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암흑 물질 패러다임 자체는 임기 웅변적 가정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집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암흑물질 입자의 탐지나 식별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물일 수 있다. AQUAL 및 QUMOND와 같은 수정 뉴턴 역학 중력 모델은 은하와 장주기 쌍성 내 중력 변칙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외부 중력장 효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은하와 장주기 쌍성의 변칙의 엄청난 크기 차이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수정 뉴턴 역학의 기본 원리인 표준 중력이 수정 뉴턴 역학의 가속도 상수를 통해 붕괴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수정 뉴턴 역학이 비표준(또는 수정) 중력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한다. 수정 뉴턴 역학이 천체 물리학과 우주론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영향에 못지 않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과 시공간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블랙홀 및 중력파와 같은 상대론적 현상으로 확장한 반면, 행성계, 항성계, 은하, 은하단과 같은 비상대론적 현상에서는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비상대론적 현상은 밀그롬 상수에 의해 설정된 수정 뉴턴 역학 영역에 도달할 때마다 밀그롬의 원리를 따르게 되고, 선형성과 중첩 원리를 잃게 되며, 외부 중력장 효과를 갖게 된다. 장주기 쌍성에서 볼 수 있듯이 밀그로미안 현상은 항성계, 은하계, 우주 자체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중력 역학은 가장 강한 중력부터 가장 약한 중력에 이르기까지 마하의 원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강한 중력 영역에서 마하의 중력 성질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비선형 이론으로 대표되며, 약한 중력 영역에서는 밀그롬의 이론으로 대표된다. 태양계 안쪽에서와 같이 “정상 중력”이라는 최적 지점에서만 뉴턴의 이론과 선형성이 유지되며 중력 역학은 마하의 원리를 망각하게 된다. 7. 향후 연구 및 전망 현재 밀그롬 중력에 대한 증거는 가이아 DR3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이아는 2026년 초에 DR4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아 DR4는 측성학적, 측광학적, 그리고 시선속도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 목록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장주기 쌍성 중력 테스트 결과의 통계값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장비를 통해서 잘 선별된 장주기 쌍성의 시선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하늘의 2D 속도보다 더 직접적인 중력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3D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스펙클 측광(speckle photometry)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현재까지 측광학적으로 분해 안 된 별들에 숨겨져 있는 추가별을 찾아내어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밀그롬 중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이미 얻어졌으므로, 수정 뉴턴 역학 패러다임의 이론적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수정 뉴턴 역학에 기반한 우주론은 로버트 샌더스(Robert Sanders)의 선구적인 연구를 따라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넘어서는 상대론적 이론들의 이론적 발전과 함께 올바른 수정 뉴턴 역학 현상학에 근거하여 이뤄져야 한다. 근본적인 기본 이론에 대한 탐구는 상대론 영역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매우 약한 가속도에서의 수정 뉴턴 역학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 이론은 중력의 양자물리학을 성공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1. F. Zwicky 1933 Helvetica Physica Acta (in German) 6 110–127 "Die Rotverschiebung von extragalaktischen Nebeln" [The red shift of extragalactic nebulae] 2. V. Rubin, W. K. Jr. Ford 1970 Astrophysical Journal 159 379 "Rotation of the Andromeda Nebula from a Spectroscopic Survey of Emission Regions" 3. A. Bosma 1978 Ph.D. thesis “The Distribution and Kinematics of Neutral Hydrogen in Spiral Galaxies of Various Morphological Types” (Rijksuniversiteit Groningen) 4. M. Milgrom 1983 Astrophysical Journal 270 365 "A modification of the Newtonian dynamics as a possible alternative to the hidden mass hypothesis” 5. S. S. McGaugh, J. M. Schombert, G. D. Bothun, and W. J. G. de Blok 2000 Astrophysical Journal 533 L99 “The Baryonic Tully-Fisher Relation” 6. Stacy S. McGaugh, Federico Lelli, and James M. Schombert 2016 Phys. Rev. Lett. 117, 201101 “Radial Acceleration Relation in Rotationally Supported Galaxies” 7. Kyu-Hyun Chae, Federico Lelli, Harry Desmond, Stacy S. McGaugh, Pengfei Li, and James M. Schombert 2020 Astrophysical Journal 904 51 “Testing the Strong Equivalence Principle: Detection of the External Field Effect in Rotationally Supported Galaxies” 8. Kyu-Hyun Chae 2022 Astrophysical Journal 941 55 “Distinguishing Dark Matter, Modified Gravity, and Modified Inertia with the Inner and Outer Parts of Galactic Rotation Curves” 9. X. Hernandez, M. A. Jiménez, C. Allen 2012 The European Physical Journal C 72 1884 “Wide binaries as a critical test of classical gravity” 10. Kyu-Hyun Chae 2023 Astrophysical Journal 952 128 “Breakdown of the Newton–Einstein Standard Gravity at Low Acceleration in Internal Dynamics of Wide Binary Stars” 11. Kyu-Hyun Chae 2024 Astrophysical Journal 960 114 “Robust Evidence for the Breakdown of Standard Gravity at Low Acceleration from Statistically Pure Binaries Free of Hidden Companions” 12. Kyu-Hyun Chae 2024 Astrophysical Journal (submitted; preprint arXiv:2402.05720) 13. J. Bekenstein, M. Milgrom 1984 Astrophysical Journal 286 7 "Does the missing mass problem signal the breakdown of Newtonian gravity?” 14. M. Milgrom 1983 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 403 886 "Quasi-linear formulation of MOND” 15. R. H. Sanders 1998 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 296 1009 "Cosmology with modified Newtonian dynamics (MOND)” 다음글 3D 프린팅 잉크와 줄기세포를 활용한 인공 심장 개발의 현황 (The Frontier of Artificial Cardiac Development Using 3D Printing Ink and Stem Cells) 이전글 고효율 전력변환을 위한 전력반도체 기술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연구 주요연구 고효율 전력변환을 위한 전력반도체 기술 2024-08-16 hit 663 고효율 전력변환을 위한 전력반도체 기술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임유승 1. 서론 전력변환(Power conversion)이란 용어가 낮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전력변환 기술을 통해 모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가 에너지라고 일컫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모든 가정에 공급이 된다. 우리가 쓰고 있는 220V 교류(AC)전압은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전달될까? 그림 1. 가정에 공급되는 전압과 전력반도체의 역할 [1] 생산된 전기는 도심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승압이란 과정을 거쳐서 매우 높은 전압을 변환된다. 전압을 크게 바꾸기 위해서는 교류를 이용한 경우 쉽게 가능하고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먼 거리를 가능케 한다. 현재 154kV에서 765kV까지 승압을 통해 전달하고 가정에는 배전이란 과정을 거쳐 교류 220V를 공급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정에 220V 교류가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쉽게 다가온다. 그런데 전력변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직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직류는 시간에 따라 전압이 변하지 않는 에너지로 노트북, TV,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모든 전자기기까지 직류를 사용하고, 각각의 기기가 요구하는 전력량에 따라 다른 전압을 채택한다. 즉, 220V 교류전압을 5V, 10V, 15V 등의 직류전압으로 바꿔줘야 한다. 여기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댑터(Adapter)를 떠올릴 수 있다. 즉, 어댑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주고, 원하는 전압으로 낮춰주거나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는 반도체의 정류작용(Rectification)이 활용된다. 즉,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특징을 활용해, 양과 음 전압으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교류를 한쪽 방향을 걸러 직류로 만들어 주는 기술이 적용된다. 반대로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 줄 때는 펄스 폭 변조(Pulse Width Modulation, PWM)를 이용해 교류형태로 만들어 주는 기술을 활용한다. 여기에도 당연히 반도체가 활용된다. 그림 2는 전력변환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나타낸다. 순서대로 교류를 직류로 변환, 교류의 주파수변환, 직류 전압의 변경, 직류를 교류로 변환을 나타내며 응용 환경에 따라 사용처가 모두 다르다. 그림 2. 전력변환 종류 [1] 전력변환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도대체 왜 고에너지갭이란 반도체 소재가 필요하며, 고효율이 왜 요구되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 높은 전압을 견딘다는 의미 반도체는 밴드갭이란 고유 특성을 갖고 있고, 반도체에 전압을 가할 시 특정 전압 이상에서 항복현상(breakdown)이 발생해 급격히 전류가 증가해 반도체를 제어할 수 없게 되고 열화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항복현상은 반도체의 밴드갭 크기에 의존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Si은 1.1eV의 밴드갭을 갖는다. 이를 항복전계(Breakdown Electrical Field)로 변환하면 0.3MV/cm 값을 갖는다. 즉, Si 자체의 항복전압의 임계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복전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저항성을 키워야 한다. 저항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불순물 농도(impurity concentraion)를 낮추어 저항을 크게 가져가는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반도체는 불순물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전류를 매우 잘 흐르게 할 수도, 매우 적게 흐르게 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반도체 특성을 보이는 최적의 디바이스 특성에 저항을 키우기 위한 적은 양의 불순물 농도를 갖는 층을 첨가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저항이 높은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저항이 높은 영역의 폭이 넓을수록 전류가 흐르기 더욱 어렵게 되고 견딜 수 있는 항복전압도 키울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반도체는 전자(Electron)와 정공(Hole)의 각각의 양에 따라 n타입 및 p타입으로 만들 수 있다. 즉, 전자가 많은 상태의 반도체를 n타입, 정공이 많은 상태의 반도체를 p타입으로 일컫는다. 두 반도체가 서로 접합(Junction)을 이룰 때, 우리는 다이오드(Diode)라고 부르며, 이 다이오드가 바로 정류작용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가 된다. 이런 반대 극성(Polarity)를 갖는 성분을 이러한 항복전압을 높이기 위한 층으로 활용함으로써도 항복전압을 높일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같은 극성을 갖는 반도체 내 불순물농도가 다른 층을 삽입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극성을 갖는 층을 삽입하여 두 극성이 만나는 접합면에 공핍층(Depletion layer)이란 층을 형성하여 저항을 키우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반도체의 항복전압을 높임으로서 응용분야에 맞는 소자 설계를 가능케 한다. 3. 높은 전압 구현의 필요성, Si의 한계 그리고 산업 앞서서 전압의 종류와 변환 그리고 사용분야에 대해 알아 보았다면, 좀 더 전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압(Voltage)란 전위차(Electric Potential Difference)라고도 불리며, 전기장(Electric Field) 안에서 전하가 갖는 전위(Electric Potential)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어느 구간 사이에 서로 간의 위치에너지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전압이 크다는 것은 전하들이 더욱 큰 힘을 갖고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시간 당 이동하는 전하의 양이 많다는 뜻을 갖는다. 전압을 얘기할 때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전력(Electric Power, P)이다. 전력은 전기에너지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단위 시간당 전달되거나 변환된 전기에너지에 의해 수행된 일의 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전력(P)는 전압(V)와 전류(I)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같은 전력량을 나타내는 A, B 사례에서 A는 B보다 높은 전압을 가지면 상대적으로 적은 전류량을 나타낼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 전류가 크면 많은 전자들이 동시간에 흐르게 된다. 이는 내부에 진동 및 충돌을 유발하고 점진적으로 열을 발생시킨다. 열은 곧 손실(Loss)로서 나타나게 된다. 즉, 같은 전력량을 가질 때 높은 전압과 낮은 전류는 손실 측면 및 설계관점에서 보다 유리해 진다. 그러면, 전압을 높이는 것이 항상 옳은 판단인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전압을 높인 다는 것은 결국 반도체의 항복전압을 높여 개방(Open) 상태를 만들어 줘야하는데 항복전압을 높이기 위한 저항층의 두께 증가는 결국 반도체 전체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증가된 저항에 의해 전류를 흘려야하는 상태에서 높은 저항성분으로 인해 손실이 그 만큼 발생한다. 즉, 항복전압과 저항은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여기서는 소재의 한계 극복에 국한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3. (좌)물질에 따른 밴드갭 및 항복전계 특성. (우)항복전압 설계에 따른 요구 온저항 특성 그림 3의 좌측 그래프는 물질에 따른 밴드갭 값 및 변환된 항복전계 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Si의 밴드갭은 1.1eV이고 여기 표시된 각각의 소재들은 다른 밴드갭을 나타낸다. 이 중, 가장 널리 Si를 대체할 소재로서 연구되고 제품화된 소재는 4H-SiC(3.3eV) 및 GaN(3.4eV)이다. 각각 밴드갭이 Si 대비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소재 자체의 항복전압 특성이 우수하여 저항 설계에 이점을 갖는다. 이에 대해 그림3 우측에 반도체소자가 동작할 때의 저항값과 설계한 항복전압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에 주목해보자. 가령 1000V의 전압을 견디는 반도체를 제작했다고 가정하면, Si을 사용할 경우 앞서 언급한 저항층의 두께와 저항도를 고려할 때 100mΩ⦁cm2 이상의 저항값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반면, 4H-SiC 소재를 이용할 경우 0.5mΩ⦁cm2 수준으로 200배 가까이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갖는 넓은 밴드갭을 갖는 소재들을 기반한 전력반도체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다. SiC, GaN 이외에도 Ga2O3, AlN, Diamond에 이르는 울트라와이드 밴드갭을 갖는 소재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압이 우리 일상에서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이러한 고전압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가져와 봤다. 그림 4. (좌)전기자동차 배러티 충전 및 사용장치 별 전력변환. (우)전압에 따른 자동차 충전 시간 그림4의 왼쪽 그림은 전기자동차 전력변환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전력의 변환이 전체 시스템에 적용된 사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현재 400V 및 800V 전압을 사용하는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용량은 60kWh에서 현재 80kWh 이상으로 증가돼 왔다. 즉, 800V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직류는 오디오, 계기판 등 전자장치에 사용되는 전압(12 또는 24V)로 변환시켜줘야 하며, 모터 구동에 있어서는 교류로 바꿔줘야 한다. 또한, 높은 전압을 차용한 충전에서는 더욱 차별화가 나타나는데, 우측 그림에서와 같이 충전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표준화처럼 쓰고 있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시스템은 480V 충전을 지원한다. 반면, 국내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아이오닉5 모델은 800V 충전 지원을 통해, 테슬라보다 1.6배 가량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시간에 대한 고민은 모든 사용자가 갖고 있는 고민이고 빠른 충전시간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화에 크게 기여한다. 즉, 고전압을 이용한 시스템 설계는 효율성과 더불어 편의성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여기서 800V 시스템에는 800V를 버티는 반도체를 쓰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위칭이 요구되는 전력변환에 있어 스위칭 및 충방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의 심한 파형 변화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이에 과도(Surge) 전압이 발생한다. 짧은 시간(수나노초)이지만 이로 인해 반도체에는 설계 전압보다 매우 큰 전압이 인가되고 이로 인해 소자 파괴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약 10~20% 이상의 전압 마진을 통해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800V 전압용으로는 1200V 내압특성을 갖는 반도체 소자가 사용된다. 즉, 고전압 설계는 일상 속에 이미 아래 그림과 같이 활용처가 매우 넓고 제품군 또한 매우 다양하다. 가전기기에서 상업용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 이러한 전력반도체는 아이러니하게도 국산화된 기술을 통한 국내 자립도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전력반도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국내 키 플레이어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소품종 대량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과는 달리 전력반도체는 소량 다품종 분야로서 기업마다 제각각인 전력용량을 맞춰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필드엔지니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고객사에 맞춤형 제품을 제공뿐만 아니라 설계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내 기업이 아직 진출하지 못한 것도 수십 년 간 쌓아온 이러한 생태계에 맞춰 준비해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숙제로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메모리 분야 외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전력반도체는 전망이 밝고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 해지고 더욱 지능화하는 전자기기 및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들의 근육이자 힘의 원천이 되는 전력반도체의 연구 개발 및 국내 자립도 증대는 또 다른 국내 연구자들의 숙제이자 목표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그림 5. 전력반도체 분야 세계 기업 현황(2023년 YOLE 리포트) 4. 울트라와이드밴드갭 산화갈륨 기술 앞서 S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에너지갭 소재가 갖는 장점들을 살펴보았다면, 실제 연구, 개발 사용화 사례를 다뤄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탄화규소(SiC)와 질화갈륨(GaN)에 대해 살펴보자. 탄화규소는 3.3eV 의 넓은 밴드갭과 높은 열전도 특성 (Si 대비 3배 이상)을 갖는다. 대전력 구동에서 높은 전류는 소자에 많은 열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열을 빠르게 방출 시키기 위해서 소재의 열 방출 특성이 뛰어나고, 이를 뒷받침한 방열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SiC 는 최적의 소재라 할 수 있다. SiC의 Si 대체 가장 성공적인 상업화는 테슬라 Model 3의 인버터 탑재라 할 수 있다. 650V 내압 특성을 planar MOSFET을 이용하여 총 48개의 die를 병렬로 연결한 사례이다. 최근에는 구동계 말고도 충전시스템에 까지 적용 검토가 되고 있고 현대자동차를 비롯 많은 자동차 회사에서 SiC 모델 적용을 진행하고 있다. GaN의 경우 SiC 대비 고내압 특성의 구조 제작에 어려움이 있으나 2차원전자가스층(Two-Dimensional Electron Gas, 2DEG)을 기반으로 초고속 스위칭이 가능한 High-Electron Mobility Transistor(HEMT) 소자 구현을 통해 5G통신 중계기, X-밴드, k-밴드든 광대역, 고주파용 응용기 가능하다. 특히, 고전력이 요구되는 RF소자에서 입출력 임피던스가 높아 정합회로 구현이 용이하고, 작은 칩면적 구현, Si 대비 주파수 특성이 우수하다. 마지막으로 산화갈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산화갈륨(Ga2O3)은 4.8eV-5.3eV의 매우 넓은 밴드갭을 갖고 있고 앞선 SiC 및 GaN과 가장 큰 차별점으로 Si과 같은 대구경 웨이퍼 잉곳(Ingot)기반의 소재 생산이 가능하다. 4인치 SiC 웨이퍼 한 장의 가격이 연구용으로 100만원 가까이 하고, GaN의 경우에도 50-80만원에 이르는 등 가격이 매우 높다. 이에 반해 산화갈륨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한데, 아직 연구 초기 단계로서 실질적인 웨이퍼 가격은 매우 고가이다 (2인치 기준 30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이 용이하고 초고전압 응용에 적합한 특성으로 국내외 연구진들의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현 시점에서 산화갈륨은 국외 의존도가 높은 전력반도체 시장에 국내 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원천기술에서부터 사용화 기술까지 이르는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필자 또한 1200V급 산화갈륨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개발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국내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이 세계적으로 선도 되기를 희망한다. 그림 6.(좌)테슬라 Model 3에 탑재된 메인 인버터의 24개 650V급 SiC MOSFET 탑재 사진. (우)400V 테슬라 Model 3 시스템의 650V SiC Planar MOSFET 기반 3상 모터 구동을 위한 구동계 인버터 모델 [3] 5. 결론 고효율 전력변환은 점차 커져가는 에너지 소비의 중요성과 더불어 저탄소 기술 구현에 필수 요건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다. 전자제품에서부터 전기자동차, 전기항공/수상택시, 전기저장시스템, 발전소, 대형 선박, 기차, 항공 등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모든 기술에 전력변환은 필수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에 친환경, 에너지 효율 극대화라는 두 키워드는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할 숙제라 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자립도가 가장 낮은 반도체 분야인 전력반도체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 그리고 기초연구와 함께 많은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기울여야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메모리 편중 시장에서 보다 넓은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현재 국내 대기업들이 하나 둘 전력반도체 제품 개발에 뛰어드는 것을 지켜보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https://www.semicon.sanken-ele.co.jp/en/guide/powersemicon.html [2] https://www.yolegroup.com/strategy-insights/power-electronics-meeting-the-shift-towards-electrification-and-renewable-energy-trends/ [3] https://www.pgcconsultancy.com/post/examining-tesla-s-75-sic-reduction 다음글 장주기 쌍성에서 발견된 뉴턴-아인슈타인 표준중력의 붕괴: 천체물리와 우주론에서의 과학혁명 이전글 칼코겐 화합물의 특성과 차세대 반도체 응용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연구 주요연구 칼코겐 화합물의 특성과 차세대 반도체 응용 2024-10-10 hit 1146 칼코겐 화합물의 특성과 차세대 반도체 응용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엄태용 교수 1. 서론 차세대 반도체 및 메모리 소자에서 칼코겐 화합물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소자의 미세화, 고성능화, 저전력화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재료와 이를 이용한 소자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칼코겐 화합물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상변화 메모리(PCM)는 칼코겐 화합물의 가역적인 상변화 특성을 이용하여 비휘발성 메모리를 구현함으로써 기존 메모리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Ovonic Threshold Switching (OTS) 소자는 칼코겐 화합물의 임계 전압 (Vth) 특성을 활용하여 저항변화 메모리 셀의 선택소자 역할을 수행하며 고집적 메모리 어레이에서의 누설 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원의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TMDCs)과 산화칼코겐화합물(Oxychalcogenides)은 높은 전하 이동도로 차세대 논리 소자의 채널 재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칼코겐 화합물의 독특한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뉴로모픽 소자, 센서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혁신적인 소자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칼코겐 화합물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이 독특하게 가지는 유용한 특성 때문이다. 첫째, 전기적 특성의 폭넓은 조절이 가능하다. 금속성, 반도체성, 절연성 등 다양한 전기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 소자의 기능에 따라 재료를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다. 둘째, 상변화 및 임계 스위칭 특성을 가진다. 일부 칼코겐 화합물은 온도나 전기장에 따라 비정질상과 결정상 사이의 상변화를 보이며, 이는 메모리 소자와 스위칭 소자에 활용된다. 셋째, 2차원 구조 형성이 가능하다. 칼코겐 화합물 중 일부는 원자층 수준의 얇은 2D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 고이동도 전자 소자에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재료 공학적 조절이 용이하다. 조성 및 구조의 변화를 통해 물리적, 전기적 특성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맞춤형 소자 개발이 가능하다. 그림 1. 칼코겐 화합물의 특성과 차세대 반도체 소자에서의 응용 분야를 나타낸 개념도 따라서 이 글에서는 칼코겐 화합물의 독특한 전기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반도체 소자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칼코겐 화합물의 개념과 특성 칼코겐 화합물은 주기율표 16족에 속하는 칼코겐 원소인 황(S), 셀레늄(Se), 텔루륨(Te)이 금속 또는 준금속 원소와 결합하여 형성되는 화합물을 지칭한다. 산소(O)도 같은 족에 속하지만, 칼코겐 원소는 산소에 비해 전기음성도가 낮아 결합은 이온성보다 공유 결합성이 더 강하다. 또한, d 오비탈이 반응에 참여하여 다양한 산화 상태가 존재하는 등 산화물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보여 별도의 화합물로 분류한다. [1] 칼코겐 화합물의 전기적 특성은 주로 결정 구조와 결합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결정 구조는 원자들의 배열과 대칭성이 에너지 밴드 구조에 영향을 주어 전기적 특성을 결정한다. 또한, 공유 결합, 이온 결합, 반데르발스 결합 등의 비율과 강도는 재료의 전기 전도성과 반도체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칼코겐 화합물이 주목받는 상변화 특성과 OTS 특성은 이러한 결합 종류 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2] 그림 2. 칼코겐 화합물의 특성 (a) 상전이 특성 (b) OTS 특성 2.1 상변화 특성 칼코겐 화합물은 열적 또는 전기적 자극에 의해 비정질상과 결정상 사이의 가역적인 상변화를 보인다. 비정질상은 원자 배열이 무질서한 상태로 높은 저항을 가지며, 결정상은 규칙적인 원자 배열로 낮은 저항을 가진다. [3] 상변화 메커니즘은 주로 원자 이동과 재배열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전기적 특성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 상변화는 수백 ns 수준의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어 고속 메모리 소자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상변화 과정에서의 열적 안정성은 데이터 보존과 소자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며, 재료 조성 및 구조 조절을 통해 최적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변화 재료로는 Ge2Sb2Te5(GST)가 있으며, 이는 상변화 메모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료로 빠른 상변화 속도와 안정적인 동작 특성을 가진다. 2.2 OTS 특성 OTS특성은 특정 임계 전압(Vth) 이하에서는 높은 저항 상태를 유지하다가, 임계 전압을 초과하면 급격히 낮은 저항 상태로 전환되는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비선형 전류-전압 특성은 메모리 어레이에서 누설 전류를 억제하고 선택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된다. 임계 전압 이상에서는 칼코겐 원소의 결합이 전계에 의해 이동하면서 금속성을 가지게 되거나 비공유 전자쌍이 활성화되어 전하의 이동을 도와 많은 전류를 흐르게 된다. [4] 대표적인 임계 스위칭 재료로는 SiAsTe, GeSe 등이 있으며, OTS 소자에서 임계 스위칭 특성을 나타내는 재료로 연구되고 있다. 2.3 2차원 칼코겐 화합물 칼코겐 화합물의 특별한 형태로 2D 칼코겐 화합물이 있다. 이는 단일 또는 몇 개의 원자층 두께를 가지는 층상 구조를 가지며, 대표적으로 TMDC가 있다. TMDC는 전이 금속 원소(M)와 칼코겐 원소(X)의 화합물로, 일반적인 화학식은 MX2이며, 각 층은 M 원자가 X 원자에 의해 샌드위치된 구조를 가진다. 층과 층 사이에는 약한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하여 2D 구조를 형성한다. TMDC의 밴드 구조는 단일층에서 직접 밴드갭을 가지며, 이는 광학적 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층수가 증가하면 간접 밴드갭으로 전이되며, 이는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전기적 특성 측면에서, MoS2, WS2 등은 넓은 밴드갭을 가지는 반도체로, 고온에서의 안정성과 높은 전자 이동도를 가진다. 반면, TiSe2, VSe2 등은 금속성을 나타내며 전극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NbSe₂ 등은 저온에서 초전도성을 보여 양자 소자에 응용 가능하다. 전하 이동도 측면에서, 2D 구조로 인해 전하 운반자의 산란이 감소하여 높은 이동도를 나타내며, 이는 빠른 스위칭과 낮은 전력 소모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외부 전기장, 기계적 변형(strain), 화학적 도핑 등을 통해 밴드갭과 전기적 특성을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맞춤형 소자 개발이 가능하다. 3. 칼코겐 화합물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 칼코겐 화합물은 독특한 특성 때문에 전자, 광학, 열전, 에너지 소자 등에서 고루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에서 메모리 및 로직 IC의 차세대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1 메모리 소자 3.1.1 Phase Change Memory (PCM) 차세대 메모리 소자인 PCM은 칼코겐 화합물의 상변화 특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5] 메모리 동작 원리는 칼코겐 화합물에 낮은 전류 펄스를 인가하여 결정상(낮은 저항 상태)으로 전환시키는 SET 동작과, 강한 전류 펄스를 짧은 시간 동안 인가하여 비정질상(높은 저항 상태)으로 전환시키는 RESET 동작을 통해 정보를 저장한다. 구체적으로 SET 동작은 낮은 전류 펄스를 인가하여 상변이 물질을 결정화 온도 이상, 녹는점 이하의 온도로 가열하여 결정화를 진행시킨다. RESET 동작은 강한 전류 펄스를 인가하여 상변이 물질을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한 후 급속 냉각하여 비정질 상태로 만든다. 이때, RESET 동작에서 높은 전류가 필요하며, 이는 전력 소모와 열 간섭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재료 및 특성 측면에서, GST는 빠른 상변화 속도와 안정적인 동작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장점으로는 높은 스위칭 속도와 안정적인 사이클 내구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 소모와 낮은 상변화 온도로 인해 데이터 보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도핑된 GST는 N, C 등의 도핑을 통해 열적 안정성과 데이터 보존 특성을 개선한다. GeSb 합금은 빠른 스위칭 속도와 낮은 전력 소모를 보여 차세대 PCM 재료로 연구되고 있다. PCM의 장점으로는 빠른 속도, 높은 내구성, 다중 레벨 저장 등이 있다. 그림 3 상전이 메모리 소자 (a) 소자 구조 (b) 소자 단면 TEM 이미지 (c) 전기적 특성 3.1.2 Ovonic Threshold Switching (OTS) OTS 소자는 임계 스위칭 특성을 가져 저항변화 메모리 어레이에서 메모리 셀을 선택적으로 액세스하기 위한 셀렉터 소자로 활용이 가능하다. 동작 원리는 임계 전압 이하에서는 높은 저항을 유지하여 누설 전류를 억제하고, 임계 전압을 초과하는 전압이 인가되면 급격히 낮은 저항 상태로 전환되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전압이 감소하여 홀드 전압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OFF 상태로 복귀한다. 재료 및 특성 측면에서, Se 기반 칼코겐 화합물은 높은 열적 안정성과 넓은 밴드갭으로 누설 전류를 감소시킨다. Te 기반 칼코겐 화합물은 낮은 임계 전압으로 저전력 구동이 가능하지만, 열적 안정성이 낮을 수 있다. 다원 칼코겐 화합물은 Si, Ge, As, Se, Te 등의 조합으로 재료 특성을 최적화한다. OTS 소자의 장점으로는 높은 선택성과 빠른 동작 속도를 보여 단순한 구조의 메모리 어레이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림 4 OTS 소자 (a) 단위 소자 적층 구조 (b) Crossbar array 구조 (c) 전기적 특성 3.1.3 Selector Only Memory (SOM) SOM 소자는 셀렉터와 메모리 기능을 하나의 칼코겐 화합물 층에 통합하여 소자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능을 향상시킨다. 동작 원리는 전압의 극성 변화나 전류 제어를 통해 OTS 특성을 일으키는 임계 전압을 조절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며, 이 상태를 유지하여 비휘발성 메모리로 동작한다. [6, 7] 이 소자는 하나의 칼코겐 화합물 층이 셀렉터 기능과 메모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전극-칼코겐 화합물-전극 단층 샌드위치 크로스바 어레이 구조를 통해 메모리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소자의 개발은 OTS 소자에서 발생하던 임계전압의 이동 현상을 메모리 특성으로 이용한 것으로, OTS 기술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 재료 및 제조 기술 측면에서, GeSe 기반의 칼코겐 화합물이 낮은 임계 전압과 높은 내구성으로 SOM에 적합하며, SiGeAsTe와 같은 Te 계열의 칼코겐 화합물도 연구되고 있다. SOM의 장점으로는 구조 단순화와 빠른 동작 속도, 에너지 효율성, 긴 소자 수명 등이 있다. 특히 PCM 대비 낮은 동작 전압으로 인해 주변 메모리 셀에 대한 열 간섭이 적어 고집적을 달성하기 유리하며, 고온 동작과 물질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동작에 의한 소자의 열화 발생이 적다. 그림 5 SOM 소자 (a) 소자 구조 (b) 소자 단면 TEM 이미지 (c) 전기적 특성 3.2 Logic IC용 High Mobility TFT 소자 고이동도 박막 트랜지스터(TFT)는 디스플레이, 센서, 논리 소자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칼코겐 화합물을 채널 재료로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TMDC인 MoS2는 단일층에서 벌집 구조를 가지며, S-Mo-S의 삼중층으로 구성된다. 전기적 특성으로 단일층에서 직접 밴드갭을 가지며, 높은 전자 이동도(최대 200 cm2/Vs 이상)를 나타낸다. 이러한 높은 전하 이동도는 빠른 스위칭과 낮은 전력 소모를 가능하게 하며, 얇은 두께와 기계적 유연성, 높은 광투과성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센서 등에 적용 가능하다. 4. 도전 과제 및 최신 연구 현황 4.1 Memory 소자 도전 과제 및 최신 연구 PCM 소자는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모, 열적 안정성, 집적도 향상 등의 과제가 있다. 특히 RESET 동작 과정에서 높은 전류가 필요하여 전력 효율 개선이 필요하며, 이때 발생한 열에 의해 열 간섭이 발생해 저장 데이터와 소자 수명의 열화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소자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 간섭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OTS 소자는 임계 전압 제어, 내구성 향상 등의 과제가 있다. 소자의 동작에 따라 Vth의 이동이 발생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해야 하며, 내구성 향상을 위해 반복적인 스위칭에도 특성이 유지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SOM 소자는 동작 원리가 PCM이 가지고 있는 발열 문제와 OTS가 가지고 있는 Vth의 이동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재료 특성 최적화를 위해 임계 전압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연구에서는 재료 조성 최적화, 증착 기술의 발전, 소자 구조 혁신, 신뢰성 향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료 조성 최적화 측면에서, GeSe 기반 재료는 Ge와 Se의 비율을 조절하여 임계 전압과 내구성을 최적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원 합금으로 Si, Ge, As, Se 등의 원소를 조합하여 열적 안정성과 스위칭 특성을 개선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8] 소자 구조 측면에서 수직 구조(VSOM)를 통해 3D 적층을 구현하여 고집적 메모리 어레이를 개발하고, 저장 용량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증착 기술 측면에서는 선택적 ALD를 활용하여 선택적으로 박막을 형성하고, 3D 구조의 구현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때 저온 증착을 통해 비정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하여 칼코겐 화합물의 ALD는 칼코겐 실리콘 화합물 전구체의 리간드 주도 교환 반응을 통해 GeTe, GeSe, SbTe, GST 비정질 박막의 공정이 연구되어 VSOM 소자에 적용 가능성이 연구 중이다. [9-12] 그림 6 SOM 소자의 향후 개발 과제 4.2 High Mobility TFT 소자 도전 과제 및 최신 연구 최근 연구에서는 표면 상태 개선, 이종접합 구조 개발, 소자 안정성 향상 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2D 반도체는 수직 방향으로 결합을 하지 않는 특성으로 금속 전극 연결이 용이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면의 화학적 처리, 계면 층 삽입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종접합 구조 개발 측면에서 TMDC와 같은 2D 반도체 소재에 3D 유전막이 접속하면 계면에 전자 상태가 형성되어 2D 반도체 소재의 특성을 열화시킬 수 있어 h-BN과 같은 2D 유전막 집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소자 안정성 향상 측면에서, 쉽게 산화되는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호층 등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동작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최근 연구된 물질인 Bi2O2Se와 Bi2SeO5는 층상 구조를 가지는 2D 칼코겐 화합물로, 금속산화물층과 칼코겐 층이 반복적으로 존재하며 층과 층 사이가 반데르발스 힘으로 상호작용한다. 여기서 Bi2O2Se는 높은 전자 이동도를 보이는 반도체 물질이며, Bi2SeO5는 채널의 특성 저하가 없는 고유전 박막(High-k)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13] 이 물질은 기존에 Exfoliation이나 반도체에서 사용되지 않는 STO 또는 Mica 단결정 기판에서 CVD 성장만이 가능했지만, 최근 SiO2 기판 등에 ALD 방식으로 증착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14] 5. 결론 칼코겐 화합물은 그 독특한 전기적 특성과 구조적 다양성으로 인해 반도체 소자에서 혁신적인 가능성을 제공한다.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칼코겐 화합물은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재료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래의 정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 노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핵심 요소인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소자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산업 전반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6. 참조 [1] F. Jellinek, "Transition metal chalcogenides. relationship between chemical composition, crystal structure and physical properties," Reactivity of Solids, vol. 5, no. 4, pp. 323-339, 1988, doi: 10.1016/0168-7336(88)80031-7. [2] D. Lencer, M. Salinga, B. Grabowski, T. Hickel, J. Neugebauer, and M. Wuttig, "A map for phase-change materials," Nat. Mater., vol. 7, no. 12, pp. 972-977, 2008, doi: 10.1038/nmat2330. [3] A. V. Kolobov, P. Fons, A. I. Frenkel, A. L. Ankudinov, J. Tominaga, and T. Uruga, "Understanding the phase-change mechanism of rewritable optical media," Nat. Mater., vol. 3, no. 10, pp. 703-708, 2004, doi: 10.1038/nmat1215 http://www.nature.com/nmat/journal/v3/n10/suppinfo/nmat1215_S1.html. [4] M. Zhu, K. Ren, and Z. Song, "Ovonic threshold switching selectors for three-dimensional stackable phase-change memory," MRS Bull., vol. 44, no. 9, pp. 715-720, 2019, doi: 10.1557/mrs.2019.206. [5] S. R. Ovshinsky, "Reversible Electrical Switching Phenomena in Disordered Structures," Phys. Rev. Lett., vol. 21, no. 20, p. 1450, 1968. doi: 10.1103/PhysRevLett.21.1450. [6] S. Hong et al., "Extremely high performance, high density 20nm self-selecting cross-point memory for Compute Express Link," in 2022 International Electron Devices Meeting (IEDM), 3-7 Dec. 2022 2022, pp. 18.6.1-18.6.4, doi: 10.1109/IEDM45625.2022.10019415. [7] I. M. Park et al., "Enhanced Endurance Characteristics in High Performance 16nm Selector Only Memory (SOM)," in 2023 International Electron Devices Meeting (IEDM), 9-13 Dec. 2023 2023, pp. 1-4, doi: 10.1109/IEDM45741.2023.10413748. [8] T. Ravsher et al., "Polarity-Induced Threshold Voltage Shift in Ovonic Threshold Switching Chalcogenides and the Impact of Material Composition," phys. status solidi (RRL) – Rapid Research Letters, vol. 17, no. 8, p. 2200417, 2023, doi: https://doi.org/10.1002/pssr.202200417. [9] V. Pore, T. Hatanpää, M. Ritala, and M. Leskelä, "Atomic Layer Deposition of Metal Tellurides and Selenides Using Alkylsilyl Compounds of Tellurium and Selenium," J. Am. Chem. Soc., vol. 131, no. 10, pp. 3478-3480, 2009, doi: 10.1021/ja8090388. [10] T. Eom et al., "Conformal Formation of (GeTe2)(1–x)(Sb2Te3)x Layers by Atomic Layer Deposition for Nanoscale Phase Change Memories," Chem. Mater., vol. 24, no. 11, pp. 2099-2110, 2012, doi: 10.1021/cm300539a. [11] T. Eom et al., "Combined Ligand Exchange and Substitution Reactions in Atomic Layer Deposition of Conformal Ge2Sb2Te5 Film for Phase Change Memory Application," Chem. Mater., vol. 27, no. 10, pp. 3707-3713, 2015, doi: 10.1021/acs.chemmater.5b00805. [12] S. Yoo, C. Yoo, E.-S. Park, W. Kim, Y. K. Lee, and C. S. Hwang, "Chemical interactions in the atomic layer deposition of Ge–Sb–Se–Te films and their ovonic threshold switching behavior," J. Mater. Chem. C, vol. 6, no. 18, pp. 5025-5032, 2018, doi: 10.1039/C8TC01041B. [13] T. Li and H. Peng, "2D Bi2O2Se: An Emerging Material Platform for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Industry," Accounts of Materials Research, vol. 2, no. 9, pp. 842-853, 2021, doi: 10.1021/accountsmr.1c00130. [14] H. Park et al., "Direct Growth of Bi2SeO5 Thin Films for High-k Dielectrics via Atomic Layer Deposition," ACS Nano, vol. 18, no. 33, pp. 22071–22079, 2024, doi: 10.1021/acsnano.4c05273. 다음글 고효율 전력변환을 위한 전력반도체 기술 이전글 작업 상황 이해 및 추론이 가능한 거대 인공지능 모델 기반 로봇 조작 작업 학습 기술 개발 목록
-
세종대학교 홍보실
세종투데이 주요연구 주요연구 작업 상황 이해 및 추론이 가능한 거대 인공지능 모델 기반 로봇 조작 작업 학습 기술 개발 2025-02-04 hit 507 작업 상황 이해 및 추론이 가능한 거대 인공지능 모델 기반 로봇 작업 학습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robotic manipulation task learning based on Foundation model to understand and reason about task situations)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구영현 교수 1. 서론 최근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의 발전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과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거대 언어 모델과 로봇 분야의 결합은 매우 주목받는 주제로, 복잡한 환경에서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인간과의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로봇 학습은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통해 작업을 배우고 적응하는 기술로, 기존에는 주로 센서 데이터와 정형화된 명령어에 의존했다. 그러나 거대 언어 모델의 도입으로 인해 로봇은 비정형적인 자연어 명령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구글 딥마인드 AutoRT[1] - LLM을 통한 명령 이해, 작업 수행, 주변 상황 미학습 물체 이해 및 자율적으로 명령어 생성 가능 예를 들어, 사용자가 “테이블 청소 해줘”라고 말하면, LLM은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여 로봇이 실행 가능한 작업 계획(Task Planning)을 생성하고 나아가 해당 작업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액션 코드(Action Code)를 생성하여 로봇 제어가 가능하게끔 한다. 로봇의 작업 계획은 로봇이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 임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행동들을 최적의 순서대로 나열하여 계획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로봇 작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헝가리안 알고리즘 등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조립계획서와 같은 작업 계획에 대한 데이터셋을 딥러닝 모델의 학습을 통해서 수행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대 언어 모델의 추론 능력을 기반으로 로봇이 수행할 작업을 입력하면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소 행동들을 계획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거대 언어 모델은 사전에 학습한 데이터셋의 지식을 기반으로 추론을 수행한다. 모델은 학습 당시 포함되지 않은 최신 정보나 새로운 지식에 대해 알지 못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정보와 관련된 추론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다양한 작업환경 또는 기존에 학습하지 않은 제품이 작업환경에 나타났을 경우 추론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 그림 2. 작업 상황 이해 및 추론이 가능한 거대 인공지능 모델 기반 로봇 작업 학습 기술 개발 개념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추론 결과가 부정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Chain-of-Thought Chain-of-thought의 특성은 언어모델의 추론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한 데이터셋을 추가하고 새롭게 학습하는 방식이 아닌 몇 개의 예제를 통해 원하는 분야의 해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2]. 그림 3. Standard Prompt와 Chain-of-Thought Prompt의 비교 예시, CoT가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해하여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하는 것을 확인[2] 이러한 방식은 로봇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작업 계획을 생성하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대 언어 모델은 단순히 명령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사고 과정(Chain-of-Thought)을 통해 로봇의 작업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 이 사고 과정은 인간의 사고 흐름과 유사하게 정보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뜻한다. 사용자가 “테이블을 정리해줘”라고 명령하면, 거대 언어 모델은 해당 문장의 의도를 분석하고 로봇이 어떤 물건을 어디로 옮길지 계획하고, 작업의 순서를 최적화하여, 체계적으로 계획한다. 또한 로봇이 여러 가능한 작업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도와준다. 이는 인간의 논리적 사고 과정을 모방하여 문제를 분해하고 분석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보다 유연하고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Chain-of-Thought 기법은 로봇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용자의 의도 해석을 통해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정리”가 필요한 이유를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 및 근거에 따라 최적의 작업 순서를 포함한 작업 계획을 설계한다. Chain-of-Thought 기법은 로봇의 작업 수행 능력을 한 차원 높여주며,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인간과의 협업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 “미학습 물체(unseen/unknow object)”란 인공지능 모델이 사전에 학습하지 않은 물체를 의미한다. 이는 모델의 훈련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이나 클래스, 즉 기존 데이터에서 관찰되지 않은 특성을 가진 물체를 포괄한다. 현실에는 학습 데이터로 모두 커버할 수 없는 많은 물체와 상황이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물체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벨링하는 것은 비용, 시간, 자원 면에서 비효율적일 뿐 더러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접근성에서도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사전에 학습하지 않은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학습 물체 인식”에서의 “미학습 물체”의 클래스는 “open vocabulary”를 통해 정의된다. "Open vocabulary"라는 개념은 머신러닝과 자연어처리(NLP) 연구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기존의 "closed vocabulary"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유래되었다. 전통적으로 NLP 모델은 미리 정의된 고정된 어휘(vocabulary)에 의존하여 언어를 처리했는데, 이 방식은 새로운 단어(unknown words)나 특정 도메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유 용어들을 다루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open vocabulary”가 제안되었다. 이는 모델이 사전에 고정된 어휘 집합에 의존하지 않고, 학습 과정에서 새로운 단어와 개념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시스템에서는 사전 정의된 어휘로 모든 개념을 포괄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포맷과 컨텍스트를 학습하면서 어휘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open vocabulary”이라는 개념을 촉진했다.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은 기존 데이터만 의존하지 않고, 인간처럼 새로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당 기술은 범용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필요적인 요소로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거대 언어 모델과 로봇 분야의 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자율주행, 보안,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다. 로봇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와 고도로 특화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정 작업에 특화된 데이터셋은 부족하며, 이를 확보하는데는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과 작업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은 로봇분야의 연구방향에서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로봇에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 적용을 통해 미리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물체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작업 환경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물체가 추가되어도 로봇의 성능이 유지된다. 또한 사전 학습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셋을 수집하거나 학습시키는 과정을 필요하지 않아, 다양한 물체를 인식하고 조작할 수 있으므로 작업의 범위와 효율성이 확대된다. 이는 데이터 라벨링 및 모델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은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패턴이나 특징을 기반으로 물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체가 추가되더라도 재학습 과정 없이 새로운 물체를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어 동적인 환경에서 유연하게 인간-로봇 상화작용을 진행할 수 있다. 4. 검색 증강 생성 검색 증강 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RAG) 모델은 거대 언어 모델과 정보 검색 시스템을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첨단 AI 기술이다. 거대 언어 모델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각(Halluciation) 문제, 지식 업데이트 문제, 도메인 별 전문성 부족과 같은 몇 가지의 핵심 문제로 로봇 분야 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LLM을 증강하는 검색 증강 생성의 등장은 LLM의 이러단 단점을 보완했다[3]. 검색 증강 생성 모델은 주어진 입력에 기반하여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한다. 그 다음 검색된 정보를 융합 기술을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와 결합한다. 마지막으로 입력과 해당 검색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기가 예측을 수행한다. 그림 4. 검색 증강 생성 개요, 검색 증강 생성은 크게 검색기(Retirever), 검색 융합(Retrieval Fusions), 생성기(Generations)로 구성됨[3] 4.1 검색기(Retriever) 검색기는 입력된 쿼리에 대한 관련성 높은 문서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는 구성요소이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는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도로 최적화된 검색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4.2 검색 융합(Retrieval Fusions) 검색 융합은 검색된 정보를 활용하여 생성 과정을 보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융합 기법은 크게 쿼리 기반 융합(Query-based fusion), 잠재 융합(Latent fusion) 그리고 로짓 기반 융합(Logits-based fusion)으로 나뉜다. 쿼리 기반 융합은 검색된 정보를 생성기에 입력하기 전에 이를 입력 데이터에 추가하여 보강한다. 잠재 융합은 검색된 표현을 생성기의 잠재 표현에 도입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로봇 기반 융합은 생성기의 출력 로짓에 초점을 맞추며, 검색된 정보의 로짓을 융합하여 더 견고한 로짓 출력을 제공한다. 4.3 생성기(Generator) 생성기는 기본 생성기와 검색 증강 생성기로 분류된다. 기본 생성기에는 대부분의 사전 학습 또는 미세 조정된 대규모 언어 모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GPT 계열의 모델, 그리고 Gemini 계열의 모델 등이 있다. 검색 증강 생성기는 검색된 정보를 융합하는 모듈을 포함한 사전 학습 또는 미세 조정된 생성기를 의미한다. 거대 언어 모델은 사전 훈련된 지식을 기반으로 추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새로 업데이트된 지식에 대한 정보가 없다. 또한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 기반으로 작업환경에서 새로 나타나거나 기존에 학습하지 않은 물체의 이름을 알아도 해당 물체의 정의 또는 기능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추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로봇 작업에 검색 증강 생성 모델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작업환경에서 처음 나타나거나 기존에 학습하지 못한 물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거대 언어 모델이 더욱 정확한 조작 계획을 추론할 수 있게끔 하는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그림 5. Chain-of-thought,미학습 물체 인식, 검색 증강 생성 등 기술을 통한 모호한 명령 추론 기반 작업 계획 생성 5. In-Context Learning In-Context Learning은 거대 언어 모델이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 학습(Fine-tuning) 없이, 주어진 문맥 내에서 제공된 예시를 통해 작업의 패턴을 학습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언어모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특정 작업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요한 기법이다. In-Context Learning 기법 적용 시 입력으로 사용되는 프롬프트(Prompt)는 거대 언어 모델이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문맥을 제공하는 입력 텍스트를 의미한다. 프롬프트는 모델이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그림 6. In-Context Learning 예시[4] 기존의 로봇은 강화 학습과 지도 학습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해당 학습 방법들은 학습 데이터 생성 및 모델 학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와, 고가의 센서,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이 어렵고 모델 학습에 컴퓨팅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로봇은 다양한 작업 수행에 대한 적응성을 필요로 한다. 단일 작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번 새롭게 학습하거나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In-Context Learning 기술은 로봇이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인간처럼 유연하게 적응하며 다양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술이다. 예를 들어, 가정 환경에서 사용되던 로봇 모델을 사무실 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작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모델이 적절한 작업 계획을 생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In-Context Learning 기술을 활용하면, 사무실 환경에 대한 몇 가지 예시만 제공해도 로봇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이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제조 공장 등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7. 로봇 작업에서 거대 언어 모델에 직접 In Context Learning 기법을 적용한 예시와 거대 언어 모델 기반 모호한 명령 이해 및 추론 모델에 In-Context Learning 기법을 적용한 예시 비교 6. 작업 상황 추론 LLM 로봇 기술 개발 앞서 거대인공지능 모델이 로봇 분야에서의 다양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살펴보았다면, 해당 기술들을 모두 적용할 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Chain-of-Thought 기술은 비록 논리 및 근거에 따라 로봇의 작업 계획을 생성하지만 거대 언어 모델이 사전에 학습한 지식에 의거하기 때문에 생성한 작업계획이 불완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은 로봇더러 동적인 작업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물체의 클래스(이름)을 거대 언어 모델에 알려준다. 하지만 물체의 이름만 알고 해당 물체의 기능, 해당 환경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면 여전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적용하여 미학습 물체 인식 기술 및 Chain-of-Thought 기술 기반 단계별 보다 정확한 추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술이 다양한 환경에서의 빠른 적응을 위해 In-Context Learning 기술을 도입한다. 그림 8. human robot interface 예시 7. 결론 실시간 대응 로봇 자동화 기술은 국제적인 기술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고 국내 기관에서도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에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제조, 사무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도 노동력 부족 현상과 서비스 수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자동화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거대 언어 모델을 적용한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할 작업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 접근 장벽을 낮추고 기술 지원 및 활성화를 기대하고, 특정 산업 외 전 산업에 결쳐 자동화율을 높임과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하여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 전문 서비스 분야의 자동화나, 질병 혹은 고령화로 인해 자립적인 물체 조작과 같은 상황 대응이 어려운 사람을 보조하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 자동화 기술을 확장함으로써 서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Reference [1] Ahn, M., Dwibedi, D., Finn, C., Arenas, M. G., Gopalakrishnan, K., Hausman, K., ... & Xu, Z. (2024). Autort: Embodied foundation models for large scale orchestration of robotic agents. arXiv preprint arXiv:2401.12963. [2] Wei, J., Wang, X., Schuurmans, D., Bosma, M., Xia, F., Chi, E., ... & Zhou, D. (2022). Chain-of-thought prompting elicits reasoning in large language model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5, 24824-24837. [3 Wu, S., Xiong, Y., Cui, Y., Wu, H., Chen, C., Yuan, Y., ... & Xue, C. J. (2024).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 survey. arXiv preprint arXiv:2407.13193. [4] Dong, Q., Li, L., Dai, D., Zheng, C., Ma, J., Li, R., ... & Sui, Z. (2022). A survey on in-context learning. arXiv preprint arXiv:2301.00234. 다음글 칼코겐 화합물의 특성과 차세대 반도체 응용 이전글 손 안의 정밀 위치 기술 : 스마트폰을 활용한 GNSS 정밀 측위의 현재와 미래 목록